
맷돌 밑부분에 쳐놓은 거미줄에서는 바야흐로 무서운 사투가 벌어지는 광경이었다. 모기 모양이나 모기보다는 한결 완강하고 정력적으로 생긴 날벌레와 그 날벌레보다 작은 거미 한 마리와의 싸움이었다. 파득거리는 벌레의 날래에서 무시무시하게 큰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길상은 물 묻은 손을 뻗쳐 거미줄을 확 젖혔다. 거미는 몸을 움츠리고 가사상태를 위장하면서 다리 두 개를 뻗쳐 벌레는 잡고 놓질 않는다. 두 개의 다리는 흡반이 달린 문어 다리 같았다. 순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증오심에서 길상은 거미를 문들어 죽이고 말았다. _ 박경리, <토지 5> , p336/670
토지 독서챌린지. <토지 5>에서 서희와 그를 따르는 평사리 사람들은 용정에 정착한다. 서희는 자신의 수완을 발휘해서 많은 재산을 쌓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해간다. 서희와 함께 하는 길상 역시 집안일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본문에서 펼쳐진다. <토지 5> 중 일부를 읽은 이번 주 독서에서는 길상이 세수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거미와 날벌레의 싸움 장면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필사적으로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미와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날벌레. 먹지 않으면 죽고 반대로 먹히면 죽는 치열한 삶(生)의 현장을 길상은 그야말로 하늘(天)이 되어 지켜본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큼은 길상이 하느님 또는 '신의 대리인'에 다름아니다.


중국 문자 가운데 이른바 하늘(天)에는 다섯 의미가 있다. 첫째, 물질지천(物質之天) 즉 땅과 상대적인 하늘이다. 둘째, 주재지천(主宰之天) 즉 소위 황천상제(皇天上帝)로서 인격적인 하늘이다. 셋째, 운명지천(運命之天) 즉 우리 삶 가운데 어찌 할 도리가 없는 대상을 지칭한 것이다. 넷째, 자연지천(自然之天) 즉 자연의 운행을 지칭한 것이다. 다섯째, 의리지천(義理之天) 즉 우주의 최고 원리를 지칭한다. _ 풍우란, <중국철학사(상)> , p61
펑유란(馮友蘭, 1894 ~ 1990)의 <중국철학사 中國哲學史>에 나오는 천(天)의 의미는 소설의 인물들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거미의 생사를 좌우한 길상은 주재지천의 하늘을, 거미에게 다가운 갑작스러운 죽음의 손길은 운명지천의 하늘일 것이며, 거미와 운명의 싸움을 한 날벌레는 자연지천의 하늘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의리지천을 느꼈을까...
신변에 위기를 느꼈음에도 먹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미는 그만큼 기아선상에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굶주린 것에게서 먹이를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처사였더란 말인가. 비를 바라보면서 길상은 생각한다. 이런 경우 자신의 손길이 벌레에게 있어서 하느님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심판은 과연 옳았던가? 인간의 경우에도. _ 박경리, <토지 5> , p336/670


이러한 상황에서 길상은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는지를 돌아본다. 문단의 마지막 문장처럼 이번 페이퍼에서는 길상의 생각을 인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려 한다. 날벌레를 구하려는 길상의 행동이 '측은지심 惻隱之心' 이라는 인간 본성 - 사단(四端) - 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거미에게 '시비지심(是非之心)'의 대상일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황금률(黃金律, Golden Rule).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법칙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거미는 인간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길상의 생각 속에서 벌레는 의인화가 되어 있기에 적용시켜 본다.) 물론, 칸트(Immanuel Kant, 1724 ~ 1804)와 같이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답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이론적 원칙들을 [자명한 것으로] 의식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수한 실천 법칙들을 의식할 수 있다."(KpV, A53=V30) 선의 이념을 가진 이성적 존재자는 선험적으로 도덕법칙을 의식하며, 이런 도덕법칙들의 최고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KpV, 7 : A54=V30)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GMS:4, 421) _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p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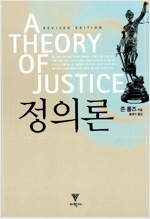

이러한 보편적 법칙의 현실 적용과 관련하여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1821 ~ 1881)의 <죄와 벌>을 떠올리게 된다. 라스꼴리니꼬프의 알료나 이바노브나(전당포 여주인) 살해는 다분히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에 근거한다. 한 사람의 살해가 더 큰 효용(效用,Utility)을 가져온다면, 그 살해를 긍정할 수 있다는 라스꼴리니꼬프의 이론과 주장은 스스로를 '주재지천'의 하늘에 앉힌다. 얼핏 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이론이지만, 그의 이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수 없다면 우리 모두가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 생명에 대한 근원적 존중 때문일까.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서로 부딪치는 논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는 '정의(正義)'라는 개념이 흔들림을 느낀다. 이처럼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 보편적인 행동원칙을 찾아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작은 범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 노파의 삶은 바퀴벌레와 이(蝨)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어떠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_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상)>, p161/680
그래, 바로 맞아! 그게 인간의 법칙이야...... 법칙, 소냐! 바로 그래......! 그리고 난 알아, 소냐. 머리와 정신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라야만 사람들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더 많이 용기를 내어 일을 감행하는 사람만이 사람들 눈에는 옳아 보이는 것야. 보다 많은 것을 무시하는 자만이 그들의 입법자가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옳은 사람이 되는 거야! _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하>, p351/838


다른 한 편으로, 라스꼴리니꼬프의 살해는 역설적으로 탐욕의 화신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정화(淨化)시키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지라르(Rene Girard, 1923 ~ 2015)의 <폭력과 성스러움 La Violence et le Sacre> 에 표현되듯 '살해'라는 폭력을 통해 '탐욕의 화신'이 '불쌍한 전당포 여주인'으로 전환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는 리뷰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알료나 역시 자신은 성실하게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정도만 짚도록 하자.
수많은 제의 속에서 희생은, 때로는 아주 무시하지 않는 한 느껴지기 마련인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그 반대로 아주 심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일종의 <죄악>으로,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희생물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다. 왜냐하면 그 희생물이 성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희생물은 죽임을 장하지 않으면 성스럽게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양가성 ambivalence>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순환논리가 들어 있다. _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 p10
라스꼴리니코프의 정의(正義)와 알료나의 성실함/생활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죄와 벌>이라는 한정된 사회에서 우리는 어느 가치에 더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치와 이해당사자가 충돌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 ~ 1883)의 논리를 알기쉽게 설명한 고병권의 <다시 자본을 읽자>를 통해 살펴보자.

'옳음 대 옳음' , '권리 대 권리'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둘 다 '노모스'(nomos)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율배반'(Antinomie)이 생겨납니다. 대립하는 주장인데 둘 다 옳으니까요. 이런 모순에서는 논리, 즉 로고스가 더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는 '힘'이 재판관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_ 고병권, <다시 자본을 읽자> , p210/284
고병권이 해설한 <자본론 Das Kapital>의 논리 중 하나는 이율배반의 상황에서 둘 다 옳다고 했을 때 힘의 논리가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바이어던, 사회계약이 출현했다고 보면 되겠다. 더 나가면 원래 출발점인 <토지 5>에서 가출해서 이번 페이퍼에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테니 이만 멈추는 것으로 하되, <자본>을 관통하는 '착취'의 개념이 '모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까지만 담도록 하자. '필요노동'이라는 공통된 개념에 대해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이라는 상반된 해석에서 오는 차이. 이것이 <자본> 전체를 관통하는 '착취'의 시작이며,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일부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씨앗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내가 '모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앞서 이율배반, 즉 '대립하는 두 개의 주장이 모두 옳은'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장이 상반된 옳음을 동시에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paradox)' 입니다. 하나의 견해(doxa)에서 반대 방향 내지 다른 방향(para-)이 생겨나는 것이죠. _ 고병권, <다시 자본을 읽자> , p212/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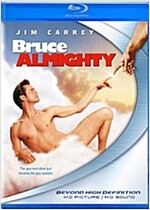
'필요노동' 부분이 자본가에게 '필요한'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사회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이 가능하려면 노동자의 존속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잉여가치는 불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자본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로서 그것은 필수죠... 노동자에게 '필요'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즉 노동일 전체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필요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사적 사회형태와 관계없이 인간에게 언제나 '필요한' 부분입니다. _ 고병권, <생명을 짜 넣는 노동> , p224/309
<토지 5> 안에서 무심코 거미를 죽이고 고민에 빠진 길상의 옆에 앉아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가진 이들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기도를 올릴 때 이를 들어야 하는 하느님의 입장은 참 대략 난감할 듯하다. 이를 잘 표현한 영화 <브루스 올 마이티 Bruce Almighty>를 떠올리며 페이퍼를 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