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세기 花郞世記> 필사본이 1989년 세상에 모습을 보인 이래 책의 진위(眞僞) 논란은 진행형이다. <화랑세기 : 신라인의 신라이야기>는 필사본을 진본으로 보는 이종욱 교수가 편역한 책으로 저자는 <화랑세기> 필사본의 의의를 신라사의 생생한 복원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신라 시대에도 근친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골품제가 엄격하게 지켜진 신라의 최고 귀족들 사이에 근친혼은 신분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의한 근친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화랑세기>는 오히려 신라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 틀림없다.(p347) <화랑세기><부록1. 화랑세기의 신빙성에 대하여> 中
<화랑세기> 안의 복잡한 혈연 관계는 소위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관계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를 들면 김춘추(金春秋, 604 ~ 661)와 김유신(金庾信, 595 ~ 673)의 동생 문희(文姬)가 결혼해서 낳은 딸인 지소부인(智炤夫人)은 다시 김유신의 둘째 부인이 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여기 더해 미실(美室, 540 ~ 612 ?)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가계도는 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에 대해 저자는 <화랑세기> 안에 나타난 근친혼(近親婚)을 도덕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행위로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화랑세기>에 나오는 내용 중 마복자(磨腹子, 하위 계급의 임신한 여성이 상위계급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태어난 아이)나 진골 정통(眞骨正統)/ 대원 신통(大元神統)과 같이 이해가 안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다고 해 이 책을 위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골 정통과 대원 신통은 여성들로 이어져 있으며, 남자도 한 대에 한해서는 그의 어머니의 계통을 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통을 인통(姻統)이라고 하고 있다. 원래 두 계통은 왕을 비롯해 왕실의 남자들에게 왕비를 비롯한 여자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계통에 따른 정치 세력도 형성되고 나아가 화랑들의 파맥(派脈)도 형성됐다.(p346) <화랑세기><부록1. 화랑세기의 신빙성에 대하여> 中
마복자 풍습의 경우에는 지금의 도덕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화랑세기> 필사본 부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화랑의 간부층인 낭도들은 풍월주의 마복자들로 구성되고, 이들이 화랑을 따르는 무리(출처: 위키백과)였다는 사실이 문헌 부정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생각된다. 일례로, 고대 그리스에는 성인 어른과 소년 애인 150쌍 300명으로 구성된 테바이 신성대(Hieros Lokhos)를 살펴보자. 동성애인 앞에서 용맹하게 싸우리라는 믿음으로 구성된 이러한 군대 편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은 실재했던 부대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마복자로 구성된 부대가 있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랑세기>안에 담긴 화랑의 정치적인 모습 또한 우리에게 알려진 화랑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점도 문헌 부정의 근거가 된다. 여기에서 잠시 <삼국사기 三國史記>의 화랑 관련 부분을 살펴보자.

진흥왕(進興王) 37년 봄에 비로소 원화(源花)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재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것을 병통으로 여겨,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지어 노닐도록 해서 그 행동거지를 살핀 다음에 천거해 쓰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어여쁜 여자 두 사람을 뽑으니 한 사람은 남모(南毛)요, 또 한 사람은 준정(俊貞)이었다. 무리 3백여 명을 모았는데 두 여자가 미모를 다투어 서로 질투하더니,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그녀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서 죽였다. 이에 준정은 죽음을 당하였고, 그 무리들도 화목을 잃어 흩어지고 말았다. 그 뒤 다시 미모의 남자를 골라 단장하고 꾸며서 화랑(花郞)이라 이름하고 받들게 되었다.(p128)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 제4> 中
<삼국사기>는 화랑이 원화에서 유래했고, 원화를 대신한 화랑이 국가 인재의 등용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록대로 화랑의 무리가 심신 수련 단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랑세기> 안의 진골 정통과 대원 신통 사이의 다툼을 통해 남모 - 준정의 다툼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임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다툼이 화랑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화랑세기>안에 담긴 화랑들과 미실을 비롯한 왕궁사람들은 너무도 인간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때문에, <화랑세기> 앞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고대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풍습은 낯설지만, 권력과 사랑에 대한 인간의 감정은 낯설지 않다.
또한, <화랑세기>는 우리에게 신라사회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알려준다. 혈연(血緣)으로 맺어진 지배계층이었기에 이들은 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테베의 신성대가 스파르타를 꺾고 그리스 패권을 차지했듯. 그렇지만, 고구려, 백제 영토 통합이후에는 이들의 폐쇄성이 독(毒)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넓어진 영토를 가슴으로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2세기가 흐른 후 다시 후삼국이 분할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도 생각하게 된다. 물론 고대사회의 폐쇄성이 신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폐쇄성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폐쇄성과 관련해서 잠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포용정책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인의 '포용'정책이 로마가 제국으로 이어진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이는 <로마인 이야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몸젠(Christian Matthias Theodor Mommsen, 1817 ~ 1903)에 따르면 로마사회는 그렇게 포용적이지도 개방적인 사회도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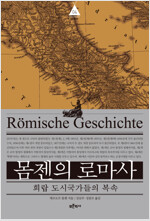
공화정 시대의 인상적인 평등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 평등이 상당 부분 형식적이었다는 점과 여기에서 매우 특이한 귀족 계층이 생겨났다는, 아니 오히려 처음부터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p92)... 정부는 여전히 귀족 통치를 유지했는바, 가난한 소농들도 부유한 완전 토지 소유자들과 외형적 차별 없이 대등하게 민회에 참여했지만, 귀족 통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함으로써 가난한 사람은 도시의 시장은 커녕 촌의 면장도 되기 어려웠다.(p93) <몸젠의 로마사2> 中
비시민에게는 로마 시민권 가입이 거의 완전히 막혀 버렸다. 복속된 공동체들이 로마 공동체에 편입되는 옛 절차는, 로마 시민권의 과도한 확대로 인하여 로마 시민권이 너무나 분산되지 않도록, 기원전 350년경에 소멸했고, 때문에 불완전 시민공동체가 설치되었다.(p177)... 귀족들이 평민을 상대로 귀족제의 폐쇄성으로 들어가듯, 시민은 비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 제도의 관대함으로 크게 성장한 평민이 이제 귀족의 경직된 규율로 스스로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p179) <몸젠의 로마사4> 中
끊임없이 수혈되는 새로운 피가 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시오노 나나미는 높이 평가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로마제국의 융성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고대 사회에서(사실은 오늘날까지도) 폐쇄성은 일반적인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화랑세기>로 돌아오자. 여기에는 생생한 당대인의 모습과 함께 고대 사회의 폐쇄성이 담겨있다. 책에 묘사된 당대인의 모습은 책의 진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폐쇄 사회의 한계는 진위여부를 떠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사회에 남아있는 골품(骨品)제의 변형틀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필사본 <화랑세기>는 단순한 고문헌 이상의 의미를 갖는 책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