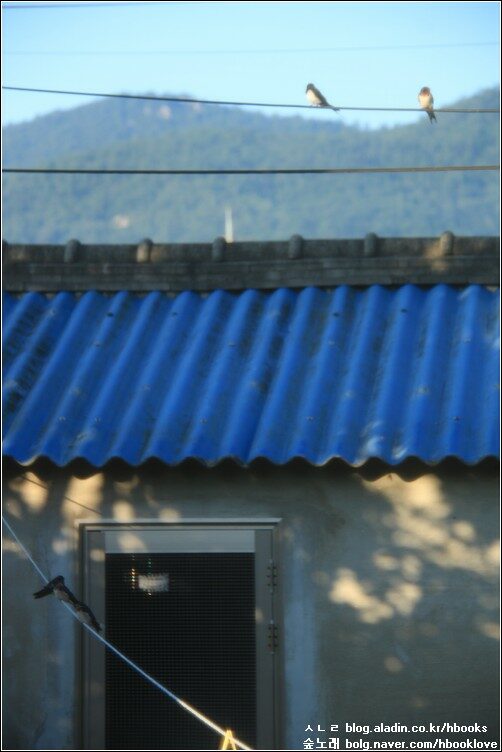[시골살이 일기 101] 드디어 날아오른 새끼 제비
― 닷새 만에 여섯 마리 모두 날다
우리 집 처마 밑은 제비가 지내기에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이가 있는 시골마을이 드물고, 농약을 안 치는 시골집이 드무니, 여러모로 제비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에 좋습니다. 우리 집 처마에 깃드는 제비는 해마다 비슷한 철에 돌아오고 비슷한 철에 떠납니다.
다만, 우리 마을로 돌아오는 제비 숫자는 해마다 매우 크게 줄어듭니다. 2011년에는 수백 마리에 이르는 제비가 온 들과 마을에서 춤을 추었으나, 이듬해부터 부쩍 줄고 자꾸 줄어서 올해에는 열 마리도 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을을 아울러 고작 열 마리 즈음밖에 안 되는 제비 가운데 두 마리가 우리 집 처마에 깃들어 새끼를 낳아서 보살핍니다.
사월 첫무렵에 우리 집 제비가 둥지를 손질하며 깃들려 할 적에, 알을 낳아서 깠는가 궁금했지만, 둥지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제비가 떠날 수 있으니까요. 잘 낳았을 테고 잘 돌보겠거니 여기면서 지켜보니 사월 이십일에 비로소 새끼한테 먹이를 물어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먹이를 물어 나르다가 조용해졌어요. 왜 그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을 테지요.
어미 제비는 한 달 남짓 우리 집 처마 밑을 떠났고, 우리 집 처마 밑은 이동안 몹시 조용했습니다. 처마 다른 쪽에는 겨우내 참새가 둥지를 틀어서 알을 까고 새끼를 길렀는데, 참새가 쉰 마리에 이르는 무리를 이끌고 찾아오며 제비와 다툰 적이 잦았으니, 뭔가 저지레가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오월 끝무렵부터 어미 제비 두 마리는 다시 처마 밑으로 찾아옵니다. 이때에도 참새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새도 이번에는 그리 골을 부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헤아리면, 참새가 우리 집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깔 수 있던 까닭은 제비가 도왔기 때문(마음을 써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참새가 제비집에 깃들어서 지내기도 하니, 참새는 제비한테 더없이 고마워 해야 할 노릇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칠월로 접어들어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한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다시 봅니다. 이사이에 어미 제비가 알 하나를 둥지 밖으로 굴려서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왜 알 하나를 버렸을는지 알 길이 없으나, 제비는 제비대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칠월 삼십일에, 새끼 제비 세 마리가 둥지에서 벗어납니다. 어미 제비는 새끼한테 더 먹이를 물어 나르지 않고, 새끼 가운데 세 마리는 씩씩하게 둥지를 벗어납니다. 다만, 갓 둥지를 벗어난 새끼 제비는 어미 제비처럼 훨훨 날지 않아요. 처마 밑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서 깃을 손질하거나 말똥말똥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새끼 제비가 처음 둥지를 벗어난 이날에도 참새 한 마리가 새끼 제비한테 다가오려 합니다. 어미 제비는 참새를 한 번 쳐다보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 새끼들을 바라봅니다. 참새는 멀거니 제비를 보다가 저도 고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한동안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다른 어미 제비가 날아오니 참새가 떠납니다. 다른 어미 제비는 새끼를 지키던 어미 제비한테 무어라고 한참 지저귀더니, 새끼를 지키던 어미 제비 입에 벌레 한 마리를 넣어 줍니다. 어미 제비 두 마리는 서로 몫을 나누어 하나는 새끼한테 저지레를 할 녀석이 없도록 지키고, 다른 한 마리는 제 짝한테 먹이를 물어다 주는군요.
이리하여 2015년 올해 우리 집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가 씩씩하게 세 마리 깨어나서 어른 제비로 큽니다. 그런데, 둥지에 아직 어린 새끼 제비가 있습니다. 어린 새끼 제비는 그야말로 말똥말똥 바깥을 내다보기만 할 뿐 조금도 밖으로 나올 엄두를 못 냅니다. 먼저 밖으로 나온 새끼 제비가 둥지로 날아들어서 “얘들아, 너희도 이제 나와!” 하고 지저귀는구나 싶은데, 둥지 앞에서 날갯짓을 보여주는데, 이래도 꼼짝을 않습니다.
한 번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 제비는 이튿날부터 새벽 일찍 집을 나서서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새끼 제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에 어미 제비는 새끼 제비한테 먹이를 하나도 안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어미 제비는 ‘남은 새끼 제비’가 가여운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아무래도 ‘앞선 세 마리’보다 ‘남은 몇 마리’가 작거나 여리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기로도,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나를 적에 빽빽거리며 고개를 내민 새끼는 세 마리만 보였어요.
아마 세 마리가 몸이 먼저 잘 자라서 일찍 둥지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테고, 여리거나 작은 아이들은 먹이도 늦게 받거나 제대로 못 먹었을 수 있습니다.
팔월 사일 새벽 이십 분 즈음, 처마 밑이 몹시 부산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큰아이가 먼저 바깥을 내다보더니 “제비들 잘 나네?” 하고 말합니다. 옳거니, 남은 새끼도 이제 둥지를 벗어났는가?
늦게 둥지를 벗어난 새끼도 세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늦도록 못 나오나 하고 여겼는데, 먼저 나온 아이도, 나중 나온 아이도 셋씩입니다. 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오른다면 더 씩씩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미 제비 두 마리가 먹이를 물어 나르기에는 여섯 마리가 좀 벅찼을 수 있습니다.
나중 나온 세 마리는 빨랫줄에 앉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다가서면서 손을 뻗습니다. 새끼 제비는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서도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어미 재비가 보채거나 닦달을 하니 한두 번 날개를 파닥이는 듯하다 그치기를 되풀이하다가, 지붕을 타고 앉기도 하고, 빨랫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중 세 마리도 하늘을 가르면서 놀 테지요. 이제 오늘부터 나중 세 마리도 날갯힘을 기르고 스스로 먹이를 잡는 몸놀림을 배울 테지요.
늦깎이로 깨어난 제비 여섯 마리는 그야말로 바지런히 날고 또 날아야 합니다. 여름이 저물 무렵 태평양을 건너려면 날마다 신나게 날고 다시 날면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부디 한국을 떠나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날까지 튼튼하게 자라기를 빕니다. 올해가 저물고 이듬해에 새봄이 찾아오면 그때에도 기운차게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빕니다. 이듬해에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제비가 늘어날 수 있기를 빕니다. 사람과 제비가 서로 사이좋게 아끼고 보듬으면서 사랑스러운 시골마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빕니다. 〈흥부전〉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제비가 살 만한 마을일 때에 사람도 살 만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4348.8.4.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5 - 고흥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