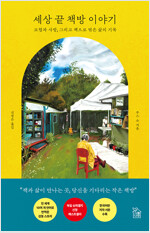숲노래 책읽기 / 가난한 책읽기
책집사랑
나는 예나 이제나 책집마실을 다니고 꼬박꼬박 책집마실 이야기를 남긴다. 어느덧 이런 삶이 서른 해를 넘는다. 이동안 누가 ‘책집마실 이웃’과 ‘책집이야기 동무’로 나란히 책길을 걸으려나 살폈다. 얼추 2015년 무렵까지 둘레에서는 “아직도 힘겹게 책짐을 지며 걷느냐?”고, “누가 아직 책집을 다리품과 길삯을 들여서 찾아다니고, 마을책집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하거나 빈정대거나 나무라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다. “자네는 돈이 없어서 자가용을 안 굴리나? 차 살 돈은 없으면서 책만 사서 뭣에 쓰나?” 하고 비웃는 분도 흔했다. 그야말로 마을책집이 밑바닥도 모르는 채 우수수 쓰러지던 2010년 즈음에는 “자네도 곧 그렇게 사라지겠구만? 사라지는 것들만 꽁무니를 좇으니 말야.” 하고 이죽거리던 분도 많았다.
지난 열 해 사이에 태어나고 사라진 마을책집이 숱하다. 이제는 책집이야기를 쓰는 이웃이 늘었다. 쇠(자동차)를 내려놓고서 등짐을 지는 이웃도 조금 는 듯싶다. 다만 무척 적을 뿐이되, 작은책집 작은마실은 작은걸음일 적에 작은마을을 느끼며 피어나는 줄 알아보는 분이 하나둘 눈뜬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조금 늘어가는 발걸음이 반갑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작은책집을 사랑하며 곁에 둘 까닭이 없다. 하루하루 한 사람씩 늘면 넉넉하다.
책마실이란, 책집에 “이 책 있어요?” 하고 안 묻는, 그러니까 “말없이 그 책집 시렁을 찬찬히 짚으면서 ‘그곳에 있는 책’을 장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비록 그 책집에서 장만한 책이 줄거리가 후줄근하더라도 그곳 책을 만나서 “책을 신나게 얘기하면 즐겁”다.
‘좋은책’이나 ‘나쁜책’이 아닌, ‘읽은책’과 ‘손책(손에 쥔 책)’을 말하면 된다. 어느 책이든 말할 노릇이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읽고 새긴 모든 마음을 스스럼없이 나누기에 새롭다. 실컷 꾸짖을 책을 말해도 되고, 한껏 우러를 책을 말해도 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같은 고얀짓을 따져도 되고, 신경숙과 창비랑 얽힌 글담(문단권력)을 짚어도 아름답다. 《풀꽃나무하고 놀던 나날》이나 《지는 꽃도 아름답다》나 《고해정토》 같은 아름드리 작은책을 두런두런 얘기해도 사랑스럽다.
책집사랑이란, 책으로 다리를 놓으면서 마을에 나무빛과 풀빛과 꽃빛을 씨앗으로 나누는 이웃과 만나면서 싹트는 별빛이라고 느낀다. 서로 숲빛인 줄 알아보면서 함께 살림길을 노래하는 손길을 여는 숨빛이지 싶다. 책집노래란, 책을 곁에 두는 너랑 내가 알뜰살뜰 마주하며 주고받는 말씨앗 한 톨이지 싶다. 우리는 이 자그마한 책을 서로 읽고 쓰고 누리면서 우리 마음뿐 아니라 마을과 푸른별 곳곳에 생각씨앗을 가만히 심는다.
책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책집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더 많이 책집마실과 책집사랑을 해야 하지 않다. 그저 너랑 내가 사랑씨앗을 심고 가꾸면 느긋하고 나긋하다. 집일과 밖일이 바빠서 이레 동안 글 한 줄 못 읽어도 된다. 달포나 한 해 동안 책 한 자락 못 읽어도 된다. 바람 한 자락도 책이고, 아이랑 살림하는 보금자리도 책이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별이 돋는 이 하루도 책이다. 길에서 스치는 사람도 책이고,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휙 던지는 누구도 책이며, 짜장국수 한 그릇과 단무지 한 조각도 책이다. 2025.11.4.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