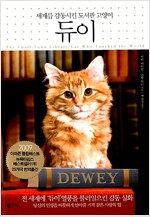숲노래 책숲
책숲하루 2025.11.1. 그냥 들려준다
―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국어사전 짓는 서재도서관)
: 우리말 배움터 + 책살림터 + 숲놀이터
저는 늘 뼈를 깎으면서 살아갑니다. 뼈를 그토록 깎았다면 하나도 안 남을 만한데 어째 멀쩡해 보이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만, 하도 뼈깎이를 해대느라 막상 남은 뼈는 없되, 뼈깎이를 하면 늘 새뼈가 곧장 돋더군요.
밑바닥을 구르며 사느라 더는 떨어질 마음도 없다고 여기는 나날인데, 밑바닥을 구르노라면 참말로 예서 더 어데가 밑바닥인지 모를 노릇입니다. 닷새이건 열흘이건 실컷 굶으며 살아왔습니다만, 굶더라도 안 죽는 줄 숱하게 느꼈어요. 어릴적부터 싸움터(군대)에 이르는 동안 날마다 얻어맞는 굴레였는데 그토록 얻어맞더라도 용케 멍이 이튿날이나 사흘쯤 뒤면 사라지고, 부러진 듯하거나 찢어진 데도 이레나 보름이 지나면 아물어요.
사는 내내 되새깁니다. 어떻게 살점이 다시 돋지? 어떻게 뼈가 다시 나지? 어떻게 머리카락이 새로 돋지? 어떻게 피멍이 사라지고 새살이 반듯하지?
우리말에는 ‘말씨’에 ‘글씨’가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을 노릇이라는 오랜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양자물리학’이라는 이름은 몰랐어도 “말이 씨가 된다”라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든지 “콩 심은 데 콩 난다” 같은 살림말을 차근차근 이었어요. 게다가 “팥 심은 데 콩 난다” 같은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는 그대로 피어나고 이룬다는 뜻이요 삶이자 슬기입니다. 엉터리로 그리니 엉터리를 이루지만, 사랑으로 그리니 사랑을 이룬다는 오래빛입니다.
이따금 스무 살 무렵에 “하루에 책 100자락을 못 읽으면 안 자겠어!” 하고 다짐하던 일을 떠올립니다. 쉰 살을 넘었다지만 “예나 이제나 하루에 책 100자락을 읽으려고 하면 읽을 테지.” 하고 여기면서 책바다에 뛰어들곤 합니다. 스무 살 무렵이건 쉰 살을 넘은 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00자락 읽기”를 나설 적에는 이미 ‘셈(숫자)’을 잊습니다. 첫 책을 손에 쥘 적에는 “몇 자락을 읽을 하루”이냐가 아닌 “손에 쥔 책에 흐르는 마음씨를 고스란히 맞아들여서 이 하루를 노래하려는 꿈”으로 접어듭니다.
두 아이가 꽤 어리던 때에는 안고 업은 채 자장노래에 놀이노래를 부르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듣느라’ 자기 싫었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가 ‘아버지 노래를 들으려’고 안 자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 노래를 불렀고, 너덧 시간을 쉬잖고 불렀고, 으레 예닐곱 시간쯤 노래를 부르는데, 용케 목이 안 쉬더군요. 스스로 놀랐습니다. “와, 내가 하루 여덟 시간을 쉬잖고 노래할 수 있다고? 대단한걸?” 아이들한테 노래를 불러 주면서 말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업고 두바퀴(자전거)에 태워서 골골샅샅 달리면서 온몸 뼈마디가 새롭고 튼튼하게 붙었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글을 스스로 써서 들려주면서 글빛을 가다듬었습니다. 늘 이뿐입니다.
“하면 된다”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할게”였고 “노래로 할게”라는 마음입니다. 열 해나 스무 해나 서른 해를 파헤쳐서 알아낸 이야기나 수수께끼를 그냥그냥 누구한테나 바로바로 들려줍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 어느새 새롭게 길을 살피면서 이다음 이야기를 캐내고 찾아내고 알아내게 마련입니다. ‘내 것’이라며 움켜쥐면 언제나 고인물이 되어 썩지요.
* 새로운 우리말꽃(국어사전) 짓는 일에 길동무 하기
http://blog.naver.com/hbooklove/28525158
*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 지기(최종규)가 쓴 책을 즐거이 장만해 주셔도 새로운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짓는 길을 아름답게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