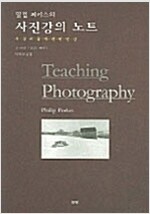필립 퍼키스 사진책을 말하기
필립 퍼키스 님 사진책이 지난 2015년 12월에 새로 나왔다. 이 사진책을 다루는 인터넷서점은 아마 ‘알라딘’뿐이지 싶다. ‘안목 출판사 누리집(http://blog.naver.com/anmocin)’에 들어가야 비로소 필립 퍼키스 님 사진책을 주문해서 받아볼 수 있으리라 본다.
언제부터였던가, 필립 퍼키스 님 사진책이 한국말로 나왔고, 이분 사진책이 날개 돋힌듯이 팔리지는 않았으나, ‘사진길을 걷는 이웃님’한테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노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구나 하고 느낀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삶’을 밝히는 사진을 가르친 필립 퍼키스 님이기에, 이분 사진책은 여러모로 따스하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작품’이나 ‘예술’이 아닌 ‘사진’을 말하는 사진책을 쓰는 필립 퍼키스 님이라고 할까. 이분 새로운 사진책 《바다로 떠나는 상자 속에서》를 놓고 두 달 남짓 마음으로 삭히고 삭힌 끝에 오늘 낮에 드디어 느낌글 하나를 마무리지었다. 이 사진책을 놓고 글을 쓰기로 하고 출판사에 연락해서 ‘보도자료(비평/리뷰)로 쓸 사진’을 얻고서 이레가 지난 오늘 느낌글을 마치면서 여러모로 기쁘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글이 아주 술술 잘 풀렸다.
사진이란 무엇인가? 사진도 언제나 삶이다. 글이란 무엇인가? 글도 언제나 삶이다. 영화도 만화도 노래도 춤도 연극도 연속극도 모든 것은 언제나 삶이다. 삶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사진을 사진으로 마주할 수 있을 때에는 삶을 삶으로 마주하면서 그리는 손길·눈길·마음길이 된다고 느낀다. 한국에서 필립 퍼키스 님 사진책을 꾸준히 펴내 주는 안목출판사 일꾼들한테 언제나 고맙다. 4349.2.7.해.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책 언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