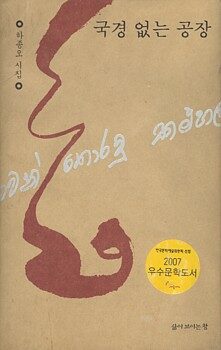-

-
국경 없는 공장
하종오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07년 5월
평점 :

절판

사랑과 삶 사라지는 서울
[시를 노래하는 시 44] 하종오, 《국경 없는 공장》
- 책이름 : 국경 없는 공장
- 글 : 하종오
- 펴낸곳 : 삶이보이는창 (2007.5.14.)
- 책값 : 8000원
이주노동자는 일을 하러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국에 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고향나라를 떠나 한국에서 여러 해를 살아갑니다.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인 만큼 뼈빠지게 일을 하고서 일삯을 떼이거나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몹시 슬프고 서운합니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사람도 돈을 벌려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공무원이 되려 한다든지, 사법고시에 붙으려 한다든지, 교사자격증을 따려 한다든지, 큰회사에 들어가려 한다든지, 하나같이 돈을 벌 생각으로 찾는 일자리입니다. 곧, 한국사람 누구라도 이녁 일자리에서 일삯을 떼이거나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무척 슬프고 서운할 테지요.
.. 사출공장 사장은 봉급을 줄 때 /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달이 꼬박꼬박 다 주고 / 동남아인 노동자들에게는 다달이 절반씩 미루면서 / 한국인 노동자들은 처자식에 부모 있고 / 동남아인 노동자들은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씨부렁거렸다 .. (체불)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일삯을 적게 받아도 된다고 여기면, 비정규직노동자 푸대접이 태어납니다.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을 두어 ‘회사 관리비 아낀다’고 생각하면, 대학교 졸업장이랑 고등학교 졸업장이란 초등학교 졸업장 사이에 금을 긋고는 푸대접을 하고 맙니다.
졸업장 갖고 일삯을 나누려 하는 곳에서는, 이런 자격증 저런 영어점수를 따지겠지요. 군대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놓고도 이런 말 저런 말 불거지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같습니다. 겉모습이 한국사람이건 이주노동자이건, 겉이름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겉껍데기가 대졸자이건 고졸자이건 무학력자이건, 일매무새에 따라 일삯을 살필 노릇입니다.
.. 십 년간 한국에서 직장 다닌 아버지는 / 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 아이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 그곳에도 슈퍼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없는지 / 게임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 아버지의 모국이 아이에겐 다른 나라다 .. (한국 아이)
시인이 쓴 시를 놓고, 이주노동자 시인이 쓴 시인가, 한국사람이 쓴 시인가, 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시인이 쓴 시를 읽으며, 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다닌 이가 쓴 시인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이가 쓴 시인가, 아무 대학교도 중학교도 안 다닌 이가 쓴 시인가, 하고 가르지 않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가를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인한테서 시를 배워 쓴 시인가를 낱낱이 가를 평론가 있을는지 모르지요. 어떤 대학교를 다니고, 어떤 문학상을 받으며, 어떤 문학잡지에 실은 시인가 하고 따질 비평가 있을 수 있어요.
.. 공장장은 걸핏하면 손으로 머리를 밀었다 / 네팔리는 머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 모자를 즐겨 쓴다는 걸 / 공장장은 잘 알면서 / 마음에 안 든다며 손으로 머리를 밀고 / 일시키면서도 손으로 머리를 밀고 / 말하면서도 손으로 머리를 밀었다 / 체류기간 지난 여권을 빼앗은 / 공장장은 돼지 주인이고 / 청년은 돼지인가? / 네팔에선 돼지 주인이 막대기 잡고 / 등도 배도 목도 밀며 우리로 몰아 넣어도 / 돼지가 말 듣지 않는다고 머리를 후려갈기진 않았다 .. (머리)
아이들이 자장노래 들으며 새근새근 잠듭니다. 아이들은 이녁 어머니가 자장노래 부르든, 이모나 삼촌이 자장노래 부르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장노래 부르든, 오페라가수나 대중가수가 노래를 부르든, 딱히 대수롭지 않습니다. 사랑을 담아 따스하게 부르는 자장노래가 반갑습니다. 웃음꽃 피우면서 살가이 부르는 노래가 즐겁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읽거나 만화책을 읽으면서 ‘이름 높은 작가 아무개가 빚은 작품’이기에 더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림책 작가나 만화책 작가 이름을 안 살핍니다. 오직 ‘책을 들여다보’면서 재미있는가 아름다운가 좋은가 즐거운가 하고만 생각합니다. 작가 이름을 살피는 사람은 오로지 어른뿐입니다.
.. 국도변에서 식당 하는 친구는 / 손님이 많아지는 철에 / 동남아인 여종업원 둘 그만두자 / 화가 치밀어 씩씩거렸다 .. (몸값)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와 강원도와 경기도와 충청도는 흙이 다르고 물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거둔 나락인가에 따라 맛이 살짝 다릅니다. 느낌이나 결이 조금씩 달라요.
다만, 전라도 나락이 경상도 나락보다 좋다 할 수 없어요. 충청도 나락이 경기도 나락보다 정갈하다 할 수 없어요. 다 다른 시골 삶터에 따라 다 다른 시골 나락일 뿐입니다.
전라도사람은 전라도말 쓰고, 경기도사람은 경기도말 써요. 서로 다른 삶이고, 서로 다른 사랑이며,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과 사랑과 이야기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푸른 숨결 아끼며 맑은 빛 어깨동무하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 왜 말 걸지 못했을까 / 내가 그들 말 몰랐던 탓일까 / 그들이 우리말 모른다고 여겼던 탓일까 / 같이 나눌 이야깃거리가 떠오르지 않았던 탓일까 .. (말문)
하종오 님 시집 《국경 없는 공장》(삶이보이는창,2007)을 읽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시를 읽습니다. 그래, 이주노동자 이야기 다룬 시일 테지요.
그런데, 이 시집에 나오는 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 아닌 ‘비정규직’으로 바꾼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참말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비정규직’ 아닌 ‘학력 차별’이나 ‘성 차별’이나 ‘지역 차별’로 바꾸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골칫거리가 꼬리에서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아픔과 슬픔과 생채기가 자꾸자꾸 이어집니다. 어느 하나 속시원히 풀거나 맺는 이야기가 못 됩니다. 어느 한 곳 슬기롭거나 아름다이 엮거나 놓아 주지 못합니다.
.. 새들이 흰 날개를 펴고 선회하고 있었다 / 고국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늦가을 풍경에 / 외국인노동자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야 한다는 걸 잊고는 / 두 인도네시안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 잎사귀들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나무들이 자라는 땅에서 / 자신들이 홀대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 (외국인노동자병원 가는 길)
공장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교육과 문학에도 국경이 없어요. 아이를 낳아 돌보는 어버이한테 국경이 있을까요.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한테 국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건 정치꾼이건 국경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군대에 국경이 있어야 할까요.
.. 정형외과 병실에서 / 서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 필리피노는, / 네팔의 산봉우리들이 아름답겠다, 고 / 네팔리는, / 필리핀의 섬들이 아름답겠다, 고 .. (병상)
국경이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란 나와 너 사이에 가로놓는 걸림돌입니다. 서로서로 잇는 징검돌 아닌 걸림돌로 울타리를 둔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바람 너무 드센 바닷가에서 바람을 막으려고 쌓는 돌울타리 아닌, 이웃과 이웃 사이를 꽉 막는 울타리를 세운다면, 이리하여 서로 다른 삶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서로서로 등치거나 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이른바, 중·고등학교에서 입시시험 치르면서 내 동무를 마치 적으로 삼는 짓하고 똑같아요. 내가 살려면 너도 함께 살아야 하는데, 입시지옥 중·고등학교에서는 내 동무를 죽이고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는 듯 잘못 가르쳐요. 곧,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 푸대접이 불거질밖에 없고, 이주노동자한테뿐 아니라 비정규직한테도 무학력자한테도 시골내기한테도 온통 푸대접입니다.
아니라고요? 시골내기 푸대접하는 짓은 이제 사라졌다고요? 글쎄, 시골에서 살아가는 제가 흙 묻은 고무신 차림으로 서울로 마실을 갈라치면 다들 쳐다보면서 키득키득 웃던걸요. 거꾸로, 양복 차려입고 까만 구두 꿰차며 까만 자가용 모는 이들 바라보며 키득키득 웃으면 어찌 될까요.
누가 누구를 바라보며 웃을 까닭 없고, 누가 누구를 ‘어떤 이름’으로 금을 그어 나눌 까닭 없습니다. 서로 같은 사람이고 삶이며 사랑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자꾸 사랑이 옅어지거나 잊혀집니다. 이 나라에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꿈도 믿음도 이야기도 흐려지거나 어느새 사라지고 맙니다. 4346.3.23.흙.ㅎㄲㅅㄱ
(최종규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