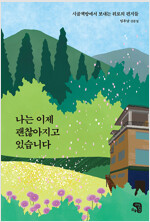오늘도 까칠한 숲노래 씨 책읽기
숲노래 오늘책
오늘 읽기 2025.5.5.
《책방 시절》
임후남 글, 생각을담는집, 2024.7.5.
빗줄기가 가볍다. 볕날과 비날이 갈마드는 늦봄이다. 이 빗줄기는 모든 자잘한 먼지와 죽음물(농약)을 씻어낸다. 새가 눈에 뜨일 만큼 줄었다. 새를 헤아리지 않는 사람이기에 새터(새 삶터)가 줄어들고, 새밥(새 밥살림)이 나란히 줄어드는 탓이다. 시골에서 살아가며 마주하는 ‘새’를 이야기하면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무슨 새? 배부른 소리 아녀?” 하고 대꾸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자. 새가 사라지면 논밭이 다 망가진다. 새와 벌레와 벌나비가 없으면 모든 논밭은 싹 죽기에 사람도 나란히 굶어죽는다. 작은새와 작은나비와 작은벌레라고 하는 이웃을 헤아리지 못 하거나 않는 나라로 뒹굴기에 “사람도 나란히 고단한 굴레”이지 않은가? 《책방 시절》은 시골 기스락에서 책집과 펴냄터를 꾸리면서 마주하는 시골빛을 들려준다. 종이책 이야기는 적고, 철빛 이야기가 넉넉하다. 반가운 엮음새이다. 오늘 우리가 자꾸 잊거나 등지는 대목은 철과 바람과 들숲과 풀벌레와 새이다. ‘노동·비정규직·소수자’ 이야기가 왜 안 대수롭겠는가? 그러나 ‘일·뒷자리·작은이’라는 곳을 찬찬히 짚으면서 손을 잡으려면 시골과 들숲메바다를 늘 헤아릴 노릇이라고 본다. 시골 어린이를 안 바라본다면 ‘새길(진보)’일 수 없다.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