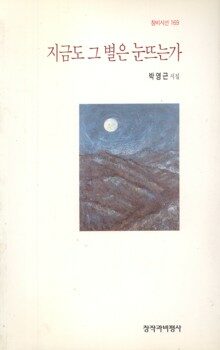-

-
지금도 그 별은 눈뜨는가 ㅣ 창비시선 169
박영근 지음 / 창비 / 1997년 11월
평점 :



시를 노래하는 시 95
눈 감은 하루, 눈 뜨는 모레
― 지금도 그 별은 눈뜨는가
박영근 글
창작과비평사 펴냄, 1997.11.20.
모처럼 아침에 해가 납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두 팔을 활짝 벌립니다. 햇볕과 햇빛과 햇살을 골고루 이 몸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온갖 멧새가 부산스레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아침에 우리 집 뒤꼍에 서서 해바라기를 합니다.
.. 안개는 제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붙잡고 / 죽음의 기억까지 녹슬게 하고, / 우리는 찌그러진 반합통 같은 얼굴로 / 지난밤의 총탄이 박혀 있는 나무둥치와 / 몇 마리 오소리들을 보고 돌아서곤 했다 / 살아 붙잡을 것은 물소리밖에 없었던 / 내 마음의 대암산 / 이십년이 흘러도 나는 떠나지 못하고, / 귀울음으로 남아 시시때때로 울려오는 선무방송 .. (대암산)
아침에 해바라기를 하면서 뒤꼍을 걷다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밀린 빨래를 신나게 해야겠구나. 아이들 옷을 모두 새로 갈아입힌 뒤 기운차게 빨래를 해야겠구나.
볕이 나는 하루이니, 낮에는 이불을 내다 널 수 있을 테지요. 볕이 고운 하루라면, 아이들과 들마실을 다녀올 수 있겠지요. 엊저녁에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들마실을 하는데, 바야흐로 논마다 유채꽃이 무르익으려 하면서 꽃내음이 짙습니다. 날마다 유채꽃이 곱게 올라올 테고, 들을 가득 채운 유채꽃물결이 우리 몸을 감싸면 새로운 봄빛으로 물들 만하리라 느낍니다.
.. 철조망 녹슬어가는 높은 담장 안에 / 비무장한 나무들이 / 새 둥우리 하나 지키고 있다 .. (용산에서 1)
해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해가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기에 삶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숨이 막혀서 죽으니, 이때에도 삶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기에 삶이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그예 축축하게 젖고 말지만, 꾸준하게 비가 내려 주어야 냇물이 흐르고 샘물이 솟습니다. 해와 바람과 비가 함께 있으니 흙이 기름지고, 풀과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별에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가꿀 수 있습니다.
.. 오래 떠돌던 마음이 빗소리 속에서 집을 짓는다 // 새 한마리 / 배롱나무 가지 끝에서 / 비 그친 하늘 / 젖은 허공 한뼘을 물고 있다 .. (빗소리)
박영근 님 시집 《지금도 그 별은 눈뜨는가》(창작과비평사,1997)를 읽습니다. 이 시집이 나올 무렵, 나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군대에서 볼볼 기어다녔습니다. 박영근 님은 대암산이라고 하는 곳을 시에 쓰는데, 나도 대암산이라는 곳에서 총을 들고 밤을 새야 한다든지, 삽을 들고 땡볕을 쬐면서 길을 다져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골을 내야 했고, 눈이 오면 눈을 퍼서 차곡차곡 쌓아야 했습니다.
.. 꽃 이운 자리에서 / 새까맣게 익은 꽃씨가 / 바람 속으로 / 떨어지고 있다 .. (입추)
사회나 정치에서는 군대가 ‘나라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사내도 이 말에 젖어들기에, 휴가를 나오거나 전역을 하면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말한다든지 ‘내가 나라를 지킨다’고 읊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군인은 제가 깃든 군부대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제자리에 맞게 착착 끼워맞추는 톱니바퀴 구실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허수아비 구실을 합니다. 군인이 되는 젊은 사내는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지운’ 뒤, 나라(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짓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허수아비나 꼭둑각시가 되어 사회로 돌아갑니다.
이리하여, 사회에서는 ‘군대 마친 사내’를 반깁니다. 왜 반길까요? 군대 마친 사내는 군대에서 계급과 신분과 위계질서에 길들었기 때문에, ‘웃사람이 시키는 짓’을 척척 잘 따르는 허수아비나 꼭둑각시 구실을 잘 합니다. 사회 조직에서는 ‘군대 마친 사내’한테 ‘군 가산점’을 주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조직이 맡은 몫이란 ‘사람을 톱니바퀴처럼 짜맞추어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도록 얽매이는 일’이니까요.
.. 오밤중 두시 무렵 / 짓다 만 신축공사장 빈터 / 취한 내가 / 허리도 팔다리도 꺾고 / 쭈그리고 앉아 / 홀로 사위어가는 모닥불을 쬔다 .. (모닥불)
노동자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를 가리켜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말 그렇지요.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말과 한자말로 서로 갈리는 대목이 있기도 할 테지만, 사회 얼거리를 보면, 참말 노동자는 일꾼이 못 되기 일쑤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노동자 자리에 서는 사람은 ‘공장 톱니바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자리에서는 ‘사용자가 시키는 일만 똑같이 되풀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도 ‘노동자’나 ‘근로자’는 될 테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를 가리켜 ‘일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 스스로 ‘새로운 삶을 짓는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노동자는 공장에서 톱니바퀴입니다. 노동자는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을 만들거나 지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이 팔아치워서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공산품’을 똑같이 꿰어맞추는 몸짓으로 지내야 할 뿐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바라는 것은 ‘몸뚱이’일 뿐, ‘머리’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머리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 바람에 / 구름 속 되살아나 / 비껴오는 / 한오라기 햇살 // 마저 그리움도 벗고 / 홀로 가거라 / 죽어 / 한점 비유도 없이 / 허공에 .. (尹金伊)
노동자가 노동자로만 남으려 한다면 노동자한테는 아무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붙이려 하는 이름인 노동자’라는 허울을 벗고 ‘스스로 삶을 짓는 일꾼’이라는 이름을 손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스레 삶을 찾고, 아름답게 일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버는 회사 조직이 아니라, 삶을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름(직책이나 지위)을 얻는 톱니바퀴가 아니라, 사랑을 가꾸는 하루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 함께 눈을 떠서 이 지구별을 환하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4348.4.8.물.ㅎㄲㅅㄱ
(최종규/함께살기 . 2015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