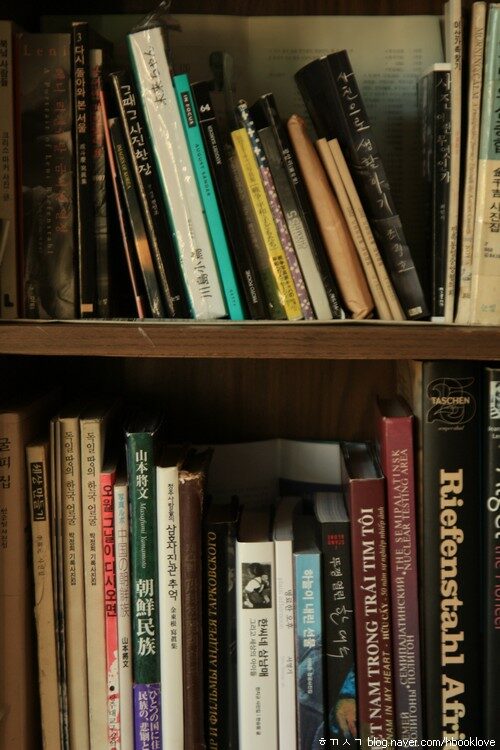책으로 책읽기
책은 책을 부른다. 이 책 하나 읽으니 저 책이 눈에 밟힌다. 저 책 하나 살피며 그 책이 보인다. 얼마나 많은 책을 살펴야 책이 눈에 안 밟힐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책을 건사해야 책을 안다 말할 만할까.
옆을 돌아보면 책을 얼마 안 읽고도 책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책을 얼마 건사하지 않고도 책을 내세우는 사람이 많다. 책을 깊이 사귀지 않고도 책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책을 널리 헤아리지 않고도 책을 안다고 말해도 될까.
그런데, 몇 권쯤 읽어야 책읽기를 했다 말할 만할까. 몇 가지쯤 건사해야 책을 갖추었다 보여줄 만할까.
동무를 몇 사람쯤 사귀면 동무가 많다고 말하려나. 이웃을 몇 사람쯤 알고 지내면 사람들과 많이 알고 지낸다고 말하려나.
도시 한켠에 마련한 작은 공원을 드나들면서도 나무를 느낄 수 있고 나무를 알 만하며 나무를 말할 수 있겠지. 가끔 자가용 몰아 시골길 지나가며 나무를 더 많이 보거나 숲도 조금쯤 들여다볼 수 있겠지. 두멧자락 깊디깊은 숲이라든지 러시아 타이가숲이라든지 안데스나 알프스 같은 곳 숲을 느끼지 않고도, 아마존이나 열대우림 같은 숲을 살피지 않고도, 얼마든지 숲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숲은 크고작은 크기로 나누지 않으니까. 숲은 숲 그대로 숲이니까.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시에서 자라는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를 말하리라. 시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는 나무를 마주하며 나무를 말하리라. 별을 못 보는 도시에서는 별이 없는 밤하늘을 안고 밤이나 별을 말하겠지. 별을 흐드러지게 보는 시골에서는 별이 흐드러지는 밤하늘을 보듬으며 밤이나 별을 말하겠지. 누군가는 도시를 벗어나 비행기 타고 먼먼 나라로 가서 별을 본 다음 별을 말할 테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늘 바라보는 별을 말할 테지.
누구나 삶을 말한다. 누구나 스스로 꾸리는 삶을 말한다. 누구나 책을 말한다. 누구나 스스로 읽는 책을 말한다. ‘모든 삶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거의 없다. ‘모든 책을 말하’는 사람도 아직 거의 없다. 곰곰이 돌아보면, 모든 나무와 모든 숲과 모든 별을 말하는 사람도 아직 거의 없다.
누구나 사랑을 말하고 꿈을 말한다. 다만, 아직 모든 사랑과 모든 꿈을 아낌없이 말하거나 스스럼없이 말하거나 환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온갖 말이 수없이 떠돈다. 온갖 책이 숱하게 나온다. 그림책도 만화책도 어마어마하게 새로 나온다. 다만, 삶을 밝히는 빛줄기 같은 책은 좀처럼 구경하기 어렵다. 책을 더 읽는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4345.11.7.물.ㅎㄲㅅㄱ)
(최종규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