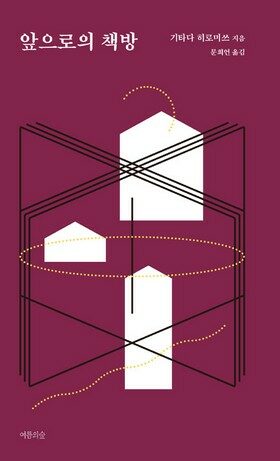-

-
앞으로의 책방
기타다 히로미쓰 지음, 문희언 옮김 / 여름의숲 / 2017년 4월
평점 :

품절

따뜻한 삶읽기, 인문책 189
작은 책방을 살리면 마을이 살아나요
― 앞으로의 책방
기타다 히로미쓰 글
문희언 옮김
여름의숲 펴냄, 2017.4.3. 12000원
요즈음 ‘독립서점’이 부쩍 늘어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독립서점이 가장 많이 늘어나지 싶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도시 아닌 작은 도시에서도 독립서점이 하나둘 태어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곳이 독립서점이라고는 느끼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책방’입니다. 마을 한켠에 마을책방이 조용히 태어난다고 봅니다. 마을 한자락에 마을책방이 이쁘장하게 기지개를 켜는구나 하고 느껴요.
책을 파는 것만이 책방의 일은 아닙니다. 책과 책방의 매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책방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19쪽)
“책방에서도 가게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헌책방 정도야. 대형서점에 가면 모두 살기등등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말을 걸 수 없어 …… 대형서점에 가면 산처럼 쌓여 있는 책을 일부러 그곳(마을책방)에서 사는 거지. 아마존처럼 바로 내일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고, 3주일 정도 걸려도 괜찮으니까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같은.” (61쪽)
독립서점이 아닌 마을책방은 큰길에서 제법 벗어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독립서점이 아닌 마을책방은 먼걸음으로 찾아오는 손님뿐 아니라 마을사람이 가벼운 차림새로 사뿐사뿐 마실하듯이 들르는 우물가나 샘터 구실을 합니다. 독립출판물을 많이 다룬다고 하는 새로운 책방입니다만, 이곳에는 독립출판물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마을책방인 터라 먼발치 손님을 비롯해서 마을 손님 누구나 다리를 쉬고 느긋하면서 아늑하게 ‘책’을 누리도록 이끌지 싶어요.
우리 스스로 책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끄는 새로운 마을책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로 묶는 책뿐 아니라, 바람과 숲이라는 책, 사람과 말이라는 책, 노래와 웃음이라는 책, 그림과 연필이라는 책을 들려주는 마을책방이지 싶어요.
이름난 큰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름난 작가 몇몇 사람이 쓴 잘 팔리는 책만 책일 수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난 작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때로는 1인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름이 덜 나거나 안 난 작은 사람이 손수 지은 책도 똑같이 책입니다.
100만 권이 팔려야만 책이지 않아요. 열 권이 팔려도 책입니다. 더군다나 꼭 한 권만 지어서 마을책방 한 곳에만 놓이는 책도 책이에요. 팔지 않는 책도 책이지요. 온누리에 딱 하나만 있도록 책을 지었기에, 자그마한 마을에 깃든 자그마한 책방에 찾아가서 손으로 만지며 보는 책도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을 사이에 놓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책방이라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네.” (64쪽)
“자신들이 자란 마을을 사랑하는 노부부는 그들처럼 이 마을을 사랑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상담했습니다. 노부부도, 이곳에 사는 주민도, 그리고 수는 적지만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마을의 발전을 바랍니다. 그 중심을 책방으로 하자고 의견이 일치해서 지역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가까운 형태로 책방을 돕게 되었습니다.” (132∼133쪽)
베스트셀러 순위표에 올라야만 책이지 않습니다. 스테디셀러 목록에 들어야만 책이지 않습니다. 추천도서목록이나 고전목록에 끼어야만 책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위표나 목록에 안 들더라도 책입니다. 우리 가슴을 적실 수 있으면 책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끌면 책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새롭게 짓도록 이끌면 책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새롭게 가꾸도록 이끌면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책이란,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책이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책이란, 앞으로 우리가 나눌 책이란, 바로 새로운 책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새롭게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숨결로 싱그러이 살림을 속삭이는 숲으로 살아나는 책이지요.
“이 마을의 책방에서는 어쩐지 갖고 싶은 책과 만납니다. 이상하게도 무슨 책을 살지 결정하지 않고 둘러보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닿은 책을 보면 확실히 갖고 싶었던 책입니다. 책은 사람이고, 사람은 마을이고, 마을은 사람입니다.” (137쪽)
《앞으로의 책방》(여름의숲,2017)을 읽습니다. 그동안 어떤 틀에 갇힌 모습으로 가는 책방이 아닌, 이제 사람과 사랑이 새롭게 어우러지는 책방을 바라는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가게에 책꽂이를 빽빽하게 들여서 책도 빽빽하게 꽂는 책방이 아닌, 책방지기 스스로 가장 아낄 만한 책을 손수 가리거나 추려서 갖춘 뒤에, 이곳을 찾는 손님한테 다 다른 책을 살며시 이야기하는 책방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앞으로의 책방》을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날마다 새로 나오는 책이 대단히 많아요. 모든 새책방은 이 모든 새책을 책방에 건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새로운 책을 모든 새책방에서 몽땅 건사하자면 책방은 아주 커야 해요.
이 대목에서 더 생각한다면 모든 도서관이 모든 새책을 건사하기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해요. 책방뿐 아니라 도서관까지 모든 책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살피고, 어떤 책을 읽으며, 어떤 책을 품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책을 책방이나 도서관에 둘 만하며, 어떤 책을 읽을 만하고, 어떤 책으로 생각을 일깨우면 즐거울까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추천받지 않았다면 스스로는 사지 않을 책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8쪽)
“아직 책방은 독자의 욕망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즐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화려한 것만 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화는 아닙니다. 가게의 손님에 맞춘 즐거운 제안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181쪽)
책방이 한 곳이라도 있는 마을하고, 책방이 한 곳도 없는 마을은 사뭇 다릅니다. 책방은 그냥 책방이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책방이 있는 마을이란, 스스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마을이지 싶습니다. 책방이 없는 마을이란, 스스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둘 떠난 너무 쓸쓸하며 너무 고요한 마을이지 싶습니다.
오늘날 시골을 보면 책방이 있는 데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면소재지에 책방이 있는 시골은 몇 군데나 될까요? 읍내쯤 되어야 비로소 책방이 있는 시골일 텐데, 시골 읍내 책방에서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학습지나 몇 가지 잡지를 뺀, 그야말로 ‘책이라고 하는 책’은 얼마나 갖출 수 있을까요?
책방이 없는 시골을 잘 들여다보면 어린이도 푸름이도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책방이 없는 시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젊은이도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나 푸름이나 젊은이가 많은 서울·부산 같은 커다란 도시에 책방이 아주 많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요즈음 마을책방이 새롭게 문을 여는 마을을 돌아보노라면, 어린이와 푸름이와 젊은이가 제법 있어요. 어린 숨결이나 젊은 넋이 아주 많지 않은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마을이 새롭게 살아나거나 깨어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마을책방이 문을 열곤 해요. 어린 숨결이나 젊은 넋이 마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고장 작은 마을에서 작은 책방이 문을 열어요.
“책방의 수가 적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만큼 앞으로의 책방은 책을 좀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요, 쌀가게는 쌀에 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방법이라든가 무엇을 섞으면 좋은가 하는 것들이요.” (208쪽)
“손님을 염두에 두고 매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매입하여, 일부러 찾아온 손님에게 주는 것. 저를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26쪽)
책방 한 곳은 꼭 커야 하지 않습니다. 책방 한 곳은 온갖 책을 잔뜩 갖추어야 하지 않습니다. 책방 한 곳은, 이 책방이 깃든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리와 몸과 마음을 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살며시 이끄는 징검돌이 될 수 있으면 즐겁습니다. 책방 한 곳은, 먼발치에서 먼걸음으로 찾아오는 나그네한테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서 책 한 권에서 싱그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쉼터가 될 수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해도 되어요. 상냥하고 흐뭇하게 이웃을 품으면 되어요. 더 많은 책을 챙겨서 읽도록 부추기지 않아도 되어요. 따스하고 넉넉하게 동무를 맞이하면 되어요. 마을책방이 마을사랑방이 됩니다. 마을사랑방이 마을잔치판이 됩니다. 마을잔치판이 시나브로 마을숲으로 피어납니다.
“책방의 일이란 사람 마음의 부드러운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책방은 사람의 소원이 벌거숭이가 되는 장소라고 할까요. 책방의 책장 앞에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장을 보며 자기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틈에 문득 들어오는 것을 무심히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69∼270쪽)
《앞으로의 책방》은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 책은 책방과 마을과 사람이 앞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작게 한 손을 거들어 보려는 꿈을 들려줍니다. 더 멋스러워 보이는 책방이 아닌, 수수하면서 사랑스러운 책방 이야기를 다룹니다. 더 대단하거나 훌륭해 보이는 책방이 아닌, 아기자기하면서 이쁜 책방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저는 ‘새벽’ 같은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밤의 공기와 아침의 공기가 섞인 1초로 밝기가 변하는 새벽의 순간. 밤과 아침의 중간 지점.” (286쪽)
우리 홀가분하게 마을책방으로 나들이를 해 보아요. 마을을 이루는 골목을 가벼운 차림새로 30분 즈음 걸어서 둘러보다가 마을책방에 들어서 보아요. 자가용을 싱싱 몰아 마을책방 앞에 떡하니 대어 들이닥치듯 곧장 들어서지 말고요, 자가용을 몰더라도 마을책방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한갓진 곳에 조용히 댄 뒤에, 이 500미터 길도 곧장 걸어오지 말고 샛골목으로 살그머니 들어가서 사뿐사뿐 느긋하게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보며 하늘바라기를 해 보고, 작은 골목꽃 냄새를 맡으려고 쭈그려앉아 보기도 하면서, 마을하고 책방을 함께 헤아려 보아요.
마을하고 책방이 어우러져서 마을책방이에요. 책방이 다문 한 곳만 있더라도 이 작은 책방 한 곳을 바탕으로 사이좋게 이야기꽃이 피어나기에 책방마을이에요. 마을책방이 서기에 책방마을이 되어요. 책방마을로 새롭게 일어서기에 마을책방이 문을 열어요.
우리들 작은 사람은 작은 손으로 작은 마을책방을 가꾸지요. 우리들 작은 사람은 작은 발걸음으로 작은 마을책방으로 마실하지요. 한 걸음씩 모아 천 걸음이 됩니다. 이 천 걸음이 천 리를 가는 신나는 걸음으로 거듭나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닌, 살림하고 사랑을 살피는 마을책방으로 나아가는 즐거운 길을 꿈꿉니다. 크기나 권수가 아닌, 사람하고 숲을 생각하는 마을책방으로 걸어가는 기쁜 길을 바랍니다. 숲은 책이 되어 주었어요. 책은 책방이 되어 주었지요. 책방은 마을이 되어 주었고, 마을은 사람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새롭게 숲으로 날개돋이를 해요. 2017.6.11.해.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책과 책읽기/책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