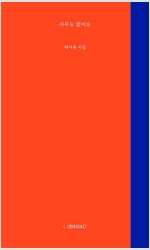숲노래, 시외버스에서 읽은 책 2017.6.7.
인천으로 강연여행을 나온다. 두 아이를 이끌고 하룻밤 사이에 일산까지 갔다가 고흥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서울로 시외버스를 달린 뒤에 인천으로 전철을 갈아탄다. 시외버스에서 두 시간 즈음 눈을 붙이지만 좀처럼 고단한 기운이 풀리지 않았으나, 이렇게 두 시간을 쉬어 주었기에 차츰 몸이 나아지는구나 하고 느꼈다. 아이들은 우리 보금자리에서 마음껏 뛰놀 테지, 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나대로 아버지로서 씩씩하게 바깥일을 보자고 마음을 먹는다. 시집 《아무도 없어요》를 천천히 읽는다. ‘최측의농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자그마한 노래이다. 나는 ‘시’를 늘 ‘노래’로 느낀다. 삶노래이거나 눈물노래이거나 웃음노래이거나, 사랑노래이거나 꿈노래이거나 아픔노래인 시라고 느낀다. 《아무도 없어요》는 더없이 아픈 목소리가 흐른다. 아픈 목소리로 흐르는 노래를 읽을 적에는 이러한 노래를 읽는 나도 함께 아플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나 스스로 아픈 노래보다는 기쁜 노래를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한테도 기쁜 삶노래를 들려주고픈 마음이 되어, 나 스스로 틈틈이 우리 살림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지어서 엽서만 한 종이에 적어서 아이들한테 주곤 한다. 《아무도 없어요》를 시외버스에서 조용히 차분히 가만히 되새겨 본다. 이 아픔은 누가 누구한테 터뜨리는 눈물일까. 이 고단한 목소리는 어디에서 샘솟아 어디로 흐르는 이야기일까.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소리가 바람처럼 살며시 내려앉는다.
(숲노래/최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