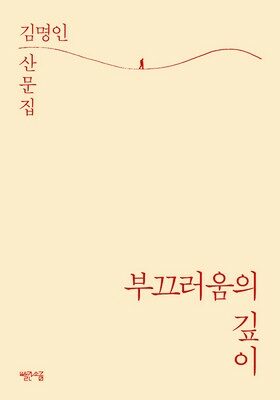-

-
부끄러움의 깊이
김명인 지음 / 빨간소금 / 2017년 3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301
이제는 아름다운 길을 가면 되겠지요
― 부끄러움의 깊이
김명인 글
빨간소금 펴냄, 2017.3.24. 12000원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일하는 김명인 님은 산문책 《부끄러움의 깊이》(빨간소금,2017)를 선보입니다. 문학비평을 하는 교수로서 쓴 비평이 아닌, 이녁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가 부끄러운 발자국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 첫머리는 눈이 자꾸 어두워져서 눈에 칼을 댄 이야기로 엽니다. 이윽고 글쓴이 스스로 겉하고 속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글쓴이는 말로는 으레 페미니스트라고 외친다지만 정작 집안일이나 아이키우기는 곁님한테 떠넘긴 고등룸펜일 뿐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1987년 어느 날 일을 적습니다.
1987년 2월 12일 새벽 5시쯤으로 기억한다. 장인, 장모, 아내, 아이와 함께 사는 집으로 또 그들이 나를 찾아왔다. 겨울 새벽, 철로 된 아파트 현관문을 나직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름다울 리 없었다. 먼저 잠을 깬 것은 아내였다. 곧이어 나도 잠을 깼고 영문을 모르는 장인 장모님도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27쪽)
윤상원은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궁극의 희생이란 아마도 가장 싱싱한 몸을,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잔인하게 떼어내 바치는 것이리라. (61쪽)
1987년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군사독재가 무너지던 해이지만, 군사독재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한 줌조차 안 될 권력이지만, 이들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새 나라를 바라는 물결을 두들겨패거나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악다구니라고 할까요. 평화가 아닌 독재로 권력을 움켜쥔 이들은 으레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민주를 짓밟았고, 군홧발은 사회가 기울어지도록 내몰았어요.
나는 그냥 좌파이기 때문이다. 좌파란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흑과 백 사이를 격렬하게 부딪쳐 나가는 자이다. (74쪽)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민주나 평화를 바라거나 찾거나 이룬 힘은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나 운동가한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수한 사람들한테서 커다란 바다 같은 힘이 솟구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물결도, 이승만 독재자를 밀어낸 물결도, 박정희 독재자를 거꾸러뜨리려는 물결도, 전두환·노태우·김영삼에 이르는 독재자를 몰아내려는 물결도, 모두 가장 밑바닥에서 샘솟았어요. 장갑차로 여중생을 깔아뭉갠 미군을 쫓아내자는 물결도, 숱한 막삽질과 시커먼 짓을 끌어내리자고 하는 물결도, 하나같이 수수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일어났습니다.
물결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촛불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닙니다. 물결은 언제나 물결 그대로이고, 촛불은 늘 촛불 그대로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어느 쪽에도 서지 않으면서 제 결을 깨달아서 똑똑히 마주할 수 있던 때에 비로소 슬기로운 눈을 틔웠고, 이때에 물결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진정 위대한 것은 이처럼 밑바닥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경계로부터 서서히 움터 나와 비로소 어느 날 갑자기 터지듯 나타난다. (174쪽)
이제 신경숙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어 보인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모습을 드러내어 ‘결과적 표절’이라는 답변을 하고 사과를 했으니 미흡하게 느끼더라도 어쩌겠는가. 그것은 그의 몫이고 자기 그릇 크기만큼의 결론일 테니 말이다. (249쪽)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나무라기는 매우 쉽습니다. 눈에 아주 쉽게 뜨이는 잘잘못이거든요. 신경숙 같은 이들을 꾸짖기도 아주 쉽습니다. 너무 뻔한 잘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은 잘잘못을 따져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만 해서는 늘 그 자리에서 맴돕니다.
나라를 바꾸려는 물결은 잘잘못을 따지려는 마음이 아니라고 느껴요. 엄청난 촛불 물결은 아름다움을 바라고 사랑스러움을 꿈꾸며 스스로 거듭나려는 몸짓이라고 느껴요. 이것을 때려눕히거나 저것을 쓰러드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가’를 차분히 생각하면서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적에 비로소 달라져요.
밥 먹을 때도 춥고 메말라 장갑을 찾는다. 키보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덕분에 더욱 게을러진다. 설거지는 물론 행주 빠는 일이 무서워 밥 먹은 식탁을 닦아내는 일도 하지 않는다. 부쩍 입맛에 맞는 사과나 감, 배 같은 과일을 먹고 싶어도 맨손으로 한 번 씻어내고 깎는 게 무서워 아내 없이는 찾아 먹지도 못한다. (93쪽)
내 몸이 추운 날, 나도 춥지만 곁님도 춥습니다. 내 몸이 추운 날, 나도 춥지만 아이들도 춥습니다. 내 몸이 춥다면 내가 사는 집이 따뜻하도록 바꾸어 내려는 몸짓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능금을 깎는지는 대수롭지 않아요. 다만, 말로는 페미니스트라고 외치면서 정작 집안일이나 아이키우기를 하나도 안 한다면, 허울뿐인 앵무새 좌파가 되겠지요. 이런 얘기를 구태여 글로 쓸 까닭 없이 스스로 삶을 바꾸고 살림을 바꿀 노릇이에요. 촛불을 든 사람들은 그저 촛불을 들었지, 이런 토를 달거나 저런 핑계를 붙이지 않았어요. 말없이 촛불을 들면서 스스로 새로운 사람으로 서겠노라 하고 하나하나 모였어요. 이러면서 이 힘이 바로 스스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물결로 되었고요.
《부끄러움의 깊이》를 썼다면, 이제 이런 글쓰기는 여기에서 끝내고, 다음에는 ‘손수 살림하는 하루’하고 ‘손수 흙을 만지는 하루’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런 새 하루는 구태여 글로 안 남겨도 됩니다. 몸으로 살아내면 넉넉합니다. “아름다운 하루”와 “사랑하는 살림”은 몸으로 피어나는 이야기꽃으로 저절로 춤추겠지요. 2017.4.25.불.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