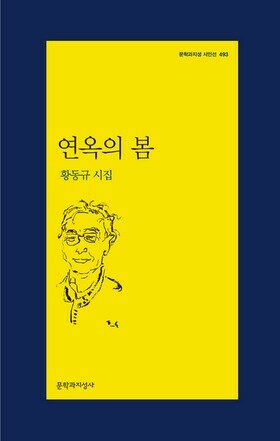-

-
연옥의 봄 ㅣ 문학과지성 시인선 493
황동규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6년 11월
평점 :



시를 노래하는 말 278
여든 앞둔 늙은 시인이 그리는 풀벌레 노래
― 연옥의 봄
황동규 글
문학과지성사 펴냄, 2016.11.24. 8000원
겨울이 되면 마을고양이는 따순 곳을 찾아서 웅크립니다. 때로는 혼자 웅크리고, 때로는 두어 마리가 함께 몸을 맞대고 웅크립니다. 제가 사는 시골집은 곳곳이 마을고양이한테 따순 곳이 되지 싶습니다. 때로는 평상 밑이, 때로는 평상 위쪽이, 때로는 자전거수레 밑이, 때로는 자전거수레 위쪽이, 때로는 헛간이, 때로는 섬돌이, 마을고양이가 웅크리고 해바라기를 하는 자리가 돼요.
오늘도 아침에 마루문을 열며 한 발을 내딛으려다가 멈칫합니다. 털이 하얀 고양이는 섬돌에 앉으면 눈에 잘 안 뜨여서 때로 밟기도 하거든요. 문득 멈칫한 뒤 가만히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얘야, 내려가도 되겠니?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널 밟을 텐데?’ 아침볕을 쬐며 웅크리던 고양이는 느리게 몸을 풀고 느리게 걸음을 옮깁니다. 몇 발자국 옆으로 가서 다시 동그랗게 몸을 맙니다.
얼추 열 마리쯤 우리 집 곳곳에 깃드는 마을고양이가 저마다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몸을 말며 겨울볕을 쬐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때로 이 고양이하고 매우 가까운 자리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고양이가 평상 밑에서 자면, 나는 평상에 누워서 살짝 등허리를 펴며 겨울볕을 함께 누려 보기도 합니다. 가을이 지났기에 겨울이요, 봄을 기다리기에 겨울인 이즈음, 황동규 님 시집 《연옥의 봄》(문학과지성사,2016)을 읽습니다.
중얼거림을 멈췄다. 눈앞에서 / 껍질 벗어 던진 나체의 석류 같은 천남성 열매 / 붉은 알 하나하나가 최면 걸듯 빛나고 있었다. / 생각들아 가을이 깊으면 / 겉도 속이 된다. (천남성 열매)
노령자 무료 독감 백신 맞으려 동네 병원에 갔다. / 이왕 오셔서 기다리신 김에 / 4만 원짜리 폐렴 백신도 맞고 가시라는 의사의 말에 / 얼씨구 이런 게 바로 시간 절약! / 하지만 저녁 병원 문 닫을 무렵부터 몸 오슬오슬 추워와 / 노령자에게 겹으로 백신 놓아준 의사, 돌팔이라 욕하며 / 새벽 2시까지 끙끙 앓다 간신히 눈 붙이고 (몸이 말한다)
1938년에 태어난 황동규 님이니 이제 제법 늙수그레한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여든인 나이입니다. 이리하여 ‘늙은 시인’은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늙은 할아버지’ 손님인 터라 “이왕 오셔서 기다리신 김”에 “4만 원짜리 폐렴 백신”도 덩달아 맞으라는 얘기를 의사한테서 듣습니다. 시인 황동규 님은 의사 말에 “얼씨구 이런 게 바로 시간 절약!”이라 여기며 그만 하루에 두 가지 백신을 맞았대요. 이러고서 이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끙끙 앓았다지요. “노령자 무료 독감 백신”에 “시간 절약!”을 노리다가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청력이 줄었는지 / 봄비 유난히 숨죽이고 창에 뿌리는 밤. / 테킬라 ‘호세 쿠에르보’ 한 잔 넉넉히 따라 마시고 누워 / 이 생각 저 생각 두어 시간 보내다 (명품 테킬라 한잔)
유채꽃인가, 다시 보니 배추꽃이었다. / 밭둑에 혼자 피어 있었다. / 어디선가 노랑나비 하나 날아와 /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다 말고 / 슬그머니 꽃에 내려앉는 순간 (사는 노릇?)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아픈 일 슬픈 일도 겪고, 기쁜 일 웃는 일도 겪어요. 젊은 날에는 귀가 잘 들렸어도, 어느덧 귀가 어두워지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젊은 날에는 한 잔 마시기도 어려웠을 “명품 테킬라”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한 잔 걸치면서 “나폴리 민요”라든지 여러 서양고전을 누릴 수 있기도 하지요.
귀뿐 아니라 눈까지 어두워지면서 유채꽃하고 배추꽃을 먼발치에서는 못 가리다가 가까이 다가서서야 비로소 배추꽃이네 하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배추꽃이로구나 하고 깨달으며 바라보다가 노랑나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하면서 투박한 하루하루가 시 한 줄로 새롭게 영글기도 하지요.
명예교수 휴게실에서 문학의 죽음에 대해 / 대책 없는 토론을 벌이다 채 끝내지 못하고 나와 / (이거 한평생 헛발질한 거 아냐?) / 차 시동 걸고 오디오를 켠다. / 옛 테너 스테파노가 부르는 나폴리 민요. / 순환도로에 오르자 시야 가득 벚꽃 휘날린다. (나폴리 민요)
여든을 앞둔 명예교수 황동규 님은 대학교 쉼터에서 “문학의 죽음”을 놓고 한참 말씨름을 하다가 불현듯 속으로 생각했대요. “이거 한평생 헛발질한 거 아냐?” 하고요. 참말로 어쩌면 한삶을 헛발질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삶을 헛발질을 했더라도 이 나름대로 재미나게 누린 나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노래를 듣듯, 자전거를 달리며 바람소리를 노래처럼 듣듯, 두 다리로 천천히 거닐며 스스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듯, 버스나 전철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 복닥거리는 소리를 노래마냥 받아들이든, 저마다 다르면서 뜻있는 나날이요 삶입니다. 흔한 하루가 아닌 언제나 오직 하나뿐인 하루요, 바로 이 하나뿐인 하루에서 하나뿐인 시가 태어나요.
어머님, 백 세 가까이 곁에 계시다 아버님 옆에 가 묻히시고 / 김치수, 오래 누워 앓다 경기도 변두리로 가 잠들고 / 아내, 벼르고 벼르다 동창들과 제주도에 갔다. / 늦설거지 끝내고 / 구닥다리 가방처럼 혼자 던져져 있는 가을밤, / 베토벤의 마지막 4중주가 끝난다. / 창을 열고 내다보니 달도 없다. (삶의 본때)
여름내 뿌린 소독약 때문인가 / 8층까지 올라오던 벌레들의 간절한 가을의 소리 / 끊겼다. / 벌레 소리 자리 뜨자 밤새 소리도 / 사라졌다. (늦가을에)
시집 《연옥의 봄》은 ‘늙은’ 시인 자리에 들어선 황동규 님이 ‘죽음’이란 참말 무엇인가 하고 더 가까이 생각하면서 쏟아낸 이야기를 담습니다. 연옥에도 봄이 올까요? 연옥에도 봄이 있을까요? 연옥에서도 봄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연옥하고 봄은 어울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얽히거나 설키면서 “삶하고 죽음” 사이에 놓인 실타래를 헤아립니다.
얼마 앞서까지 누리던 “아파트 8층 가을 풀벌레 노랫소리”가 농약(또는 소독약) 때문에 사그라들었다고 해요. 아파트 관리인은 소독약도 농약도 잔뜩 뿌려서 풀벌레를 모조리 죽이고, 풀벌레가 모조리 죽은 자리에는 새 한 마리도 깃들지 못하며, 이러한 아파트 꽃밭은 꽃나무만 멀쩡히 있는지 몰라도 아무런 소리 하나 없다고 합니다. 레이첼 카슨 님이 밝힌 “고요한 봄”마냥 소리가 없는 가을이란 가을답다고 느끼기 어려운 가을이리라 느껴요.
어쩌면 《연옥의 봄》이라는 시집에서 노래하는 ‘연옥’하고 ‘봄’이란, 이렇게 우리 곁에서 어느새 사그라들고 만 애틋하거나 살갑거나 따스한 소리를 그리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풀벌레가 노래하지 못하며 밤새도 노래하지 못하고, 개구리는 더더욱 노래할 수 없으며, 이런 가을 밤에는 시인도 노래를 그만 못하고 마는, 그런 얼거리라고 할까요. 거의 예순 해에 이르도록 시라고 하는 한길을 걸어온 늙은 시인이 마음에 담는 봄을, 늙은 몸에 담고 싶은 봄을, 앞으로 꿈처럼 그리고 싶은 봄을 고요히 생각해 봅니다. 2016.12.31.흙.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