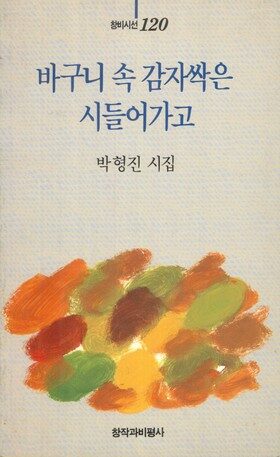-

-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 ㅣ 창비시선 120
박형진 지음 / 창비 / 1994년 3월
평점 :

품절

시를 노래하는 말 259
동냥아치 먹이는 어매한테서 물려받은 시골노래
―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
박형진 글
창작과비평사 펴냄, 1994.3.30.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고, 시골에서 살며 곁님을 만나 아이를 낳았고, 시골살림을 고이 건사하면서 하루를 지으려 하는 아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 아재는 손수 흙을 만져서 손수 밥을 먹는 살림을 사랑합니다.
시골 아재는 시골을 사랑하기에 시골집을 돌보고, 이녁이 곁님하고 낳은 아이는 시골바람을 마시면서 자라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이 시골
아재는 어느새 노래를 부르지요.
아침밥 해먹으면 / 마루 한번 훔칠 새 없이 / 무엇이 그리 바쁜지 밭으로 내달아야 하는
/ 우리와는 달리 / 애들 챙겨서 유치원 차 태워 보내고 /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노랠 들으며 / 그 형수씨 설거지한다 (서울에
와서)
시골 아재가 부르는 노래는 때로는 구슬픕니다. 때로는 성이 치밉니다. 때로는 푸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웃음이요 기쁨이며 벅찬 꿈이에요.
호미질을 하다가 노래를 하고, 가래질을 하다가 노래를 합니다. 지심을 매다가 노래를 하고,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시골마을을 바라보다가 노래를
합니다. 곁님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노래를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노래를 해요.
이런 노래는 알알이 글로 거듭나고 시로 다시 옷을 입어서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창작과비평사,1994)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땅을 장만하려는 마음 하나로 / 결혼하고 6년 동안을 / 담배도 끊어보고 술도
끊고 / 애도 더는 낳지 말자고 / 뱃속에 든 것에까지 몹쓸 짓을 했는데…… / 동네 땅금이 오천원에서 평당 육만원까지 오른 지금 / 내 꿈은
산산이 부서져 / 허공중에 흩어진 이름이 되었다 (서해안 바람 1)
땅금은 땅땅 올라 서해안 바람은 / 버스도 몇번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콘도를 들여와서 /
더 뜨거운 여름을 예비하고 있고 / 나는 땅 한 마지기를 살 수 없고 /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 / 외딴 조각밭에 잡초만 무성하고 /
나는 이제 밭에 가기 싫어졌다 (서해안 바람 2)
시집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를 쓴 시골 아재는 박형진 님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녁을 가리켜 ‘농부 시인’이라고도 일컫는데, 이녁이
남달리 뛰어나기에 시를 쓰는 흙일꾼이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흙을 만지고 곁님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골살림을 가꾸다 보니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골이웃이 줄고 시골사람이 사라지며 시골노래가 옅어지기 때문에, 박형진 님이 조용히 나서서 시골노래를 부르려
하는구나 싶어요.
박형진 님은 그동안 여러모로 재미난 글을 갈무리해서 책을 여러 권 내놓았습니다. 《호박국에 밥말아 먹고 바다에 나가 별을
세던》(내일을여는책,1996)이나 《다시 들판에 서서》(당그래,2001)나 《모항 막걸리집의 안주는 사람 씹는 맛이제》(디새집,2003)이나
《변산바다 쭈꾸미 통신》(소나무,2005)이나 《갯마을 하진이》(보리,2011)나 《콩밭에서》(보리,2011)나 《농사짓는 시인 박형진의 연장
부리던 이야기》(열화당,2015) 같은 책을 선보였어요.
슬레이트 지붕을 타고 녹아내리는 / 추녀 물을 세어본다 / 한 방울 / 또 한 방울 /
천원짜리 한 장 없이 / 용케도 겨울을 보냈구나 (입춘 단상)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설 때 / 너희는 버릇처럼 아빠 / 맛있는 것 좀 사다 달라고 했지
/ 맛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 아빠는 오늘 / 자지 않고 기다릴 너희를 위해 / 천원짜리 한 장을 아꼈다가 / 호빵을 샀다 (호빵을
사면서)
시골 아재는 시골 아재스럽게 시골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노동은 이제 돈이 되지 못한다” 하고 슬픔 섞인 노래를 부르고, “자지 않고 기다릴
너희를 위해 천 원짜리 한 장을 아꼈다가 호빵을 샀다” 하고 기쁨 감도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집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가고》를 읽으면 ‘천
원짜리’라는 말마디가 유난히 자주 나옵니다. 이 시골노래를 부르던 무렵이나 요즈음이나 그리 안 달라졌는데, 시골에서 시골지기가 땅을 일구어 얻은
남새나 푸성귀는 값이 거의 그대로예요. 스무 해 앞서나 요즈음이나 무 한 뿌리나 배추 한 포기 값은 엇비슷합니다. 쌀값도 그렇지요. 지난 스무
해 동안 찻삯이라든지 우표값이라든지 이런저런 물건값은 몇 곱으로 올랐어요. 그렇지만 ‘시골지기 일삯’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시골 아재는 자꾸 ‘천 원짜리’ 하나를 아끼고 애틋하게 바라보는 노래를 부를밖에 없구나 싶어요. 뙤약볕에 흘리는 땀이 천 원짜리
한 장이 못 되는 살림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이 천 원짜리 한 장을 아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맛난 것을 장만하려는 마음을 노래해요.
풀여치 한 마리 길을 가는데 / 내 옷에 앉아 함께 간다 / 어디서 날아왔는지 언제
왔는지 / 갑자기 그 파란 날개 숨결을 느끼면서 / 나는 / 모든 살아 있음의 제 자리를 생각했다 / 풀여치 앉은 나는 한 포기 풀잎 / 내가
풀잎이라고 생각할 때 / 그도 온전한 한 마리 풀여치 (사랑)
밭둑 가에 난 / 한 포가리 녹두 / 무심코 따 / 씹어보니 달싹하다 // 딸아, /
먹어보렴 / 칭얼대지 말고 / 시장한 배엔 / 녹두 꼬투리도 맛있구나 (지심)
바람이 한 줄기 불어 시골 아재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달래 줍니다. 구름 한 조각이 살며시 깃들어 시골 아재 등판에 내리쬐던 땡볕을 식혀 줍니다.
해거름에 반딧불이가 나타나 시골 아재 시름에 젖은 눈가를 어루만져 줍니다.
풀여치 한 마리가 노래로 다시 태어납니다. 풀여치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작고 수수하면서 투박한 사랑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녹두 한 포가리가 노래로 새로 태어납니다. 지심을 매다가 녹두 한 포가리를 훑어서 씹다가 빙그레 웃는 노래를 짓고, 이 노래를 아이들한테
물려줍니다.
설을 며칠 앞두고 어머닌 / 동네 노인들과 두부를 하시는데 / 방안에 앉아 있노라니 /
왠지 밖이 떠들썩하다 / “동냥? 워매 세상에 / 지금도 동냥 얻으러 댕기는 사람이 있구만잉, / 이리 들어와서 불 좀 쬐소 내 / 쌀 한 됫박
퍼올텡게” / 동냥 소리에 놀라 / 나도 밖으로 나가보니 / 두부를 하다 말고 어머닌 / 물바가지에 하나 가득 쌀을 퍼다가 / 동냥아치 주머니에
부어주시고 / 두부 한 모는 썰어서 상에 받쳐서 / 두 동냥아치를 먹이시네 (어머니)
시골 아재 노래는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이녁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아서 새롭게 가꾸었겠지요. 동냥아치를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들여서 밥을 먹이고 아끼는 손길을 늘 지켜보고 마주하던 마음이 자라고 자라서 시나브로 노래 한 가락으로 태어났겠지요. 그리고 이런
시골 아재 노래는 여느 때에 언제나 이녁 아이들한테 스며들어서 이녁 아이들도 가만가만 시골노래를 부르는 이쁜 숨결로 자랄 수 있었을
테고요.
바구니 속 감자싹은 시들어 가더라도, 이러는 동안 마음속에 품은 꿈까지 쪼그라들더라도, 흙을 만지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려는 손길은
어엿합니다. 겨울 지나 봄이 새로 찾아오면 다시금 씨앗을 심는 손길이 됩니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면 다시금 땡볕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들과
숲에 푸른 바람이 불도록 살림을 짓는 손길이 되어요. 이리하여 가을에 가을들과 가을숲에 서서 가을노래를 부르는 고운 시골 아재가 됩니다.
댓 마지기 농사 이것도 농사라고 / 우리 식구 모두가 매달려 / 새참 때 막걸리 한
사발의 목마름도 / 해결치 못하면서 / 그렇다 / 우리의 노동은 이제 / 돈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노동은 돈이 되지
못한다)
호미질 한 번에 노래 한 가락입니다. 삽질 한 번에 노래 두 가락입니다. 괭이질 한 번에 노래 석 가락이요, 고무래질 한 번에 노래 넉
가락입니다.
노래를 부르기에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부르는 마음이기에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부르며 삶을 가꾸려는 손길이기에 시를 씁니다. 노래를 부르는
살림으로 곁님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려는 꿈이기에 시를 써요. 온몸하고 온마음을 바쳐서 시를 써요. 따사로운 흙 품에 안겨서, 맑고 파란 하늘숨을
마시면서, 싱그럽게 춤을 추는 풀과 나무와 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 한 줄을 노래처럼 써요. 2016.9.28.물.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