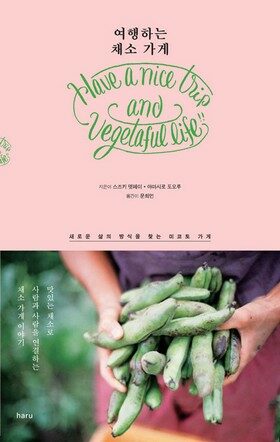-

-
여행하는 채소 가게 -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미코토 가게
스즈키 뎃페이 외 지음, 문희언 옮김 / 하루(haru) / 2016년 4월
평점 :



숲책 읽기 105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 여행하는 채소 가게
스즈키 뎃페이·야마시로 도오루 글
문희언 옮김
하루 펴냄, 2016.4.5. 13000원
나는 아주 어릴 적에 먹은 달걀 한 알을 아직 떠올립니다. 그 달걀 한 알 맛은 그때까지 먹은 다른 달걀하고 아주 다른 맛이었기 때문이에요. 외할머니가 시골집 닭장에 들어가서 꺼낸 달걀이었어요. 갓 낳은 말랑말랑한 달걀을 내 밥그릇에 톡 깨서 주셨어요.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며 흙하고는 먼 데에 있었으니 닭장에서 달걀을 얻는다는 대목을 살갗으로 잘 느끼지 못했으나 그때에 아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달걀은 그냥 먹을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어떤 목숨이로구나 하고요.
험준한 환경 아래에서 자란 사과는 크기도 작고 색도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무언가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사과가 계기가 되어 우리는 ‘먹는다’라는 것을 점점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2쪽)
스즈키 뎃페이·야마시로 도오루 두 사람이 함께 쓴 《여행하는 채소 가게》(하루,2016)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은 ‘가게는 따로 없이 짐차로 남새를 날라서 시골하고 도시를 잇는 일’을 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남새장수는 틀림없이 남새장수이지만, 여느 남새장수하고는 다른 두 젊은이 이야기를 다루어요.
두 젊은이는 처음에는 다른 여느 젊은이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이나 먹고, 그냥 사다가 먹으며,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는 삶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두 젊은이는 ‘그래도 이 삶은 뭔가 아닌 듯해’ 하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고, 이 여행길에서 만난 ‘못생긴 능금 한 알’을 맛보다가 번쩍 하고 스치는 어떤 생각이 뭔가를 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학교의 교실과 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와 동료가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기분 나쁩니다. 모두 똑같다면 자리를 바꾸는 설렘도 첫사랑의 두근거림도 없을 것입니다. 채소도 인간도 십인십색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개성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쪽)
처음에는 씨앗을 채집하기 위한 꽃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 꽃에 벌레가 모이는 것을 보고, 꽃가루를 매개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생물의 다양성의 중심이 ‘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꽃을 통해서 채소와 이야기 나누고, 꽃에서 꼬투리, 꼬투리에서 씨앗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채소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67쪽)
남새장수가 된 젊은이는 한동안 시골에서 지내며 시골일을 거듭니다. 손수 흙을 만지고 바람을 마시면서 하루를 열다 보니, ‘늘 먹던 밥’이 ‘그냥 먹는 밥’이 아니라는 대목을 몸으로 알아차립니다. 모든 열매나 곡식은 ‘똑같이 생길’ 수 없는 줄 제대로 보면서 제대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만 서로 다르게 생기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다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대목을 뒤늦게 배웠다고 합니다.
들에 피는 꽃도 모두 달라요. 풀줄기도 모두 달라요. 풀잎이나 나뭇잎도 참말 모두 다르지요. 나무 한 그루에 맺히는 수십만 잎조차 똑같은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다 다른 숲이요 삶이요 목숨이요 숨결인데, 막상 우리가 가게에 가서 눈앞으로 마주하는 남새나 열매는 거의 다 똑같이 생깁니다. 흔히 일컫는 ‘규격화’를 이루어요.
일반적으로 일본 채소의 씨앗 자급률은 약 10%라고 합니다. 씨앗 자루의 뒤를 보면 대부분이 해외에서 채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기른 채소도 사실은 수입 씨앗에 의존한 것입니다. 만약 씨앗 가격이 올라 수입이 중지되면 농가는 작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F1’이라고 부르는 품종 개량된 씨앗입니다. (124쪽)
도시 문명이 발돋움하면서 규격화는 더욱 크게 퍼집니다. 학교와 회사도 거의 규격화입니다. 그러니까 ‘틀에 맞추는 모습’이 되어요. 사람들 옷차림도 틀에 맞춥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담는 지식도 틀에 맞춥니다. 사람들이 읽는 글이나 기사나 책도 틀에 맞춥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저마다 쓰는 글조차 틀에 맞추고 말아요.
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 다른 글을 쓸 수밖에 없을 테지만, 사회에서는 ‘틀(규격화)’을 외칩니다. ‘잘 쓴 글’이라든지 ‘보기(모범)가 되는 글’을 외쳐요. 틀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몸짓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맙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도 몇 살에 뭐를 하고 또 몇 살에 어디에 보내야 한다는 틀이 무시무시하게 섭니다.
단절되어 있으면 속임수가 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지 알 수 없으니까 좀 적당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요. 그것이 맛있었는지 아니었는지 반응이 없으니까 보람을 찾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람이 되는 것일까 말한다면 돈이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어버려요. 농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차산업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채소가 점점 공업 제품화된다고 생각합니다. (139쪽)
《여행하는 채소 가게》를 쓴 두 젊은이는 스스로 묻습니다. 흙을 짓는 사람하고 밥을 짓는 사람 사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가장 맛난 밥이란 스스로 흙을 지은 뒤에 스스로 살림을 짓는 손길로 스스로 밥을 짓는 길이라고 하는 대목을 배우면서 다시금 스스로 묻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일본이나 한국 모두 이 ‘길’이 뚝 끊어졌다고 할 만한데, 이 끊어진 길을 어떻게 다시 이을 만한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한 사람 힘으로 이 끊어진 길을 다시 잇기는 어렵다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한 사람부터 이 끊어진 길을 새롭게 이어야 하지 싶습니다. 사회나 정치가 이 길을 이어 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새롭게 천천히 하나씩 조금씩 이을 노릇이지 싶어요.
도쿠시마에서 우리가 본 바다, 하늘은 모두 남색이었습니다. 선조들은 그 다채로운 청을 식물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식물 속에 이렇게 깊은 색이 잠자고 있다니, 자연의 ‘장치’라는 것은 역시 ‘순수’한 것 같습니다. (118쪽)
눈부신 쪽빛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엽니다. 쪽빛처럼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짓습니다. 하늘을 닮은 바다를 노래하면서 마실을 다닙니다.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골짜기에 마실을 가 보면, 골짝물은 숲빛을 닮아 푸릅니다.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달려서 바다에 마실을 가 보면, 바닷물은 하늘빛을 닮아 파랗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 몸을 이루지요. 우리가 즐거운 손길로 지은 땅에서 기쁜 웃음으로 거둔 남새를 스스로 어루만지면서 밥을 차린다면, 이 밥 한 그릇에는 저마다 다른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이 서릴 만하리라 느껴요.
더 맛나거나 더 좋은 밥이 아니라, 즐거우면서 기쁜 밥이 될 때에 하루가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내 즐거운 손길을 아이들이 물려받으면 참으로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쁜 살림을 아이들이 찬찬히 배우면서 새롭게 북돋운다면 그야말로 기쁘리라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밥이 아니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자는 생각으로 함께 먹는 밥이 되도록 다스리자고 꿈을 꿉니다. 2016.7.18.달.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