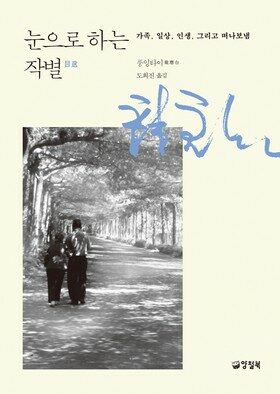-

-
눈으로 하는 작별 - 가족, 일상, 인생, 그리고 떠나보냄
룽잉타이 지음, 도희진 옮김 / 양철북 / 2016년 5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253
아이 같은 어버이, 어버이 같은 아이
― 눈으로 하는 작별
룽잉타이 글
도희진 옮김
양철북 펴냄, 2016.5.10. 14000원
어버이는 아이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아이한테 돈을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아이한테 학원 교육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한테 여느 학교 교육을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아이한테 ‘집에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조용한 살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이한테 오직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어버이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아이는 어버이한테서 받은 대로 마음하고 몸을 키웁니다. 아이는 어버이와 함께 살면서 마음속으로 꿈을 키웁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으로 마음이랑 몸을 살찌우면서 꿈을 키워요. 사랑이 없이 다른 것(돈이나 학원이나 학교)만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이 빠진 채 다른 것만 바라보는 마음이나 몸이 될 수 있어요.
어른이자 어버이인 우리는 아이하고 어떻게 살 적에 즐거울까요? 어버이요 어른인 우리는 아이한테 무엇부터 주고 무엇부터 나누며 무엇부터 베풀 때에 아름다울까요?
가끔 나는 아파트 창밖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안드레아의 모습을 내려다보곤 한다. 늘씬한 청년이 회색빛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나처럼 저 아이의 마음속에도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가 있겠지만, 상상에 그칠 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버스가 도착한다. 아이의 뒷모습이 버스 안으로 사라진다. 버스가 떠나자 텅 빈 길가에는 우체통만 덩그러니 남는다. (17쪽)
룽잉타이 님이 쓴 《눈으로 하는 작별》(양철북,2016)을 읽습니다. 이 책은 룽잉타이라는 분이 두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째, 어머니요 어버이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흐릅니다. 둘째, 딸이요 아이로서 어버이를 마주하는 이야기가 흘러요.
책을 읽다가 문득 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이요 어른’입니다. 나이가 열 살이라면 ‘그냥 아이로만 있다’고 할 만하지만, 열 살 아이는 어느새 스무 살이 되고 마흔 살을 거치며 예순 살을 지나요. 나이가 여든 살이라 하더라도 ‘백 살 어버이’나 ‘백열 살 어버이’가 튼튼히 살아서 곁에 계실 수 있어요.
문득 끼니 걱정을 혼자 어깨에 짊어졌던 엄마를 떠올린다. 그녀도 엄마가 되기 전에는 서재에 몰래 숨어들던 소녀였겠지. (88쪽)
우리는 늘 두 자리에 함께 서면서 살아간다고 느낍니다. 어버이한테서 태어난 아이라는 자리에 서서 생각을 짓고 살림을 가꾸어요. 아이를 낳은 어버이라는 자리에 서서 마음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요.
어버이한테서 받은 사랑을 아이한테 물려줍니다. 어버이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더라도 아이한테는 사랑을 물려주려 합니다. 어버이한테서 그리 반갑지 않은 것을 물려받았어도 아이한테는 ‘반갑지 않은 것’은 안 물려주려 할 수 있고, 어버이한테서 물려받은 ‘반갑지 않은 것’을 아이한테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어요.
친구는 가난했던 기억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비좁은 뒷골목에 자리잡은, 골목만큼이나 비좁은 집 안은 가득 쌓인 일감으로 더욱 좁게 느껴졌다고 한다. 플라스틱 조화와 크리스마스 전구를 끼우는 일이었는데, 그 집에서 언제나 피로에 지친 엄마가 유럽으로 팔려나갈 값싼 크리스마스 장식을 쉴 새 없이 조립했다. (202쪽)
두 자리에 선 사람은 이녁 아이 앞에서는 쓸쓸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흐르다가도, 이녁 어버이 앞에서는 살며시 투정을 부리거나 떼를 씁니다. 두 자리에 선 사람은 이녁 어버이 앞에서 아쉬우면서도 애틋한 사랑을 느끼다가, 어느새 이녁 아이도 이녁을 바라볼 적에 ‘어머니(어버이)는 왜 새롭게 나아가려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려주기에 아차 하고 무릎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 정말 웃겨요, 아빠도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지는 않았겠죠? 아빠는 젊었을 때 차가 뒤집힌 적도 있잖아요. 도로를 벗어나면서 그대로 뒤집혔다면서요. 아빠도 젊어서 그랬겠죠? (272쪽)
아이 같은 어버이입니다. 아이처럼 해맑은 마음을 고이 품으면서 즐겁게 살림을 짓고 싶은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같은 아이입니다. 어버이인 내가 때때로 잘못을 하거나 서툰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이런 어버이를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되지?” 하는 말로 달래 줍니다.
아이들은 어버이를 늘 기다려 줍니다. 밥을 좀 늦게 차려도 기다려 줍니다. 살림돈이 떨어져서 옹송거려도 기다려 줍니다. 밭일을 하느라 바빠서 함께 놀지 못해도 밭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참으로 아이들은 잘 기다려 주고, 잘 지켜보면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 어버이인 나는 아이들을 얼마나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막 바닥을 기는 갓난쟁이더러 일어나서 걸으라고 할 수 없겠지요? 글씨를 아직 모르는 아이더러 글을 써 보라 할 수 없겠지요? 차근차근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따스한 손길과 말길과 눈길로 마주할 적에 아이들은 느긋하면서 씩씩하게 자라리라 느낍니다. 《눈으로 하는 작별》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대목을 넌지시 짚습니다. 그저 따스한 눈길이 되자고, 그저 넉넉한 손길이 되자고, 그저 사랑스러운 마음길이 되자고 하는 이야기를 수수하게 펼칩니다.
아이들은 ‘비싼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엄청난 놀이공원’이 아닌 ‘함께 노는 어버이 손길’을 바랍니다. 아이들은 ‘값비싼 아파트’가 아닌 ‘따사로운 보금자리’를 바랍니다. 수수한 자리에서 수수하게 빚는 살림이면서 수수하고 바라보는 눈망울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2016.6.3.쇠.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