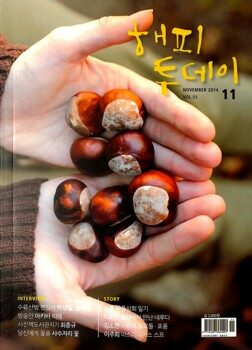-

-
해피투데이 2014.11
월간 해피투데이 편집부 엮음 / 혜인식품(월간지) / 2014년 10월
평점 :

품절

책읽기 삶읽기 174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온 이웃
― 해피투데이 2014.11. (51호)
혜인식품 펴냄
지난달에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전남 고흥까지 먼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은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철수와영희 펴냄,2014)이라는 책을 읽으셨고, 이 책을 시골에서 아이들과 살며 쓴 사람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인데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무렵 우리 곁님이 셋째를 막 배어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집 안팎으로 어수선할 때였기에 나도 몸이 고단했지만, 두 시간 남짓 이모저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 손님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해피투데이》라는 잡지 51호(2014.11.)에 실립니다.
.. 그는 아이들에게 ‘국어사전 말풀이’로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가만히 마음 소리에 귀를 기울인 다음, 마음으로 느끼는 이야기로 말을 들려준다. ‘꽃을 생각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어여쁜 꽃말이 자랍니다. 꽃을 헤아리면서 내 가슴속에 즐거운 꽃 그림이 태어납니다. 꽃을 이야기하니 어느새 내 꿈속에 즐거운 이야기 한 자락이 피어납니다(《숲에서 살려낸 우리말》에서).’ … 새로움을 찾고 이야기를 짓는 건 말의 뿌리를 찾는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말을 만드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과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지었을까 물으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을 짓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남이 모르는 말을 짓는 게 아니라 처음 꺼냈을 때 다른 사람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을 짓는 것, 쓰다 보면 익숙해져 그 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 (80, 83쪽/박상준)
옛날부터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없는 말’을 억지로 만들며 살지 않고, ‘쓸 말’을 즐겁게 지으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구별 어느 곳에서든 누구나 밥과 옷과 집을 스스로 지었어요. 지구별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 삶을 지었습니다.
‘삶짓기’를 한자말로는 ‘자급자족’이라 일컫습니다. 삶을 스스로 짓기에 말도 스스로 짓습니다. 아주 마땅한 노릇이에요. 손수 나물을 뜯고 손수 밥을 끓이며 손수 돗자리를 짜고 손수 기둥을 세우며 손수 짚을 엮어 지붕을 얹고 손수 아이를 낳아 손수 지은 배냇저고리를 입히고 손수 기저귀를 갈아 손수 빨래를 하는 …… 삶이니, 삶을 누리면서 쓰는 모든 말을 스스로 짓습니다. 예부터 한겨레가 고장마다 스스로 짓던 말은 ‘고장말’, 곧 ‘사투리’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짓지 않습니다. 밥도 옷도 집도 ‘남이 만든’ 것을 돈으로 사다가 씁니다. 더욱이, ‘남이 만든 것’조차, 남이 스스로 삶을 지으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똑같이 찍은 것’이기 일쑤입니다. 남이 스스로 지은 것이라면, 이때에는 ‘누군가 스스로 지으며 붙인 이름’이 있지만, ‘공장에서 똑같이 찍은 것’일 때에는 상품이름(상표)만 있어요.
삶을 녹여서 제대로 지은 이름이 아닌 상품이름만 있을 적에는 광고와 상업주의만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품이름’이 삶에서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장말’이나 ‘한국말’을 안 쓰기 일쑤예요. 영어를 쓰든 한자말을 쓰든 일본말을 쓰든, 아무렇게나 흐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쓰는 말도 이런 굴레에 갇힙니다.
이리하여, 나는 “시골에서는 도시와 달리 사람이 살아가는 얼거리나 바탕을 늘 겪으며 살아요. 똑같이 꽃 사진을 찍어도 날마다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우리 마당에 핀 꽃과,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본 꽃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예쁜 꽃만 찍으려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다 보니 저절로 즐거워요.” 같은 말을 들려줍니다. 글을 쓰는 일은 ‘문학 창작’이 아닌 ‘즐겁게 삶을 지으면서 쓰는 글’입니다. 사진을 찍는 일은 ‘예술 창작’이 아닌 ‘즐겁게 삶을 노래하면서 찍는 사진’입니다.
‘타성’이라는 한자말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골에 살면서 흙을 만지는 일이 타성에 젖으면 고단한 일밖에 안 돼요. 누구보다 나부터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야 해요. 고단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도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즐거우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옛날 시골에서는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삶과 사랑과 꿈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른 곁에서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 놀았고요. 시골스러운 삶을 찾는 일은 스스로 노래와 이야기를 찾는 일이에요. 학교나 책이 아닌 내가 스스로 생각을 기울여서 찾아야 해요.” 하고도 말합니다. 스스로 삶을 짓는 사람은 스스로 노래를 합니다. 손수 삶을 일구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말을 손수 짓습니다. 아이한테도 손수 이름을 지어서 붙이고, 밥·옷·집을 지으면서 손수 만든 연장에도 손수 이름을 붙여요.
‘토박이말을 찾아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찾으면 됩니다. 한자말을 안 쓰거나 영어를 몰아내거나 일본 말투를 씻어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을 깨닫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즐겁게 가꾸면 됩니다.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한테 말·넋·삶이 어떻게 얽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 신문과 TV가 보여주는 작금의 세상을 읽다 보면 세상이 과연 진보하고 있는지, 인류가 과거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자못 의심이 들 때가 많다 .. (11쪽/이희인)
이제 《해피투데이》 51호가 나옵니다. 내가 서울 손님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나부터 가만히 되새겨 읽은 뒤, 다른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잡지 첫머리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며 빙긋 웃는데, ‘신문·방송’을 보면 앞날이나 꿈을 느끼기 어려워요. 왜 그러할까요? 오늘날 신문이나 방송은 우리 앞날이나 꿈을 다루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상업주의에 물들고 광고와 시청율에 목을 매달아요. 그러니, 신문이나 방송을 보아서는 “의심이 들” 일만 많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모두 내려놓고는, 삶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보고 이웃들 삶을 보아야 해요. 내가 나한테서 꿈을 찾고, 나를 둘러싼 이웃한테서 꿈을 느껴야 합니다.
.. 바로 옆으로 흐르는 ‘또 다른’ 모습의 한강을 구경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강에는 파도가 전혀 없었다. 멀리 반대편을 보니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한강의 저편이 보였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만진 적 없는 속살 같은 곳. 어지럽게 풀이 엉켜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던 강변을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한강의 오래된 모습을 상상해 봤다. 당시 보이던 낯선 풍경 앞에서 조금 더 집중했더니 예전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까지 떠올랐다. 나무로 만든 배들이 잔뜩 떠 있거나 아주 깨끗한 물로 가득 찬 뭐 그런 장면들 .. (46∼47쪽/전진우)
자가용을 씽씽 달려도 서울에서 한강을 느낄 수 있지만, 자가용에서 내린 뒤 두 다리로 천천히 걷거나 자전거로 슬렁슬렁 달리면, 여느 때에는 못 느끼던 한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느 때에 못 느끼던 한강을 새롭게 느낀다면, 아주 깨끗하게 흐르던 냇물과 아주 착하게 살던 사람들 모습을 마치 꿈처럼 눈앞에서 떠올릴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면 참말 얼마나 즐거우면서 사랑스러울까요.
오늘날 시멘트 문명을 바라볼 노릇이 아닙니다. 굳이 먼 옛날을 되찾자고 할 까닭도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참답고 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즐거운 모습을 그려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면 돼요.
.. 호두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는 두껍고 딱딱한 녹색의 과육 안에 들어 있다. 그걸 깨면 흔히 알고 있는 갈색 호두가 들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딱딱한 갈색 껍질은 속껍질인 셈. 갓 딴 호두는 그 갈색 속껍질을 손으로 깰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 햇빛이 며칠 널어 말리는 새에 달그락 달그락 단단해지는 것이다. 갈색 껍질 속의 호두알 역시 나무에서 갓 따면 아주 얇은 막 같은 껍질을 손쉽게 벗길 수 있는데, 그렇게 나온 호두알은 정말 영양가를 듬뿍 머금은 듯 희고 뽀얗다 … ‘나무에서 바로 따서 먹으면 정말 좋은 열매구나’ 단박에 느껴진다 .. (52∼53쪽/이후)
시골사람 이야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어 《해피투데이》가 반갑습니다. 이 잡지를 엮는 분들은 서울에서 살 테지만, 그래서 서울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서울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이 나라 골골샅샅 여러 마을 이야기를 조곤조곤 엿볼 수 있어 반갑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사는 사람이 이 나라 절반이라 하니까, 서울과 경기 이야기만으로도 잡지 한 권쯤 뚝딱 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울과 경기에 사람이 많이 산달지라도 서울과 경기 이야기만 하면 좀 메말라요.
생각해 보셔요. 한국은 ‘서울나라’나 ‘경기민국’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시골 군은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동 한 군데 인구보다 훨씬 적습니다만, 내가 사는 전남 고흥은 기껏 6만 즈음 될까 말까 합니다만, 이곳도 ‘사람이 사는 마을’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이러한 시골사람 이야기를 모른 척하거나 아예 안 다루어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이나 경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 재미없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넘치는 이야기는 생각을 북돋우지 않습니다.
호두나무와 호두알 이야기는 얼마나 재미있나요. 갓 딴 호두알을 손으로 살살 벗겨 하얀 단물을 먹는 이야기는 얼마나 싱그러운가요. 호두뿐 아니라 밤도 이와 같습니다. 밤나무에서 갓 딴 밤도 새하얗습니다. 갓 딴 밤은 겉껍질이 아주 보드랍습니다. 손으로도 벗길 수 있지만, 겉껍질째 씹어먹어도 대단히 보들보들 맛나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람들이 집집마다 밭이나 숲을 거느리면서 ‘내 집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바로바로 열매를 얻어서 먹으면 누구나 몸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농약과 비료와 항생제와 촉진제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더 빨리 더 많이 뽑아내는 ‘대규모 공장 농업’으로 얻은 열매는 겉보기에만 굵거나 예뻐 보이지, 몸에는 도움이 안 되기 일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지만, 몸은 외려 나빠요. 오늘날 사람들은 돈으로 한겨울에도 딸기와 수박을 사다 먹을 수 있지만, 막상 몸뿐 아니라 마음도 많이 아파요.
《해피투데이》라는 잡지가 앞으로도 싱그러운 시골 이야기를 넉넉히 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손수 삶을 짓는 사람’ 이야기를 알뜰히 실어서 나누어 주기를 빕니다. 4347.10.24.쇠.ㅎㄲㅅㄱ
(최종규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