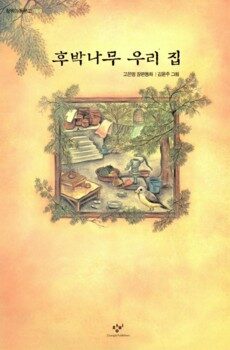-

-
후박나무 우리 집 ㅣ 창비아동문고 199
고은명 지음, 김윤주 그림 / 창비 / 2002년 4월
평점 :



어린이책 읽는 삶 54
마당에 나무가 자라는 집에서
― 후박나무 우리 집
고은명 글
김윤주 그림
창비 펴냄, 2002.4.27.
우리 식구는 인천을 떠나 전남 고흥에 깃들면서 비로소 ‘후박나무’를 알았습니다. 후박나무는 따뜻한 바닷가에서 짠 기운 섞인 바람을 마시면서 자라는 줄 배웠습니다. 울릉섬에서 이름난 엿은 ‘호박역’이 아닌 ‘후박엿’이었고, 후박엿을 고아서 먹은 까닭은 무척 오래 배를 타는 사람들이 배앓이나 배멀미를 하지 않으려는 뜻이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가 이제는 서울에서도 자랄 수 있다고 해요. 날씨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식구가 아직 인천에서 살 적에 석류나무를 곳곳에서 보았어요. 인천은 바닷가에 있는 동네이니, 씨줄로 살펴 다른 곳보다 따뜻하다 할 수 있다지만, 석류나무를 키우는 골목집이 퍽 많은 모습을 보곤 놀랐어요.
따지고 보면, 감나무를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키울 수 있으니, 날씨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를 느끼는 사람이 적거나 드물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 내가 사는 집은 방이 열 개나 되는 커다란 한옥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내 허리 굵기의 후박나무가 잎을 드리우고 있어,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후박나무 집’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이 되면 방방이 문풍지를 새로 붙여야 하고, 토방에서 봄볕을 쬐며 졸 수도 있지만, 비 오는 날엔 댓돌 위의 신발들을 토방 밑이라든지 부엌으로 들여놔야 하는, 여러분이 사는 집과는 좀 많이 다른 집이에요 … 아빠 기억 속의 풍경들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동네가 온통 재개발이 되어 대부분 아파트촌이 되었거든요 .. (11, 22쪽)
나는 골목집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곁님은 판잣집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는 전철길과 맞닿은 옥탑집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랍니다. 우리 집 작은아이는 멧골집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랍니다. 나는 어릴 적에 ‘나무가 우거진 집’을 꿈꾸었습니다. 아마 곁님은 ‘나무가 우거진 숲’을 꿈꾸었지 싶어요. 이런 꿈대로 우리 식구는 시골집에서 나무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그리 큰 마당은 아니고, 넓은 땅을 아직 누리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보금자리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우리한테 왔을까요.
큰아이는 개구리와 풀벌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달게 잡니다. 작은아이는 냇물이나 골짝물이나 바닷물이 흐르거나 철썩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새근새근 잡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빛을 가슴에 품습니다. 두 아이는 저마다 다른 숨결로 삶을 짓습니다.
곰곰이 떠올리면, 나는 어릴 적에 ‘나무를 심을 땅뙈기 없는 시멘트땅 도시 한복판’에서 맞이해야 하는 ‘나무 심는 날’이 거북했습니다. 도무지 어디에 나무를 심으라고 그런 날을 만들었을까요? 길가나 풀밭에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를 곱게 건사할 수 있을까요?
.. 수현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술 취한 아빠’입니다. 수현 아빤 평소엔 참 다정하고 농담도 잘하시는데, 술만 마시면 폭군이 된대요. 나는 그 사실을 4학년 때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 나와 경하는 가을을 제일 싫어하는데, 바로 낙엽 때문이랍니다. 쓸어도 쓸어도 또 떨어지는 낙엽은 정말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겨울에도 눈 오는 날 제사가 걸리면 우리는 땅으로 꺼져 버리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 (38, 77쪽)
네 식구가 시골에서 살며 궁금해 하는 대목은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풀이름과 나무이름입니다. 풀을 알고 싶으며, 나무를 알고 싶습니다. 풀과 나무를 알 적에 비로소 시골살이를 누린다고 느낍니다.
시골에서 만나는 이웃 가운데 나무나 풀을 빈틈없이 아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납니다. 우리 식구가 깃든 마을에서도 이와 같아요. 약으로 삼으려는 몇 가지 나무는 이름을 알 만하고, 이런 나무는 집집마다 몇 그루씩 키우는데, 마을 이웃이 약으로 삼지 않으나 먼 옛날부터 약으로 삼기도 하고 알뜰히 건사하며 아끼던 나무는 거의 모릅니다.
탱자나무와 찔레나무가 어떤 빛인지 아는 시골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가시나무와 아왜나무와 후박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 시골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동백나무와 초피나무에서 얻은 열매로 기름을 짜는 시골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무화과나무와 매화나무를 꾸밈없이 바라볼 줄 아는 시골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나무가 있어 숲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무는 홀로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 둘레에는 풀이 우거져야 합니다. 풀이 나무 곁에 우거지면서 나무는 한결 싱그럽습니다. 풀 또한 곁에 나무가 있으면서 한결 푸릅니다. 풀과 나무는 언제나 한몸이고, 이를 깨달은 한겨레 옛사람은 ‘푸나무’라는 낱말을 지었어요. 풀은 함부로 베거나 뽑아서는 안 되고, 나무는 함부로 자르거나 꺾어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지내는 작은 보금자리까지 망가지거든요.
..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것하고 여자인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실수한 건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인 태현이 때문 아니니? 너는 말끝마다 여자, 여자 하는데 여자로 태어난 게 무슨 죄니?” … “왜 여자들이 차 모는 것만 쓸데없는 거냐? 말끝마다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재수 없더라. 자기 엄마는 여자 아닌가, 뭐.” .. (86, 87쪽)
고은명 님이 쓴 《후박나무 우리 집》(창비,2002)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전남 고흥에 깃든 우리 보금자리에는 후박나무가 우람하게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늘 후박나무를 바라봅니다. 가을이 저물 무렵부터 후박꽃 몽우리가 맺히는 모습을 보고, 겨우내 굵어지는 모습을 보다가, 봄에 차츰 벌어지면서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요. 후박꽃은 늦봄에 지고 이른봄에 열매를 맺어요. 후박알이 맺으면 마을에 있는 온갖 새가 찾아들어 노래합니다.
이러다 보니, ‘후박나무’라는 이름을 붙인 《후박나무 우리 집》에 눈길이 갑니다. 다만, 책이름에 ‘후박나무’를 썼대서 후박나무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후박나무를 사잇그림으로 잘 그리리라고는 여기지 않았어요. 참말, 이 책에 나오는 나무 그림은 좀 엉터리라 할 만합니다. 후박나무는 네 철 푸른 나무이기에 가을에 잎이 지지 않아요. 오히려 후박나무는 봄과 여름에 잎이 져요. 가을과 겨울을 난 뒤 봄까지 기운을 낸 잎이 한봄에 이르러 누렇게 물들면서 사오월 사이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77쪽에 나오듯이 ‘낙엽 쓸기’는 후박나무 집에서는 가을에 하지 않아요. 봄에 합니다.
아무래도 《후박나무 우리 집》을 쓴 고은명 님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낡은(오래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사내)들을 바꾸는 어린이(가시내)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지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마당에 나무가 있는 집’을 글감으로 삼았고, 나무 가운데에서 후박나무를 꼽았구나 싶어요.
마당에 나무가 자라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결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늘 나무를 바라보거든요. 나무를 바라보며 크는 아이하고 자동차를 바라보며 크는 아이는 참으로 다릅니다. 나무를 바라보다가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보는 아이하고 자동차를 바라보다가 공장과 송전탑을 바라보며 크는 아이는 사뭇 다릅니다.
어린이책 《후박나무 우리 집》에서 ‘후박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곁다리입니다. 굳이 ‘후박나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감나무’나 ‘은행나무’나 ‘오동나무’여도 됩니다. 어쩌면, ‘오동나무’로 넣을 때에 걸맞을 수 있습니다. 예부터 한겨레가 오동나무를 심은 까닭을 헤아린다면, 이 동화와 걸맞다 할 만해요.
이 작품에서 후박나무를 꼭 살리거나 밝히면서 들추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따스하면서 소금 기운이 섞인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후박나무를 굳이 ‘서울 한복판’에까지 끌어들였다면, 이 나무를 마주하거나 바라보는 아이들 마음에서 어떤 꽃이나 잎이 샘솟아서 줄기가 뻗거나 뿌리가 내리는 실타래를 보여줄 만하리라 생각합니다.�
.. 선우를 낳던 해에 불행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신문 배달을 나갔던 아저씨가 교통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아저씨를 친 운전자는 그냥 도망을 가 버렸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이라 목격자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 아빠께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아빠도 많이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도 변하는 게 별로 없는데, 여자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공연히 남자들이 모두 미워집니다 .. (110∼111, 124쪽)
후박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참말 새가 하루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마당에 앉아서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새들은 동무 새한테 노래합니다. ‘얘들아, 여기 봐. 후박알이 멋지게 맺혔어. 우듬지에서 열매를 먹으면 되니까 얼른 이리 와!’ 이 노래대로 새들은 자꾸자꾸 모입니다. 우리 집 후박나무에 모인 새들은 후박잎을 먹고 살던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덤으로 옆에 있는 초피나무에서 초피잎을 먹던 범나비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덤으로 우리 집 풀밭에서 살아가는 메뚜기나 사마귀를 잡아먹습니다.
나무가 자라기에 나무에 맞추어 온갖 애벌레가 찾아들고, 애벌레가 찾아들어 나비가 깨어나면 나비를 보러 다른 새가 찾아들며, 나무 곁에서 생기는 풀밭에는 개구리가 깃들고, 개구리는 풀밭에서 이슬을 먹는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가만히 삶을 지켜봅니다. 차근차근 삶을 헤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에 아름다울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어깨동무를 할 적에 사랑이 빛날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압니다. 어른들도 다 압니다. 다만, 아는 대로 슬기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면서 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다 아는 이야기를 슬기롭게 밝히면서 살아갈 마음을 왜 못 품을까요?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서로서로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기를 빕니다. 4347.6.14.흙.ㅎㄲㅅㄱ
(최종규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