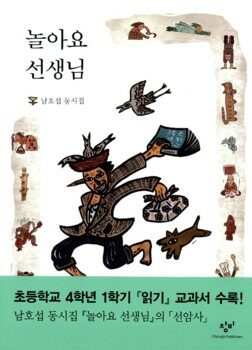-

-
놀아요 선생님 - 남호섭 동시집
남호섭 지음, 이윤엽 그림 / 창비 / 2007년 1월
평점 :



시를 사랑하는 시 26
함께 살아가면 모두 노래
― 놀아요 선생님
남호섭 글
창비 펴냄, 2007.1.10.
사월 십육일은 우리 면소재지에서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면민잔치를 합니다. 그러께에는 면민잔치 하는 날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에는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께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줄다리기나 달리기를 함께 했지만, 올해에는 순천에 일이 있어 다녀오느라 면민잔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해가 기우는 저녁에 두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면소재지에 살짝 들러 봅니다. 잔치를 마무리하는가 하고 살짝 들여다봅니다. 면소재지를 쩌렁쩌렁 울리는 노래가 울립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곳곳에 치고 북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자전거에 탄 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하고 말합니다.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 만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댈 만한 자리도 없고 너무 시끌벅적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자. 오늘은 안 되겠어.” 하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자전거에서 잠듭니다. 샛자전거에 앉은 큰아이가 “저기 꽃길로 가요.” 하고 말합니다. 큰아이 말이 아니더라도 유채꽃이 물결치는 들길로 갈 생각입니다. 들길로 접어드니 큰아이는 “나 걷고 싶은데.” 하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같이 걸어 볼까.
자전거를 세웁니다. 큰아이는 콩콩 뛰듯이 걷습니다. 수레에 앉은 작은아이는 하염없이 잡니다. 천천히 유채꽃 들길을 지나가니 꽃내음이 물씬 퍼집니다. 큰길로 지나가는 자동차는 하나도 없고, 아주 호젓합니다. 호젓하며 조용한 들길에는 바람소리만 흐릅니다.
.. 숲 속 나무들처럼 / 우리는 그저 지켜 주었고 / 숲 속에서 정식이는 / 천천히 아주 천천히 / 마음 문 열어 갔다 .. (정식이, 간디학교 7)
보름달이 밝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기 앞서 “애들아, 마당으로 나와 보렴. 달 구경 하자.” 하고 부릅니다. “달이요?” 하면서 두 아이가 쪼르르 나옵니다. 아주 환한 보름달인데, 달 둘레로 별이 몇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지만 달빛이 워낙 밝아 별빛은 사그라듭니다.
까르르 웃고 떠드는 아이들 목소리 사이로 개구리 소리가 들립니다. 응? 우리 집 옆밭에 개구리가 있나? 아이들더러 “쉿. 조용히 해 보렴.” 하고 말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왁 왁 하는 개구리가 두 마리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 개구리입니다. 겨울잠을 깬 개구리이지 싶습니다. 밤에도 포근한 날씨이니 개구리가 깨어나서 노래할 만합니다.
.. 진선이와 수람이가 얘기했습니다. // 별이 정말 예쁘지 않니? / 그래, 우리 침낭 들고 나가서 자자 .. (굼벵이, 간디학교 12)
순천으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적에 이웃 봉서마을에서 군내버스를 내렸습니다. 우리 마을 어귀로 지나가는 버스는 없어, 이웃마을에서 내린 뒤 걸었습니다. 이웃마을부터 천천히 걸어서 돌아오는데, 들판을 날며 노는 제비를 여섯 마리 즈음 봅니다. 고흥에도 비로소 제비가 오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제 읍내에서 제비 두 마리를 보기도 했습니다. 제비들은 멋진 날갯짓으로 싱싱 하늘을 가릅니다. 우리 집 처마 밑으로도 제비가 찾아올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집을 찾아오던 제비는 마을에서 끔찍하게 뿌려댄 농약 때문에 모두 숨을 거둔 듯한데, 우리 집뿐 아니라 우리 마을에 제비가 깃들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농약물결에서 살아남은 제비가 있어 다시 우리 집 처마 밑으로도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여러 마을에서 농약물결은 멀리하거나 줄이면서 흙을 살찌우고 가꾸며 돌보면 얼마나 즐거울까 싶습니다.
시골 할매와 할배도 뻔히 알거든요. 도시로 떠난 이녁 딸아들은 ‘농약을 쳐서 키운 남새’를 가져가지 않아요. 농약을 쳐서 키운 남새는 죄 ‘농협 수매’를 합니다. 이녁 딸아들이 도시로 떠난 뒤 낳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아토피를 앓으니 모두 도시에서 비싼값을 치르며 유기농 곡식과 남새를 사다 먹는데, 막상 시골 어르신들은 농약을 줄이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일손이 달리니 농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도시로 떠난 딸아들은 시골 일손을 거들지 못합니다.
.. 우리 손으로 / 교실도 지을 수 있다면, // 먼 산이 보이는 큰 창에는 / 하늘을 한가득 담아 두고 / 반대쪽 창에는 숲을 들어앉히고 / 새잎 나서 단풍 들 때까지 / 다 볼 수 있을 텐데 .. (우리 교실, 간디학교 15)
지난주에 며칠 서울마실과 일산마실을 했습니다. 도시는 벌써부터 찜통입니다. 도시는 봄이 없는 듯합니다. 고흥과 이웃한 순천도 벌써 찜통입니다. 시골이 아닌 도시는 모두 후끈후끈 덥습니다.
사람들은 으레 ‘봄이 사라졌다’고만 말합니다. 왜 봄이 사라졌는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시골은 사월에 사월빛이 어립니다. 시골은 밤이나 낮이나 후끈후끈 무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있고 풀이 있으며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흙이 있으니 햇볕을 받아들이는데, 흙만 있대서 햇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풀이 자라야 햇볕을 받아들입니다. 풀이 싱그럽게 우거진 흙이 있을 때에 봄볕이 포근합니다. 풀이 없이 메마른 흙만 있으면, 풀이 없는 민숭민숭한 밭이나 논이라면 도시와 똑같이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나무가 있어도 나뭇가지를 뭉텅뭉텅 베어 나무가 나무답게 살아갈 수 없으면,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무덥습니다. 가지를 잘린 나무는 그늘을 베풀지 못합니다. 가지를 잃은 나무는 싱그러운 잎바람을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 우산을 같이 씁니다. / 동무 어깨가 / 내 어깨에 닿습니다 .. (사랑)
남호섭 님 동시를 그러모은 《놀아요 선생님》(창비,2007)을 읽습니다. 간디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겪은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간디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주한 즐겁고 예쁜 눈빛이 싯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간디학교이기에 이만 한 시가 태어날 수 있다고는 느끼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 있든 아이들 눈빛을 읽을 수 있으면 아름다운 시가 태어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배우며 사랑하면 누구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놀지 못하고 함께 배우지 못하며 함께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시 한 줄 노래하지 못합니다.
.. 시골 갔다 오던 / 버스가 갑자기 끼이익! / 섰습니다. // 할머니 자루에 / 담겨 있던 / 단감 세 알이 / 통, 통, 통, / 튀어 나갔습니다 .. (가을)
글 한 줄은 삶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스스로 글로 옮깁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스스로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가 없으면 글도 그림도 사진도 없어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스스로 길어올리지 못하면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더 좋거나 덜 좋은 노래란 없습니다. 모두 노래입니다. 굳이 꾸미려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이야기요 삶이며 노래입니다. 애써 덧바르거나 만지작거려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하게 사랑하면서 노래입니다. 투박하게 어깨동무하면서 꿈입니다. 살가이 손을 맞잡으면서 시 한 줄입니다.
동시집 《놀아요 선생님》은 ‘놀아요’ 하고 노래하기는 하는데, 막상 어른들은 어떤 놀이를 하는지, 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골고루 즐기는지는 그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흐드러지게 놀고, 더 신나게 놀며, 더 실컷 놀기를 빌어요. 놀이 아닌 삶이 없어요. 밥짓기도 놀이이고, 빨래하기도 놀이입니다. 마냥 뛰고 달리면서 놀이요, 책읽기나 풀뜯기도 놀이입니다. 4347.4.17.나무.ㅎㄲㅅㄱ
(최종규 . 2014 - 시골에서 동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