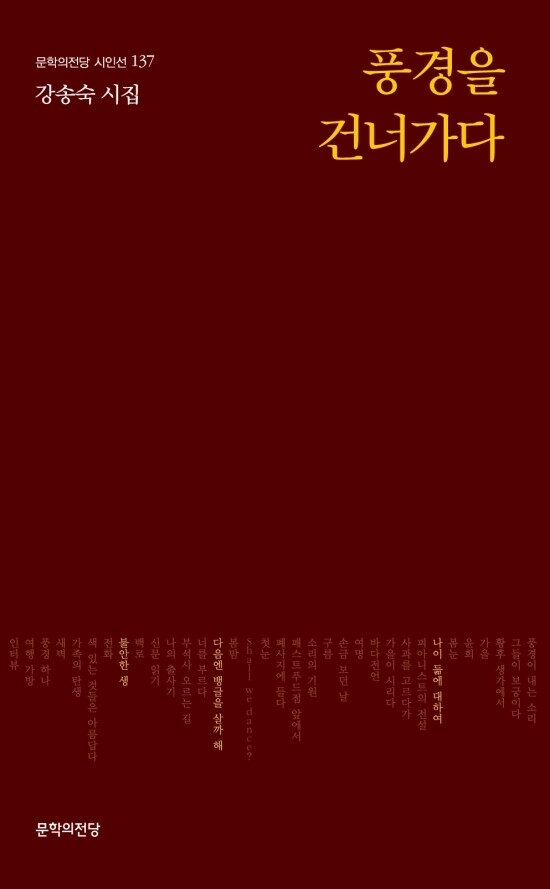-

-
풍경을 건너가다
강송숙 지음 / 문학의전당 / 2012년 10월
평점 :



시를 노래하는 시 60
아이와 건너가는 구름다리
― 풍경을 건너가다
강송숙 글
문학의전당 펴냄, 2012.10.22. 8000원
졸린 아이를 재웁니다. 큰아이도 작은아이도 졸릴 적에는 웁니다. 이제 큰아이는 여섯 살 어린이로 살아가니, 졸립더라도 울지는 않고 씩씩하게 버티다가 품에 살포시 안으면 이내 곯아떨어지기만 합니다. 작은아이는 비틀비틀 버티다가 품에 포옥 안기는데, 비틀비틀 졸음에 겨울 적에 안아 주지 않으면 으앙 울음을 터뜨리며 얼른 안아 달라 부릅니다. 이때에 작은아이를 바로 안으면 품에서 한참 놀면서 잠이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아이가 으앙 울면서 달려오면, 얘야 왜,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알지, 그만 울고 말을 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울겠어요. 졸리니 울지요. 말을 안 해도 뻔히 알지만, 아이가 참말 졸린지, 그야말로 졸려서 재워 달라는 뜻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졸립구나, 그러니 조금 느긋하게 일어났어야지, 그렇게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났으면 밥을 먹고 곯아떨어졌어야지, 그렇게 뛰노니까 네 졸음을 네 몸이 못 견디고 이렇게 울잖니.
.. 내버려두면 잘 살아갈 것을 곁에 두고 볼까 하는 마음에 물고기 몇 마리 작은 연못에 넣었습니다. 스스로 물살에 치이고 거친 돌에 부딪치며 살던 것이 조용하고 맑은 물에도 견디지 못하고 한 마리씩 죽어 올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밤새 죽어 몸이 불은 물고기를 건져 나무 주변에 묻어 줍니다. 그렇게 대여섯 마리가 소나무 거름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종일 뜨거웠던 여름 한날 소나무 가지 끝에 반짝이던 것이 혹, 물고기 비늘이 아니었을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 (윤회)
큰아이가 꽃송이를 줍습니다. 큰아이를 부릅니다. 너, 이 꽃 어디에서 꺾었어? 아니야, 주웠어. 어디에서? 저기에서. 그래? 꽃 많이 핀 데에서 꺾었니?
아버지가 나무랄까 봐 스스로 걱정해서 거짓말을 할는지 모릅니다. 참말, 보들보들 싱그러운 꽃송이가 아무 데나 톡 꺾인 채 있을 수 없어요. 거위벌레가 꽃줄기를 꺾나요, 달팽이가 꽃줄기를 꺾나요, 아니면 다람쥐가 꽃줄기를 꺾나요.
노란 꽃송이와 옅붉은 꽃송이 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노는 큰아이가 머리에 꽃을 꺾고 싶어 합니다. 얘, 멈춰 봐. 아버지가 꽃을 꽂아 줄게. 뒷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풀어 꽃줄기와 머리카락을 함께 누릅니다. 큰아이 뒷머리에는 노랗고 옅붉은 꽃송이가 소담스레 흔들립니다.
.. 세 개에 오천 원 하는 사과를 사는데 / 인심 좋은 아주머니 / 옛다 덤이다 하며 한 개를 봉지에 넣는다 / 같은 자리에서 하나는 제값으로 또 하나는 덤으로 / 한 봉지에 담겨진다 / 성적에 따라 자리가 바뀌는 아이에게 자릴 사수하라는 말은 / 이제 잔인하다 .. (사과를 고르다가)
모든 어른은 어린이였습니다. 모든 어른은 아기였습니다. 모든 어른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른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맺은 꿈이 어우러지면서 고운 목숨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도 어린이였고, 내 아버지가 아기였습니다. 내 할머니도 어린이였고, 내 할아버지도 아기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먼 옛날로 아스라하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났고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누구나 꿈을 키우며 하루를 누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기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어린이뿐이라고들 하는데, 모든 사람은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지구별에서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생각하거나 꿈을 품는 어른이 매우 적어요. 아주 잊거나 잃기까지 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갈 생각을 안 할까요. 왜 하늘나라에 갈 만큼 착하고 참다우며 아름답게 살아가려 하지 않을까요. 왜 하늘사람과 같이 살아갈 뜻을 키우지 못하는 어른이 되고 말까요.
.. 하필 밴드가 넓은 시계냐고 / 어린 애들 같이 / 당신은 고갤 저었지만 난 더 넓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 / 손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혼자 팔딱거리는 기특한 작은 핏줄을 .. (다음엔 뱅글을 살까 해)
아이와 함게 구름다리를 건넙니다. 찻길 위로 드리운 구름다리도 아이와 함께 건너지만,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저 먼 멧봉우리에 걸터앉은 구름을 무지개다리를 타고 건넙니다.
나는 어릴 적에 무지개를 아주 자주 보았고, 소나기를 아주 자주 겪었으며, 뭉게구름을 아주 자주 부대꼈습니다. 내 어린 날에는 으레 소나기하고 달리기하며 놀곤 했습니다.
요즈음 무지개를 못 보고, 소나기를 못 만나며, 뭉게구름을 못 부대낍니다. 아이들한테 무지개도 소나기도 뭉게구름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보지도 겪지도 부대끼지도 못하니, ‘국어사전에 실린 낱말’을 넘어, ‘그림책이나 만화책에 나오는 모습’이 아닌, 삶에서 두 눈과 온몸으로 마주할 이야기로 알려주지 못합니다.
.. 출발을 몇 시간 앞두고 / 아이들은 간신히 다독여 놓았는데 / 정작 시든 꽃잎 같은 얼굴 하나 / 조금만조금만 쪼그리고 누웠더니 / 양말만 벗은 채 잠이 들었다 .. (여행가방)
깊은 밤에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러 별과 달을 봅니다. 아이들 스스로 별과 달을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라야 비로소 별과 달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시골마을에서는 미리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벼리야 보라야, 저기를 봐, 저기 별이 새하얗게 모여 냇물처럼 보이는 데 알아보겠니, 거기를 보고 미리내라고 한단다. 미리내가 무얼 말하는 줄 아니? ‘미리’는 ‘미르’하고 같은 말이야, ‘미르’는 또 ‘미루’랑 같은 말이지. ‘내’는 ‘냇물’이야. ‘시내’도 냇물 가운데 하나란다. 미리·미르·미루란 ‘용’을 가리켜. 다시 말하자면, 용이 노닐 만큼 넓은 하늘냇물이 바로 ‘미리내’인 셈이지.
한여름에 자전거에 아이들 태워 골짜기로 찾아갑니다. 골짜기에 맨발로 첨벙첨벙 놀다가 온몸을 폭 담급니다. 골짝물에서 노니는 작디작은 물고기를 보고는 아이들더러, 자 여기를 보렴, 여기 어린 물고기들 보이지, 조금 앞서는 첨벙첨벙 놀았지만 이 어린 고기들 깜짝 놀랐을 테니, 이제 조용히 이 고기들하고 같이 놀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 사람 발길이 끊어지니 / 물은 맑아지고 / 산은 깊어지는 건가 .. (강가에서)
강송숙 님 시집 《풍경을 건너가다》(문학의전당,2012)를 읽습니다. 조촐한 삶을 조촐한 시로 살가이 그리는 시집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시 한 줄 읽다가 작은아이를 재웁니다. 시집을 덮고 한참 자장노래를 부릅니다. 이불과 베개로 작은아이 배를 토닥토닥 다독입니다. 작은아이는 코 깊이 잠들고서는 옆으로 살짝 뒹굴며 이불자락을 꼬옥 안습니다.
큰아이와 글씨놀이 그림놀이를 하다가 시집 한 줄 읽습니다. 큰아이는 조잘조잘 떠들며 하루 내내 개구지게 놀고 싶습니다. 낮잠은 거뜬하게 거르고 싶어 합니다. 저녁잠도 되도록 미루고 싶습니다. 졸려서 빨갛게 부은 눈덩이로 새 놀잇감을 찾습니다. 너 이토록 안 자고 놀기만 하다가 몸이 아야 할 텐데 말야. 그러나, 이런 말 저런 대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더 놀고 싶으니 졸음도 견디고 잠도 참으면서 콩콩 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 안경을 바꾸러 갔더니 / 노안이 시작된 거 같단다 /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 주인이 웃어주는데 / 웃음소리에 그 몇 년 미리 늙었다 / 안경을 맞춰놓고 미용실에 들어가 / 머리를 짧게 잘랐다 .. (저녁을 준비하며)
쓰고 싶을 때에 쓰는 시입니다. 부르고 싶을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찍고 싶을 적에 찍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싶을 적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누가 시켜서 쓸 수 없는 글이고, 누가 바란대서 찍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에 환하게 빛나면서 태어나는 시입니다. 스스로 가슴속에서 솟구칠 적에 맑게 타오르면서 따순 볕이 되는 글입니다.
강송숙 님은 이녁 살림을 일구면서 “풍경을 건너가는” 이야기를 시집 한 권으로 들려줍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삶입니다. 대단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삶입니다. 스스로 사랑하며 살아온 하루가 모여 이루어지는 글줄입니다.
.. 달랑 두 줄 / 감자밭 고랑에 / 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걸 만져보다가 .. (감자꽃이 피었습니다)
감자꽃은 밭고랑 둘 아닌 밭고랑 하나에서도 피어납니다. 감자꽃은 고작 감자알 하나만 심은 데에서도 피어납니다. 맨드라미도 철쭉도 고작 한 송이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작디작은 꽃이라 하더라도 꽃입니다. 커다랗게 피어날 때에만 꽃이 아닙니다. 꽃밭이 아니어도 꽃이요, 꽃그릇이 아니어도 꽃이에요. 꽃은 어디에서 어떻게 피어도 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도 사랑입니다. 꿈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도 꿈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도 아름다운 살림 일구어 아름다운 빛을 흩뿌립니다.
.. 허물어진 담을 대신해 겨울을 난 / 산수유가 꽃을 피웠다 .. (봄)
새벽나절에 아이들과 부대끼고, 하루 내내 아이들과 복닥이며, 밤새 아이들하고 북적거립니다. 아이들 곯아떨어진 곁에는 고단한 어버이가 나란히 눕습니다. 아이들은 어버이한테 기대어 잠듭니다. 어버이는 아이들한테 기대어 잠듭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삶이 이루어집니다. 삶은 어느새 노래가 됩니다. 노래는 이윽고 꽃이 되고, 꽃은 시나브로 빛이 됩니다. 4346.9.18.물.ㅎㄲㅅㄱ
(최종규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