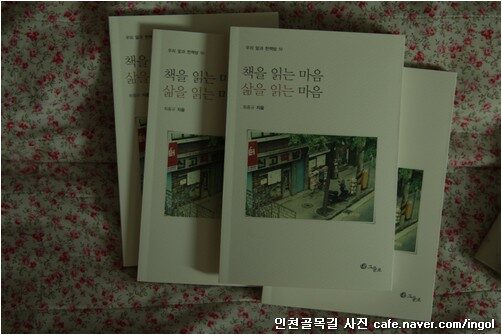
(내 1인잡지 <우리 말과 헌책방>은 여느 책방에 배본을 하지 않는다. 서울 <풀무질>과 인천 <나비날다>에만 보내 준다. 이 잡지를 보려면 정기구독만 해야 한다.)
책을 읽는 마음 삶을 읽는 마음
: 1인잡지 《우리 말과 헌책방》 머리말
책을 읽는 마음이 반드시 곱거나 삶을 읽는 마음이 꼭 착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얄궂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김없이 있고, 삶을 읽는다면서 정작 돈맛을 살피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즈음 시골 터전은 참 곱습니다. 나뭇잎 빛깔이 곱고 하늘 빛깔이 곱습니다. 한국에서는 시골이라 할지라도 싱그러운 바람과 보드라운 햇살이 나날이 옅어지기는 하지만, 한국땅 도시와 견주면 시골 삶자락에서는 숨통을 트면서 사람과 푸나무와 멧짐승이 제 목숨껏 살아남을 수 있구나 싶습니다.
아이를 수레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어 읍내 장마당에 나들이를 하면서 곰곰이 헤아립니다. 자동차가 두 대 지나다닐 수 있는 두찻길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는 멧짐승이 제법 있는데, 자동차가 넉 대 지나다닐 수 있는 네찻길에서는 자동차에 치여 죽는 멧짐승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서는 멧짐승을 버젓이 치고는 아무렇지 않게 당신 가던 길을 갑니다. 자동차를 타는 이들은 사마귀나 메뚜기나 개구리나 잠자리나 나비를 치거나 밟을 때에는 ‘목숨을 덧없이 죽였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으레 대통령이나 장관쯤 되어야 권력을 움켜쥐었다고 여기는데, 시골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을 차근차근 가다듬습니다. 대통령도 아니요 장관 또한 아니며 면사무소 일꾼조차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차를 타고 싱싱 몰 때에는 누구나 권력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자동차를 몰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몰 때에 가져야 한다는 면허증서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안 타고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몰 마음이 없습니다. 두 다리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골버스를 탑니다. 때때로 택시를 얻어 탑니다.
두 다리로 넉넉합니다. 자전거로 즐겁습니다. 시골버스는 재미납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 일요일 음성읍 장날에 네 식구 함께 마실을 다녀옵니다. 아이 엄마 배속에서 둘째가 무럭무럭 크니까 네 식구 마실입니다. 버스삯은 어른 두 사람 몫 2300원을 냅니다. 장마당으로 가는 길에는 모두 일곱 사람이 타고, 장마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가 꽉 찹니다. 이웃마을 어르신들은 아침 버스를 타고 장마당 마실을 나오셨군요. 읍내하고 가까운 데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그만 내려야 할 곳에서 못 내립니다. 버스 기사가 깜빡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들이 “한 바퀴 돌아와서 내리면 되겠네!” 하면서 모처럼 이웃마을 구경을 하라고 웃습니다. 이웃마을로 마실을 다니기는 할 테지만, 시골버스를 타고 끝에서 끝까지 오갈 일은 드물겠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나 보금자리는 그닥 안 넓은지 모릅니다. 좁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지 모르고, 좁은 곳에서 조그맣고 조용하게 살아가지만 옹기종기 오순도순 즐거운지 모릅니다. 괜히 피 튀기며 다툴 까닭 없고, 돈이며 이름이며 힘이며 더 얻자고 아웅다웅 할 까닭 없습니다.
고운 사람 하나와 착하게 사귀며 참다이 살아가는 마음이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책 하나 더 읽어도 괜찮고, 책 하나 어여삐 사랑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책과 삶을 알뜰히 아낄 줄 아는 마음으로 어깨동무를 하면 좋겠습니다.
2010년 11월 7일 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