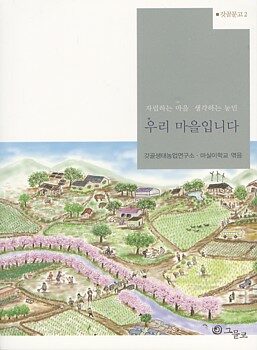'마이리뷰'에 올려야 할 글이지만, 책방에는 안 들어간 책을 이야기해야 하기에 이곳에 적바림합니다.
작은 손으로 뿌리는 작은 씨앗
[책읽기 삶읽기 28] 갓골생태농업연구소·마실이학교, 《우리 마을입니다》
조그맣게 나와서 조그맣게 읽히는 책 《우리 마을입니다》를 읽습니다. 이 책은 여느 책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책이라 출판사 누리집(gmulko.cafe24.com)에 따로 이야기를 해서 계좌로 돈을 보내고 나서야 받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에 주문 글을 띄우면 책 하나 그날 바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판에 느릿느릿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책값은 고작 5천 원인 작은 책을 받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립니다.
.. 출판사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느티나무는 해마다 봄이 되면 한결같이 녹색의 쉼터를 만들어 주었고, 마당에 심어 놓은 앉은뱅이밀은 자라지 않아 포기하려고 하는 어느 날이면 그 자리에 낮게 피어났습니다. 이름 없이 가난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농부님과의 만남은 출판사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연과 농부님들은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출판사도 그 규모에 맞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 (119쪽/그물코 출판사 소개)
《우리 마을입니다》는 대단한 이야기를 담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작은 마을에 깃든 사람과 삶터 이야기를 담습니다. 《우리 마을입니다》는 대단한 이야기를 담을 까닭이 없습니다. 한 마을 사람과 삶터 이야기를 담으면 넉넉하니까요. 잘나지 않고 못나지 않은 사람과 삶터 이야기를 수수하게 담으면 되니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을입니다》 같은 이야기책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작은 마을에서만 나올 만한 책이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평동 자그마한 삶자락 한켠에서도 나올 만하고, 제주시 삼도1동 조그마한 삶마당 한구석에서도 나올 만합니다. 대단히 이름난 사람이라든지 대단히 알려진 유적지라든지 대단히 멋스러운 관광지 이야기를 담아야 할 《우리 마을입니다》가 아닙니다. 저마다 오순도순 어울리거나 복닥이거나 부대끼는 조용한 이야기를 담으면 될 《우리 마을입니다》입니다.
이 작은 책 《우리 마을입니다》를 일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책에 실을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남달리 빼어난 글쟁이가 되어야 하고 사진쟁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는커녕 초등학교 문턱조차 못 밟은 사람 또한 얼마든지 내 삶과 내 이웃과 내 동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보급형 사진기조차 아닌 손전화에 딸린 사진기로 얼마든지 내 모습과 내 이웃 모습과 내 삶터 모습과 내 마을 모습을 살뜰히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눌 벗입니다. 서로서로 아옹다옹하거나 툭탁툭탁하는 자그마한 삶을 알뜰살뜰 이야기로 나눌 벗님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라든지, 연속극 이야기라든지, 전쟁 이야기라든지, 주식 이야기라든지, 아파트 이야기라든지를 나눌 까닭은 없습니다. 배추씨 심은 이야기를 나누고, 꽃씨 가꾸는 이야기를 나누며, 구름이 흐르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즐겁습니다. 바람 흐르는 소리를 듣고, 물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 놀면서 재잘거리는 소리에 웃을 만합니다.
어디 멀리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떠나 보아야 내 ‘삶 발자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이웃나라를 다녀 보았다든지 유럽 나라나 중남미 나라를 밟았다고 해서 앎이나 슬기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고작 이곳 이 땅에서 맴돌며 살았달지라도, 아니 부엌데기 소리를 들으며 집 안팎을 벗어나지 않으며 예순 해 일흔 해를 살았달지라도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먼 마실을 다니지 못하며 집에서만 고요히 살아온 사람들 삶에서 앎이나 슬기가 샘솟는지 모릅니다. 제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거나 맛이 좋다고 하는 가공식품일지라도, 투박한 농사꾼 손길로 땅에 뿌리고 보듬어 자란 곡식이나 푸성귀나 열매를 거두어들여야 빚을 수 있거든요.
내 뿌리를 생각하고, 내 줄기를 헤아리며, 내 잎싹을 돌아봅니다. 내 꽃봉우리는 누구한테 예쁘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내 온힘을 짜내어 맺은 열매는 누가 맛보도록 하면 좋으려나요. 가을녘 동네 감나무를 살피면, 까치밥 하나 없이 모조리 딴 집이 있으나, 까치밥 몇 알 남긴 집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까치 때문에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제는 까치밥 따위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까치를 총으로 쏘아 잡아죽여야 하는 판이란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무슨 까치밥을 남기겠어요. 그러나 까치밥은 다람쥐밥이고 박새밥이며 꾀꼬리밥입니다. 까치만 먹는 까치밥이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곰도 여우도 오소리도 너구리도 먹었을 까치밥은 아니었을까 곱씹어 봅니다. 아마 생쥐나 멧쥐도 까치밥을 나누어 먹었을는지 모르지요. 그나저나 도시에는 감나무이든 배나무이든 능금나무이든 구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까치밥을 나눌 나무조차 없어요. 아니, 아파트숲 이룬 큰 마을에는 감나무가 없지만, 작디작아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새로 올려세워야 한다는 조그마한 골목동네 곳곳에 마흔 해 쉰 해 예순 해를 뿌리박은 집들 마당에는 으레 감나무가 있고, 이 감나무에는 까치밥이 대롱대롱 달리곤 해요.
텃밭에서 아이랑 무를 뽑으며 생각합니다. 아이는 제 아빠를 따라 텃밭에서 처음으로 ‘열매 거두기’를 합니다. 지난여름에 처음으로 텃밭에서 호미질을 한 아이요, 올가을에 처음으로 텃밭에서 무뽑기를 한 아이입니다. 이제 이듬해에는 아이로서는 처음으로 거름을 내어 밭에 뿌릴 테지요. 이듬해 봄에는 올여름에 아빠 엄마랑 함께 했듯이 호미나 괭이를 조그마한 손에 쥐고는 함께 밭을 갈아 새 고랑을 내고 새 이랑을 내어 아이 손톱보다 더 조그마한 씨앗 하나 예쁘게 심겠지요. 아이 손가락으로 보드라운 흙에 뽕뽕 구멍을 내어 아이 손으로 요 구멍에 둘셋씩 씨앗을 묻어 따순 흙한테 안기도록 하겠지요. (4343.11.26.쇠.ㅎㄲㅅㄱ)
― 우리 마을입니다 (갓골생태농업연구소·마실이학교 엮음,그물코 펴냄,2001.9.30./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