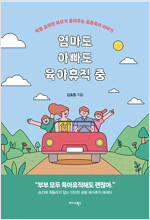숲노래 책읽기 / 숲노래 책빛
오늘이라는 날
큰아이랑 저잣마실을 나왔다. 혼자 들 짐을 둘이 든다. 예전에는 아이들 살림까지 모두 혼자 들었고, 이런 몸에 아이를 안거나 업었다. 때로는 두 아이를 두 어깨에 나란히 안는다든지, 한 아이는 업고 다른 아이는 앞으로 안으면서 다녔다. 아이들은 열두어 살 무렵부터 저희 짐을 조금씩 혼자 끝까지 다 들었고, 열너덧 살을 지나자 저희 짐에다가 다른 짐을 하나둘 맡는다. 요즈음은 큰아이가 저잣짐을 조금만 나눠들어도 홀가분하다. 나는 무거울 일이 없고, 힘들 일마저 없다. 슬금슬금 느긋느긋 걷는다.
언제나 하나이다. 즐겁게 지켜보고 기쁘게 땀흘리면서 새롭게 사랑을 그리면서 걷는다. 등짐도 앞짐도 어깨짐도 손짐도 이 아이들하고 곁님이랑 누릴 오늘빛이라고 여긴다. 등으로는 업고 가슴으로는 안는 두 아이 무게란, 두 아이가 어버이한테 베푸는 숨빛이라고 느낀다. 어릴적을 떠올리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고 시켜서 미안해.” 하셨고,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머니 혼자 들고서 집까지 오신다면 저야말로 부끄러워요.” 하고 여쭈었다. 어머니하고 다니는 저잣마실은 오래오래 걷고 묵직묵직 나르는 머슴길인데, 등판이 땀으로 홀랑 젖을 만큼 힘을 쏟아야 했다. 그러나 동무하고 뛰놀아도 땀은 똑같이 나는걸.
고흥군은 오늘부터 유자잔치를 하나 보다. 그곳은 쇠(자동차)를 몰아야 갈 수 있지. 두멧시골에서는 그런 곳에 갈 일이나 갈 까닭이 없다. 서울서 여러 노래꾼을 목돈 쥐어주고서 고흥까기 모셔오는 먹자판에 노닥판인데, 이런 데는 ‘잔치’가 아닌 ‘돈수렁’ 같다. 지지난해에는 서울에서 노래꾼 하나를 부를 적에 ‘10분에 500만 원’부터 여쭈어야 했다는데, 올해는 얼마쯤 쏟아부으려나? 왁자지껄 큰잔치에 벼슬꾼이 우르르 줄서서 찰칵찰칵 찍어서 남기는 자리는 이제 끝낼 노릇이다. 이 시골자락 어린이랑 푸름이가 한복판에 서서 즐기고 나누는 어울림판으로 거듭날 노릇이라고 본다.
오늘이라는 날에도 거닐며 읽고 쓴다. 두런두런 얘기한다. 집으로 돌아갈 시골버스를 기다리며 또 읽고 쓴다. 해가 기운다. 바람소리가 깊다. 멧노랑(산국) 늦가을빛을 헤아린다. 2025.11.6.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