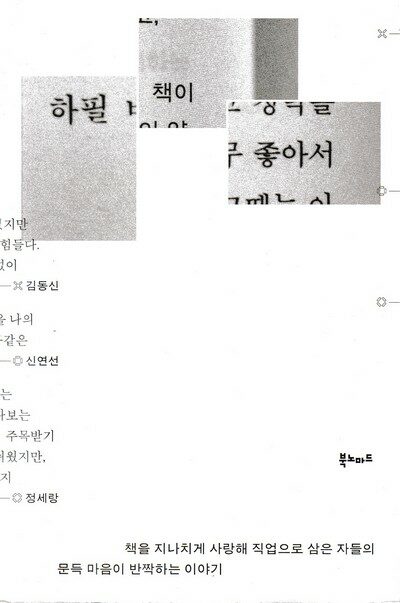-

-
하필 책이 좋아서 - 책을 지나치게 사랑해 직업으로 삼은 자들의 문득 마음이 반짝하는 이야기
김동신.신연선.정세랑 지음 / 북노마드 / 2024년 1월
평점 :



다듬읽기 / 숲노래 글손질 2024.8.4.
다듬읽기 220
《하필 책이 좋아서》
정세랑·김동신·신연선
북노마드
2024.1.11.
《하필 책이 좋아서》(정세랑·김동신·신연선, 북노마드, 2024)를 어쩌다 책을 즐겨서 집었습니다. 마침 책을 반기니 펼쳤습니다. 책마을 속내를 세 눈망울로 들려주려는 얼거리는 안 나쁘지만, 뭔가 건드려 보려다가 어영부영 끝을 맺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다시 바라보고, 책마을에 발을 담근 일꾼으로서 새삼스레 헤아려 봅니다. 글도 책도 책마을도 어깻힘을 뺄 적에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책잔치’라기보다 ‘책팔이’ 언저리에서 헤맵니다. 이야기를 짓거나 책을 펴는 누구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내기(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24년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맡는다고 하는데, 엊그제쯤 겨우 ‘라퓨타’라는 이름을 내걸며 ‘칸팔이(부스 장사)’를 서울하고 똑같이 하는 듯할 뿐, 막상 어린이책과 부산책마을이라는 길은 도무지 안 쳐다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잔치’ 아닌 ‘팔이’에 파묻히면서 ‘유명작가 사인회’라는 수렁에 갇힐 셈일까요? 왜 부산에서 ‘일본 흉내’를 내야 하나요? 어린이 앞에서 안 창피한가요? 땀흘려 일군 책을 ‘잘 팔’거나 ‘많이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만, 책은 모름지기 ‘글쓴이가 오늘까지 새롭게 배우고 익힌 살림을 누구한테나 스스럼없이 나누고 베풀고 펴면서 어깨동무하는 길을 여는 실마리’ 이지 않나요? 책수다에 앞서 ‘책이란 뭘까?’에다가 ‘책을 왜 즐길까?’랑 ‘책을 누구랑 어디에서 읽을까?’부터 짚고 살필 노릇입니다.
ㅅㄴㄹ
그중에 한 권의 추천사를 쓰는 일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여겼다
→ 이 가운데 하나에 기림글을 쓰면 그리 안 힘들다고 여겼다
→ 여러 책 가운데 하나에 꽃글을 쓰면 썩 안 버겁다고 여겼다
11쪽
약간의 추진력이라도 된다면 좋겠다고
→ 조금이라도 밀어주기를 빈다고
→ 살짝살짝 끌어가기를 바란다고
11쪽
영향 없음의 가뿐함 속에, 번거로운 애정을 쏟아붓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 바람이 없어 가뿐하고, 번거롭게 마음을 쏟아붓는 일일지도 모른다
→ 물결이 없어 가뿐하고, 번거롭게 마음을 쏟아붓는 일일지도 모른다
12쪽
증정본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저자가 교류하는 다른 저자들에게 보내는 증정본과
→ 드림책을 이야기하려면 글님이 만나는 다른 글님한테 보내는 책과
→ 덤책을 이야기하려면 글쓴이가 사귀는 다른 글쓴이한테 보내는 책과
16쪽
굿즈에 대해서는 그보다 생각이 무거워진다
→ 꽃덤을 생각하면 이보다 무겁다
→ 덤을 생각하면 이보다 무겁다
22쪽
실판매 부수 파악을 위해 분기마다 며칠씩 시간을 들여 정리하는 일이 필요했다고 한다
→ 팔린 만큼을 알려면 철마다 며칠씩 품을 들여 추슬러야 한단다
→ 얼마나 팔렸는지 알려고 석달마다 며칠씩 땀을 들여 솎아야 한단다
30쪽
더 강렬한 인상은 안검하수가 남기고 말았구나
→ 거적눈이 더 짙게 남고 말았구나
→ 처진 눈이 더 세게 남고 말았구나
38쪽
2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적어두셔서 기함을 했었다
→ 2000만 원을 받는다고 적어두셔서 놀랐다
→ 2000만 원을 받는다고 적어두셔서 넋이 나갔다
56쪽
초봉이 낮아도 인상률이 높은 편이라 그나마 상쇄가 되었는데
→ 첫삯이 낮아도 많이 오르니 그나마 돌릴 수 있는데
→ 첫돈이 낮아도 껑충 오르니 그나마 비길 수 있는데
56쪽
사수가 단계별로 경험을 전수할 수 없다면 명확한 매뉴얼이라도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 앞분이 차근차근 물려줄 수 없다면 뚜렷이 길풀이라도 추슬러야 하는데
→ 길잡이가 하나씩 알려줄 수 없다면 따로 길잡이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57쪽
물가가 오르는데 원고료는 오르지 않아
→ 금이 오르는데 글삯은 오르지 않아
→ 돈값이 오르는데 글값은 오르지 않아
66쪽
만약 최저원고료조차 주고 있지 못하다면, 변명의 여지없이 노동력 착취다
→ 밑글삯조차 주지 못한다면, 그냥 뜯어먹기다
→ 밑삯조차 주지 못한다면, 그저 벗겨먹기다
67쪽
한 분야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쌓이면 재능이나 감식안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든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법이다
→ 한길을 들여다보는 나날을 쌓으면 재주나 봄눈을 떠나 누구든 예전에는 못 보던 곳을 본다
→ 한우물을 들여다보는 날을 쌓으면 재주나 눈멋을 떠나 누구든 그동안 못 보던 데를 본다
95쪽
국가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갑론을박을 피하기 어렵다
→ 나라쯤으로 크면 말씨름을 안 하기 어렵다
→ 나라만큼 크면 밀당질을 비껴가기 어렵다
151쪽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는 수상작의 편향성은 암묵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꽃받이가 기울어, 말없이 눈금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하게 꽃보람이 치우쳐, 조용히 길잡이로 둘 수밖에 없다
164쪽
특정한 종류의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출판계와 북디자인계에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 몇몇 꾸밈새를 좋아한다는 뜻을 책마을과 꾸밈이한테 알리는 셈이다
→ 반기는 멋빛이 따로 있다고 책마을과 꾸밈이한테 띄우는 셈이다
164쪽
심사 현장은 단일대오의 회합이 아닐 것이며 당일의 분위기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으리라 짐작한다
→ 가리는 곳은 똘똘 뭉치지 않을 테며 그날그날 문득 가리리라고 본다
→ 살피는 곳은 하나되기가 아닐 테며 그날에 따라 살피리라고 여긴다
165쪽
나는 종종 을(乙)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 나는 가끔 뒷줄이어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힌다
→ 나는 곧잘 버금이어야 한다고 여긴다
184쪽
그것이 신입사원의 자세라고 여겼던 것이다
→ 꼬꼬마는 이래야 한다고 여겼다
→ 새내기는 이래야 한다고 여겼다
184쪽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