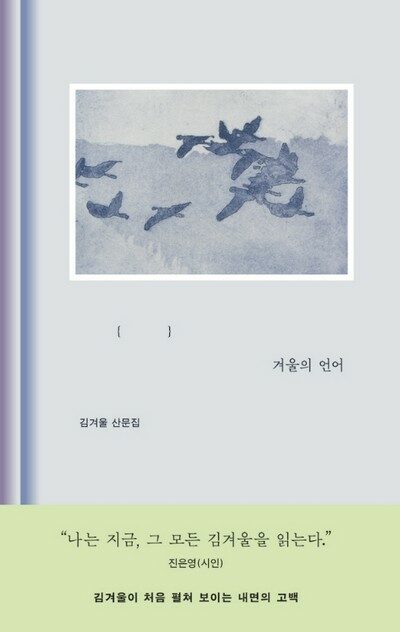-

-
겨울의 언어
김겨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3년 11월
평점 :



까칠읽기 . 숲노래 책읽기 / 인문책시렁 2024.6.20.
까칠읽기 25
《겨울의 언어》
김겨울
웅진지식하우스
2023.11.10.
《겨울의 언어》(김겨울, 웅진지식하우스, 2023)를 어느 〈알라딘 중고샵〉에 갔다가 만났다. 한켠에 수북히 쌓였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 어떻게 새책집 아닌 헌책집(중고샵) 한켠에 무더기로 쌓일 수 있는지 아리송한데, 이 책 곁에는 또다른 날개책(베스트셀러)이 나란히 수북하다. 얼핏 보아도,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읽어 보아도, 틀림없이 새책 맞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서 누가 읽거나 사들이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어느 길을 거쳐서 날개책이 새것으로 〈알라딘 중고샵〉 한켠에 잔뜩 들어와서 쌓일 수 있을까?
쇳덩이(자가용) 없이 걸어서 여러 고장을 마실하는 뚜벅이한테는 큰고장에 곧잘 연 〈알라딘 중고샵〉이 쉼터이다. 이곳에 들러서 손전화에 밥을 먹이고, 무릎셈틀을 켜서 마감글을 띄우기도 하고, 갓 나온 책이건 여러 해 묵은 책이건 둘러보다가 장만하기도 하고, 그냥 서서읽기를 하다가 얌전히 제자리에 꽂기도 한다.
이미 손을 거친 책이기에 헌책이요 손길책일 텐데, 아직 손을 안 거친 말끔한 책이라면 알림책(보도자료)일까? 그러나 알림책도 아니다. 다만, 궁금하게 여기지는 말자. 그저 고맙게 ‘따끈책’을 느긋이 앉아서 읽자.
한참 읽고서 덮는다. 앉아서 다 읽었으니 굳이 안 사기로 한다. 글쓴이는 허우적길을 걸었다고 밝히는 듯싶지만, 사람마다 허우적질이 다 다르기는 할 테지만, 애써 허우적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구나 싶은, 그냥그냥 보낸 하루에 여러모로 꾸밈말을 보태었다고 느낀다.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는 글이 아닌, 말 그대로 허우적허우적 덤범덤벙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이러다가 다시 일어선 하루를 수수하게 털어놓는 글을 썼다면, 기꺼이 온돈을 치르고 샀으리라.
요새는 시골에서조차 마늘밭이나 취밭에서 일하는 이웃일꾼(이주노동자)이 얼굴을 곱게 물들이더라. 마늘밭이나 취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일순이(여성노동자)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 아니, 난 아직 못 봤다. 2011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사는 동안, 젊은 시골순이를 여태 못 봤다. 거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젊은순이인데, 하나같이 곱게 꽃가루를 바르고서, 챙이 긴 갓에 수건을 잔뜩 두르고서 일한다.
나는 쇳덩이를 안 몰기에, 늘 걷거나 두바퀴(자전거)를 달리거나, 시골버스를 탄다. 시골버스를 타는 젊은돌이도 젊은순이도 아예 없다. 서울이나 큰고장이라면 좀 다르겠지. 큰고장에서는 쇳덩이를 안 몰더라도 2∼5분마다 버스나 전철이 다니잖은가. 시골에서는 으레 2∼3시간을 기다리고서 버스를 겨우 탄다. 그러니까 2∼3시간을 기다리느니 그냥 걸어가는 쪽이 한결 빠르다고 여길 수 있다.
허우적대는 삶이란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적 허둥지둥 헤매는 삶을 거치면서 스스로 새롭게 배우는 하루일 뿐이다. 멋스러이 글을 꾸미려고 할수록 오히려 글멋이 없다. 맛깔나게 글을 만들려고 할수록 외려 글맛이 없다. 겨울빛이 없어 보이는 겨울글은 밍밍했다.
ㅅㄴㄹ
겨울의 언어는 겨울을 부르는 언어일까
→ 겨울말은 겨울을 찾는 말일까
→ 겨울말은 겨울을 끌어당길까
6
이전까지의 책에서 나는 매번 나의 삶과 글을 도구로 삼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 이제까지 낸 책으로 늘 내 삶과 글을 엮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했다
7
그것이 책을 쓰는 저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여겼다
→ 책을 쓸 적에는 이만큼 해야 한다고 보았다
7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책을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기를 바랐고
→ 뚜렷하지는 않아도 한 가지 이야기가 책에 흐르기를 바랐고
→ 환하지는 않아도 한 가지 줄거리를 책에 담기를 바랐고
7
눈 위로 흐른 얼음물이
→ 눈에 흐른 얼음물이
13
그럼에도 겨울을 좋아하는 건 어쩌면 모순된 성정이다
→ 그런데도 겨울을 반기면 엇갈린 듯하다
→ 그런데도 겨울을 즐기면 어긋난 듯하다
15
겨울과 함께 산다는 건 그런 것이다
→ 겨울과 함께살기란 이렇다
→ 겨울하고는 이렇게 함께산다
16
과년한 김겨울은 취업도 결혼도 거부한 채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허우적거리게 된다
→ 무르익은 김겨울은 일도 짝짓기도 등진 채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허우적거린다
→ 나이가 찬 김겨울은 일도 짝맺기도 안 하고 혼자 뭘 해보겠다고 허우적거린다
19
허우적의 역사는 창피할 정도로 누적되었다
→ 허우적댄 나날은 창피할 만큼 쌓였다
→ 허우적거린 날은 창피하도록 늘었다
20
이따금씩 시집을 선물 받아 읽고
→ 이따금 노래책을 받아 읽고
27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우리말꽃》,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