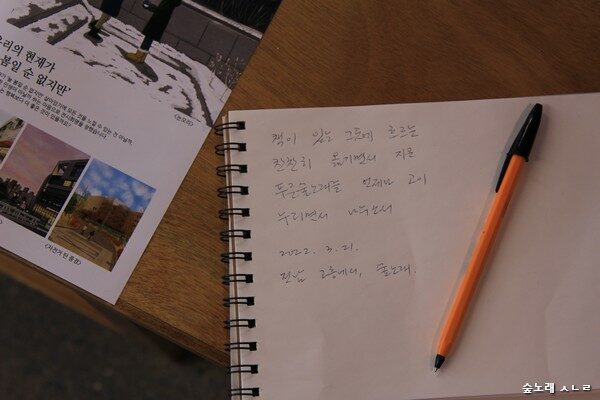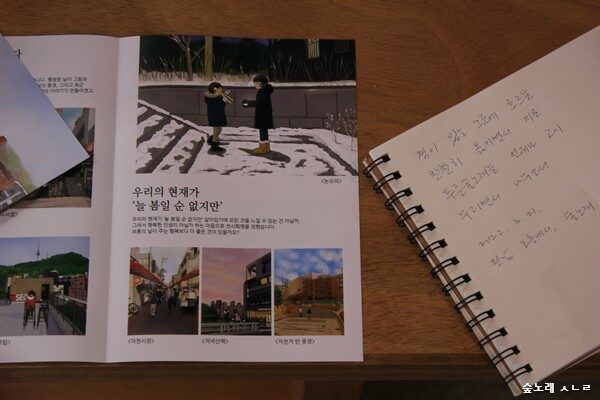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 마을책집 이야기
짊어지는 (2022.3.21.)
― 서울 〈하우스서울〉
날마다 여러 낱말을 짓습니다. 하루라도 새말을 안 짓는 날이 없습니다. 말꽃지기(사전편찬자)가 새로 여미는 낱말이란 씨앗입니다. 말꽃지기부터 이 삶을 푸르게 돌보는 밑거름으로 삼으려는 마음이요, 이웃이며 동무 누구나 스스로 생각날개를 펴면서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그리는 꿈입니다.
한자말 ‘외국’을 거의 모든 곳에서 ‘이웃’으로 바꾸면 무척 어울립니다. 어느 날 문득 느꼈어요. ‘이웃말(외국어)’, ‘이웃마실(외국여행)’, ‘이웃·이웃사람(외국인), ‘이웃일꾼(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처럼 말예요.
서울 송파에 있는 〈하우스서울〉을 찾아가면서 이름을 곱씹습니다. 지난날 글바치는 중국말로 이름을 지었고, 일본이 총칼로 쳐들어온 뒤로는 일본 한자말로 이름을 지었고, 사슬에서 풀려나고서는 영어로 이름을 짓는 물결입니다. 우리말로 이름을 짓는 눈빛이나 손빛이 조금씩 씨앗을 뿌리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우리는 왜 우리 넋을 우리 손길로 다스리면서 우리 말글로 여미는 살림하고 등질까요? 마음을 알고 읽어서 그린다면 생각이 자라나겠지요. 마음을 안 알고 안 읽으며 그릴 적에는 아무래도 생각이 안 자라게 마련입니다.
모두 아름다이 빛나는 글꽃으로 깃들 적에 숨결도 살아나지 싶습니다. 어린이하고 어깨동무하는 말을 헤아리기에 어른스럽습니다. 시골하고 서울이 손을 맞잡는 길을 말씨앗으로 풀어낼 줄 알기에 어른답습니다.
천천히 깊고 넓게 푸른빛을 이웃나라에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름다운 이웃나라 그림책은 하나같이 이웃나라 숲을 푸르게 담았다고 느껴요. 이제는 우리가 잊거나 잃기도 했으나 아직 고이 건사한 우리 들숲바다 이야기를 이웃나라한테 푸르게 들려줄 노릇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가 머리를 기르든 치든 대수롭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하고픈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가 머리카락을 묶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묶으라고 하면서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 보고 저렇게 묶어 보다가 나중에 알아서 잘 묶어요. 둘레에서 아이 머리카락이 왜 저러느냐 하고 핀잔을 하든 뭐라 하든 말든, 늘 아이가 하고픈 대로 다른 소리를 물리치며 아이를 지키면 될 뿐이다. 아이 곁에 서는 어버이는 아이를 보면 됩니다. 다른 샛소리를 들을 까닭이 없어요.
마음이 들려주는 소리를 담는 말이고, 마음소리인 말을 옮기는 글입니다. 굳이 손을 놀려 글을 적는 사이에 생각이 새록새록 자라서 꿈으로 뻗습니다. 말글 한 자락이란, 어제를 오늘로 이어 모레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예요.
ㅅㄴㄹ
《나는 왜 시골을 돌아다녔는가?》(김동영 글, 도시총각, 2020.10.28.)
《늘 봄일 순 없지만》(권냥이 글·그림, 권냥이, 2022.3.3.)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밑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