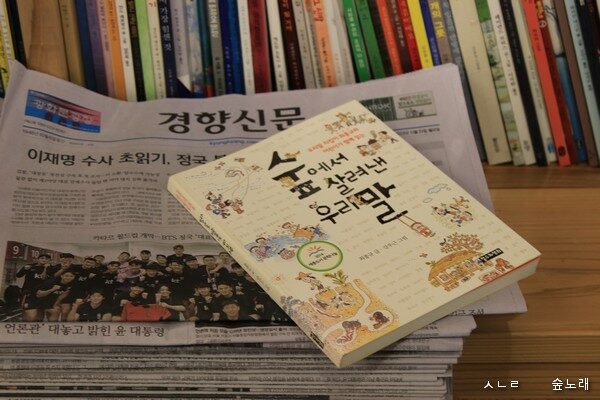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 책집마실
그리지 않으면 없다 (2022.11.21.)
― 서울 〈날일달월〉
어떻게 저런 몹쓸놈이 다 있느냐고 나무라는 목소리를 들을 적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저런 놈’도 ‘몹쓸놈’도 우리가 마음에 먼저 그렸을 뿐이에요.” 하고. ‘전쟁을 없애’야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하루를 그려서 손수 즐겁게 지을 적에 비로소 평화를 누립니다. ‘전쟁 반대 = 평화’라는 허울을 퍼뜨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참빛을 안 깨닫는 채 갈라치기를 하면서 싸우기를 바라더군요.
누구나 무엇이든 다 보고 다 알고 다 빛날 수 있습니다. 배움터(학교)를 그만 다니면 누구나 깨닫습니다. 책을 그만 읽으면 누구나 눈을 뜹니다. 손전화를 끄면 누구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움터·책·손전화’를 내려놓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깨닫고 나면, 배움터를 다녀도 되고, 책을 펴도 되고, 손전화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안 깨달은 어리석은 몸으로 온갖 것을 집어넣으면 스스로 헤매다가 휘둘려요.
칼은 ‘부엌칼’도 되지만 ‘총칼’도 됩니다. 살림짓기를 어버이한테서 슬기롭게 물려받아 사랑을 짓는 아이들은 부엌칼을 다루는 살림꾼으로 섭니다. 그저 뺑뺑이를 돌며 배움수렁(입시지옥) 쳇바퀴를 헤맨 아이들은 어느새 싸움꾼으로 크면서 내내 겨루고 다퉈요. 배움터(학교)에 붙으려고 겨루고, 일터(회사)에 붙으려고 다투고, 더 값나가는 잿집(아파트)을 거머쥐려고 싸워요.
서울 한복판은 시끄럽습니다. 한복판에서 비켜서서 한켠으로 나오면 고즈넉합니다. 같은 서울이어도 어느 하늘을 이느냐에 따라 삶·살림이 확 달라서, 숲·사랑을 이 서울에서도 누리고 나눌 만합니다. 〈날일달월〉로 걸어가면서 “여기는 다른 서울이로구나” 하고 느낍니다.
저는 깡똥바지입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민소매 아닌 깡똥소매를 걸쳤습니다. 찬바람이 매섭지 않느냐고들 하지만, 저는 늘 해바람별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야 할 적에는 갑갑합니다. 마음에 있는 노래를 부를 적에는 홀가분합니다. 빵빵대는 쇳소리에 갇혀야 할 적에는 슬픕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에 풀벌레가 베푸는 소리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노래가 피어납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요, 어버이는 그저 ‘어버이’입니다. 우리는 ‘방송·연예인’도 ‘화가·예술가’도 ‘유명인’도 아닙니다. 서로 사람입니다. 서로 삶입니다. 함께 살림이자 사랑이고 숲입니다. 마을책집이 밥 한 그릇에 책 한 자락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노래처럼 이 고장 한켠을 그윽히 밝히리라 생각합니다.
ㅅㄴㄹ
《민족혁명가 김원봉》(이원규, 한길사, 2019.11.5.)
《안철수, 경영의 원칙》(안철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11.28.첫/2011.12.6.3벌)
《훈데르트바서의 집》(제랄딘 엘슈너 글·루시 반드벨드 그림/서희준 옮김, 계수나무, 2020.10.30.)
《빌뱅이 언덕》(권정생, 창비, 2012.5.25.)
《비판정본 안응칠 역사》(안중근, 독도도서관친구들, 2020.12.30.)
《비판정본 동양평화론》(안중근, 독도도서관친구들, 2019.6.15.)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립니다.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밑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