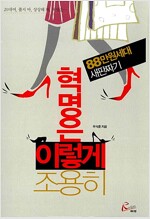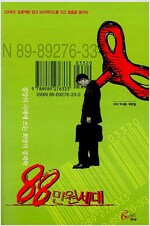숲노래 삶읽기 2023.5.30.
수다꽃, 내멋대로 43 88만원세대
어릴 적에 골목이나 너른터(운동장)에서 동무들하고 뛰놀다가 갑자기 우르르 서로 무리를 지으며 부른다. “종규야! 이리 와!” 이쪽에서 무리지은 아이들도 동무이고, 저쪽에서 무리지은 아이들도 동무이다. 둘로 나눈 무리는 한 사람을 더 늘리려고 용을 쓴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땀을 삐질삐질 흘린다. 드디어 한마디를 터뜨린다. “난 어디에도 못 들어가겠어! 둘 다 동무들이잖아!” ‘그냥 놀 뿐’이라지만, 줄다리기나 오징어나 콩주머니를 하며 끝없이 짝을 바꾸어서 어울리는 놀이가 아닌, 처음부터 무리를 갈라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로 다툰다면, 어디에도 안 끼었다. 뒤로 홱 돌아서서 달아난다. 쌩 하고 달아나는데, 동무들은 ‘달리기’를 하자는 줄 여겨 어느새 무리가 풀어지고 달음박질놀이로 바뀐다. 우리는 왜 ‘어느 쪽’에 서야 할까? 어느 해에 태어났기에 ‘태어난해’라는 또래로 묶여야 할까? 어느 해에 무슨 배움터(학교)를 들어갔기에 ‘학번’이라는 금을 갈라야 할까?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아갈 뿐, ‘나이·주민등록번호·학번·군번’으로 갈라야 할 까닭이 없다.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쪽이든 똑같다. 저마다 옳다고 외치지만 ‘갈라침·금긋기(분단·분열·분리)’일 뿐이고, 이 무리짓기부터 ‘따돌림(차별)’이 싹튼다. 2007년이던가,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나오고, 둘레에서 이 책을 마구 추켜세우던 그즈음, 나는 어쩐지 코웃음이 나왔다. “무슨 얼어죽을 88만 원?” 그무렵 내 한달벌이는 ‘88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30만 원’도 아니었다. 때로는 ‘10만 원’으로 볼볼 기었다. ‘그들(지식인)’이 금긋는 ‘88만 원 세대’라는 말은 고약했다. 왜 이런 ‘무리짓기(세대갈등)’를 일삼아야 하는가? 일부러 틀(프레임)을 만들어서, 왜 자꾸 갈라치기(이간질)를 하는가? 이 틀(프레임)로 이 나라에 새롭게 불길(분노)을 일으키고, ‘분노 프레임’으로 강단·강의를 차지하면서 ‘새길’이 아닌 ‘불길(분노)’로 금긋기(이분법에 따른 사회분열)로 치닫겠구나 싶었다. 《88만 원 세대》가 ‘나쁜책’일 수는 없되, 이런 책을 쓰고 이야기를 펴는 이들은 ‘통장잔고 0원’을 겪어 본 적이 없을 텐데 싶더라. ‘가난·구조적 차별·학벌’을 따지는(비판하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분들 가운데 고졸·국졸인 사람이 있을까? 또는 서울·수도권 아닌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가난하지도 않고, 가난을 겪지도 않고, 빈곤층·차상위계층도 아닌 그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일도 없겠지. 예전에 최영미 시인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로 딱 한 해 된 적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저 웃음이 났다. 여태 가난해 본 적이 없다가 꼭 한 해 돈벌이가 줄었대서 징징거리면,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차상위·근로장려금 수령자는 어찌해야 할까. 달콤발림으로 꼬드기면서 ‘시키는 대로 나팔수가 되면 다달이 통장잔고가 늘어난다’고 다가오는 무리가 늘 있다. 온나라 어느 고장에서나 그 고장 기득권(시장·군수)을 봐주는(옹호하는) 글을 써주면 짭짤한 벌이와 자리(교수 또는 고문 또는 원장)를 준다. ‘나눔’은 아름길이 될 수 있지만 ‘가름·쪼갬’은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불길을 일으켜서 그저 싸움(전쟁)으로 치닫는 굴레이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지피지 않고서 불길(분노)만 지필 적에는, 모든 정치·문단·언론·교육 권력자들이 뒤에서 팔짱끼며 낄낄댄다. 그들은 우리가 ‘아름다운 책’이 아닌 ‘분노를 지피는 책’을 더 많이 읽어서, 스스로 ‘생각을 멈추기’를 바라더라.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산다”는 말씀이 있듯, 참말로 우리는 ‘사람’일 노릇이다. 우리말 ‘사람·살다·살리다·사랑·사이·새(멧새)·생각’은 말밑이 같다. ‘살(살갗)’도 같은 말밑이다. ‘살빛(살색)’은 나쁜말이 아닌, “사람 겉몸을 감싼 얇으면서 빛나는 옷”인 ‘살’을 드러내는 빛깔인데, ‘살빛’이란 낱말을 따돌림말(차별어)로 여겨 ‘살구빛’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논리)가 판치는 대목도, 우리가 스스로 사람됨과 사람빛을 잊어버리도록 내몰고 만다. 그런 목소리도 다 ‘금긋기(분열·이간질)’일 테지. 거짓말을 앞세워 틀(질서·프레임)을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목소리가 높은 곳에는 어깨동무(평화)가 깃들 틈새가 없다. 그래서 나는 혼길을 걷는다. 몸에도 마음에도 날개를 달면서 뚜벅뚜벅 걷는다. 먼길을 갈 적에는 버스를 얻어타고, 버스에서 내리면 하늘빛을 머금으며 걷는다. 걷다가 멈추어 들꽃을 보고, 바람길을 읽고, 구름꽃을 느낀다. 나는 ‘그들이 세운 틀·무리’에 깃들 마음이 없다. 언제나 ‘아이들’하고 도란도란 어울리고, ‘곁님’하고 ‘나 스스로’ 우리 보금자리를 숲빛으로 가꾸는 길을 가려는 마음이다. 나는 아무 또래(세대)가 아니다. 그저 ‘숲사람’이다.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리는 사람.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밑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