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노래 책숲마실
서울밤 (2021.11.4.)
― 서울 〈책이당〉
서울 용산 쪽에서 밤빛을 봅니다. 별빛이 아닌 불빛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서울도 예전에는 별빛이 제법 있었으나 하루하루 별빛이 떠나고 불빛이 올라섭니다. 마을마다 조촐히 어우러지던 별빛은 차츰 스러지고 잿빛으로 빽빽하게 불빛이 너울거립니다. 이 서울에서 오늘을 어떻게 마무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책이당〉이 떠오릅니다. 관악 한켠에 깃든 마을책집에 꼭 찾아가라고 알려준 이웃님 이름은 잊었지만, 152 버스를 타면 쉽게 찾아갈 듯합니다.
〈책이당〉에서 내는 “책 이는 당나귀” 새뜸(신문)을 예전에 보면서 손전화를 옮겨놓았지요. 책집은 19시에 닫지만, 책집지기님이 19시 30분까지 열어두겠다고 합니다. 서울은 어디나 길이 막히고 더디지만 이럭저럭 내려서 부릉소리가 잦아든 골목에서 조그맣게 책빛을 밝히는 곳을 쉽게 알아볼 만합니다.
책집은 얼마나 커야 할까요? 살림집은 얼마나 커야 하나요? 서울이며 시골은 얼마쯤 되는 크기여야 할까요? 책 한 자락은 얼마나 커야 하고, 이름값은 얼마나 커야 할까요?
갈래길 앞에 설 적마다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자그마한 몸집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그마한 손힘으로 넉넉한 손빛을 나누어 줍니다. 아이들은 자그마한 글씨로 나긋나긋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걸상 둘쯤 놓고, 책상 하나쯤 있으면 단출합니다. 책 스물쯤 건사하고, 글붓 한 자루를 쥐어 종이 두 쪽쯤 슥슥 하루를 갈무리하면 조촐합니다. 집 한 채 곁에는 나무 열 그루쯤 있기를 바랍니다. 골목 한 칸 둘레에는 풀밭 열 칸쯤 있기를 바라요. 천만이 살아가는 서울이라면 나무는 일억 그루쯤 자라기를 꿈꿉니다.
바다가 있기에 뭍이 싱그럽습니다. 뭍에 숲이 우거지기에 바다가 파랗습니다. 바다하고 뭍 사이에 숲이 빛나기에 하늘이 맑습니다. 바다랑 뭍이랑 하늘 사이로 물방울이 홀가분히 날아오르고 헤엄치고 흐르기에 마을이 깨어나고 사람이 눈뜨고 풀꽃나무가 춤추며 새랑 풀벌레가 노래합니다. 책은 이러한 터전 기스락에 살그머니 놓으면 즐겁습니다.
오늘 만난 책을 짊어집니다. 책집지기님은 당나귀에 책을 이고서 길을 나선다면, 책손은 등판에 책을 지고서 뚜벅뚜벅 걷습니다. 밤이 이슥할 즈음, 우리 보금자리 작은아이가 “아버지, 마당에 대나무로 길을 꾸며 놓고서 대나무길을 밟으며 놀았어요.” 하고 쪽글을 띄웁니다. 이 아이한테 건넬 그림책을 몇 자락 챙겼고, 이 아이하고 나눌 노래꽃(동시)을 서울마실길에 열 자락쯤 새로 썼습니다.
《바다 생물 콘서트》(프라우케 바구쉐 글/배진아 옮김, 흐름출판, 2021.7.15.)
《여행은 언제나 용기의 문제》(이준명 글, 어크로스, 2018.6.15.)
《고서 수집가의 기이한 책 이야기》(가지야마 도시유키 글/이규원 옮김, 북스피어, 2017.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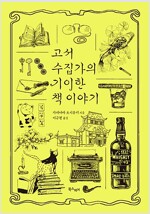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쓰고 “말꽃 짓는 책숲(사전 짓는 서재도서관)”을 꾸린다. 1992년부터 이 길을 걸었고, 쓴 책으로 《곁책》, 《쉬운 말이 평화》,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우리말 동시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시골에서 책 읽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