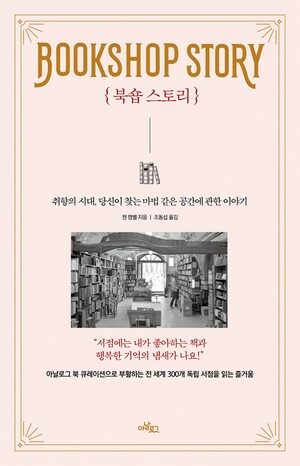-

-
북숍 스토리 - 취향의 시대, 당신이 찾는 마법 같은 공간에 관한 이야기
젠 캠벨 지음, 조동섭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7년 9월
평점 :

절판

숲노래 책읽기
인문책시렁 120
《북숍 스토리》
젠 캠벨
조동섭 옮김
아날로그
2017.9.27.
“제 서점은 피난처가 되어야 해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요.” (73쪽/캐롤라인 스메일스)
“책장 사이로 걸어가면 책들이 속삭여요. ‘왜 아직도 나를 안 읽어요?’라고 말이에요.” (100쪽/유안 허스트)
“나중에는 결국 독립서점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체인서점들 중에서도 소규모 체인이 이길 거예요. 그 서점이 전문으로 삼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서점 사람들의 개인적인 추천 도서처럼 작은 서점들만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책 판매로 이어질 거예요.” (151쪽/존 코널리)
“서점의 미래는 서점 직원들의 안목과 열정에 달려 있어요.” (169쪽/조안 해리스)
“서점에 가면 책 속에 숨은 삶들을 떠올리게 돼요. 아름다운 서점에서 발견한 책에는 그것을 발견했던 장소와 시간에 대한 기억도 더해져요.” (194쪽/코넬리아 푼케)
“동네에 훌륭한 서점이 있는 특권을 누리는 값으로 책의 정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은 귀한 물건이니까 비싸야 해요. 우리는 싼 물건과 세일에 연연하다가 정작 물건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225쪽/케리 클레어)
“서점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264쪽/크리스튼 카우프만)
지구를 두루 돌면서 300곳이 넘는 책집을 다니면서 책집지기 이야기를 귀담아듣고서 엮었다는 《북숍 스토리》(젠 캠벨/조동섭 옮김, 아날로그, 2017)인데, 이 책에는 한국 책집 이야기는 없습니다. 굳이 한국 책집을 다루어야 하지는 않아요. 어느 책집이든 알뜰히 다룰 줄 알면 되고, 책을 건사하는 사람들 손길에 어떠한 빛이 흐르는가를 노래한다면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책집으로 마실을 오는 분이 있을까요? 드물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있어요. 책집마실을 즐기는 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책집’이 궁금해서 샅샅이 다니거든요. 비록 ‘그 나라 책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지만, ‘저마다 제 나라 책집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이웃나라로 마실을 갈 적에 바로 그러한 골목이며 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아내곤 합니다.
두루 알려진 책집이든 마을에 고요히 깃든 책집이든 책을 다루는 손길은 같습니다. 첫째는 징검다리요, 둘째는 햇빛이고, 셋째는 땀방울이며, 넷째는 웃음눈물이고, 다섯째는 사랑이지 싶어요. 이 다섯 가지를 살림자리에 놓고서 돈을 얻는 일자리가 책집지기이겠지요. 《북숍 스토리》는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무엇을 다뤘을까요? 엮음새가 꽤 어수선하고, 글쓴이 이야기는 이리 새고 저리 튑니다. 글쓴이가 돌아다니며 만난 300곳이 넘는 책집지기 목소리만 담는 길이 한결 단출하면서 볼 만했을 텐데 싶더군요.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