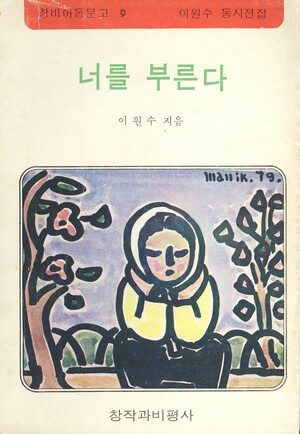우리말 이야기꽃
숲노래 우리말꽃 : 우리말이 아름다운 시
[물어봅니다]
한국말사전을 쓰는 샘님이 보기에 우리말이 아름다운 시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꼽기 어려우면 두 가지를 꼽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을 잘 살려서 쓴 시로 흔히 윤동주 님이나 김소월 님이나 백석 님을 들곤 합니다. 이분들 시도 더없이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저도 이분들 시를 즐겨요. 다만 이분들 시보다 한결 즐기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자라던 때부터 끝없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두 가지를 들 텐데요, 앞에서는 널리 알려진 싯말 그대로 옮기고, 뒤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노래로 들려줄 적에 손질한 싯말을 옮기겠습니다.
※ 햇볕 (이원수)
ㄱ. 햇볕은 고와요 하얀 햇볕은
나뭇잎에 들어가서 초록이 되고
봉오리에 들어가서 꽃빛이 되고
열매 속에 들어가선 빨강이 돼요
ㄴ. 햇볕은 따스해요 맑은 햇볕은
온세상을 골고루 안아 줍니다
우리도 가슴에 해를 안고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요
※ 햇볕 (숲노래가 손질한 글)
ㄱ. 햇볕은 고와요 하얀 햇볕은
나뭇잎에 들어가서 풀빛이 되고
봉오리에 들어가서 꽃빛이 되고
열매에 들어가선 빨강이 돼요
ㄴ. 햇볕은 따스해요 맑은 햇볕은
온누리를 골고루 안아 줍니다
우리도 가슴에 해를 안고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요
제가 손질한 대목은 “초록이 되고”를 “풀빛이 되고”이고, “열매 속에 들어가선”을 “열매에 들어가선”이며, “온세상을”을 “온누리를”이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요”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요”입니다.
이원수 님이 쓴 노래를 그대로 아이한테 불러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손볼 수 있다면 한결 고우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고향의 봄〉이란 노래를 “나의 살던 고향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마을은”으로 부릅니다. 이는 이원수 님도 이렇게 노래를 고쳐서 부르기를 바라신 대목인데요, 사람들 입에 워낙 박혀서 고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여기셨다고 하지요.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새롭게 빛나는 말로 노래를 하고 싶어요. 고운 노래가 더욱 눈부시도록 살짝 손길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겨울 물오리 (이원수)
얼음 어는 강물이 춥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얼음장 위에서도 맨발로 노는
아장아장 물오리 귀여운 새야
나도 이제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강에서 같이 살자
※ 겨울 물오리 (숲노래가 손질한 글)
얼음 어는 냇물이 춥지도 않니
동동동 떠다니는 물오리들아
얼음판에서도 맨발로 노는
아장아장 물오리 귀여운 새야
나도 이제 찬바람 무섭지 않다
오리들아 이 냇물에서 같이 살자
지난날에는 ‘강’이 아닌 ‘내’라고만 했고, 드넓은 내일 적에는 ‘가람’이라 했다지요. 모래가 고운 냇물은 으레 ‘모래내’라 해요. 이 냇물 이름은 나라 곳곳에 참 많습니다. 하늘을 별빛으로 가르는 모습도 ‘미리내’라고 해요. 미르(용)가 노니는 냇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 물오리〉란 노래에서 “강물”을 “냇물”로, “얼음장 위에서도”를 “얼음판에서도”로 손질해서 부릅니다.
저는 이 두 노래를, 동시를, 두 아이가 0살이던 무렵부터 10살이던 때까지 셀 수 없도록 불렀습니다. 예닐곱 살 무렵까지는 날마다 짧으면 한나절을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어요.
두 노래 가운데 〈햇볕〉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마음을 어떻게 건사할 적에 스스로 듬직하고 즐거우며 아름다운가 하는 실마리를 참 잘 밝혔다고 느껴요. 어린이도 어른도 다같이 햇볕이 되고, 햇빛이 되며, 햇살이 될 적에 오롯이 사랑으로 피어난다고 하는 뜻을 놀랍도록 단출히 풀어냈습니다. 게다가 우리 밥이란 바로 햇빛이면서 사랑이고, 우리 살림도 해님처럼 일구고 나누면서 활짝 웃자고 하는 마음까지 들려주어요.
동시 〈겨울 물오리〉는 이원수 님이 숨을 거두기 앞서 이녁 딸아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려서 남긴 노래라고 해요. 저는 이 동시 〈겨울 물오리〉가 이원수 님으로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눈물글(참회록)이라고 느꼈어요. 이원수 님은 서슬퍼런 이승만·박정희 독재가 춤추던 때에도 독재정권을 나무라는 동화를 꾸준히 썼어요. 전태일 님이 몸을 불살라 죽은 뒤에 곧장 쓴 〈불새의 춤〉은 참으로 엄청났지요. 이 동화 〈불새의 춤〉은 1970년대뿐 아니라 1980년대에도 곧잘 가위질이 되었는데요, 1981년에 숨을 거둔 이원수 님은 어린이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문학으로 눈물글을 남겼구나 하고 느낍니다. 바로 〈겨울 물오리〉로요.
잘 보셔요. 얼음이 언 냇물이 추워서 동동동 구르는 아이는 오리를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얼음판에서 맨발로 웃으며 뛰노는 오리를 보며 시나브로 기운을 내고, 어느덧 “나도 이제 찬바람 무섭지 않다” 하고 외치면서 “오리들아 이 냇물에서 같이 살자” 하고 노래하지요.
이원수 님은 마지막 숨을 쉬는 날까지 지난날 친일시를 가슴에 묻고 살았구나 싶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눈물글을 쓸 수 없을 테니까요. 이원수 님을 기리는 곳에 ‘이원수 친일시’를 크게 붙였다고 하는데, 그 친일시 곁에는 꼭 이 〈겨울 물오리〉를 나란히 붙여놓고서, 1981년에 전두환이 칼춤을 추던 그무렵 눈물글로 남긴 동시라고 하는 덧말도 적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이쁜 낱말을 골라서 이쁘장하게 꾸며서 태어나지는 않는다고 느껴요. 아름다움이란, 삶을 스스로 새롭게 짓는 슬기로운 사랑이 바탕이 되어 태어난다고 느껴요.
잘잘못을 떠나, 우리가 저마다 살아온 길을 찬찬히 짚으면서 그 모든 발자국을 고이 끌어안고서 눈물로 씻고 웃음으로 피우며 허물벗기하고 날개돋이를 할 줄 알기에 비로소 동시요 시이며 문학이지 싶습니다. 제가 꼽는 ‘우리말을 아름답게 살린 시’라면 이원수 님이 남긴 두 가지 동시입니다. 삶을 사랑으로 밝히기에 아름다운 〈햇볕〉이고, 삶을 눈물로 빛내기에 아름다운 〈겨울 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한국말사전을 쓰고 “사전 짓는 책숲(사전 짓는 서재도서관)”을 꾸리는 숲노래(최종규). 1992년부터 이 길을 걸었고, 2019년까지 쓴 책으로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우리말 동시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시골에서 책 읽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