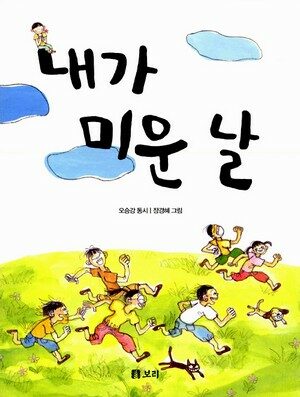-

-
내가 미운 날 ㅣ 보리 어린이 25
오승강 지음, 장경혜 그림 / 보리 / 2012년 10월
평점 :



숲노래 책읽기/숲노래 동시읽기
별빛아이 곁에서 길어올린 노래꽃
《내가 미운 날》
오승강 글
장경혜 그림
보리
2012.10.8.
도움반에 와서 / 이태나 공부해도 / 글자를 못 깨치는 아이들에게 / 이놈 돌머리들아 / 선생님이 한마디 하신 뒤로 / 아이들은 다툽니다. // 서로 제 머리가 / 더 단단한 돌머리라고 / 말다툼을 합니다. // 책상에 머리를 / 쾅쾅 박기도 하고 / 서로 박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 선생님 머리에도 / 박치기를 하면서 (돌머리 다툼/17쪽)
아이들이 툭탁거립니다. 아이들은 툭탁질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바로 책이나 영화에서 배웁니다. 책이나 영화는 이야기를 엮으려고 줄거리를 짤 적에 으레 툭탁질을 바탕으로 해요. ‘툭탁질’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알아들을 만한 말을 썼습니다만, 이 툭탁질은 싸우는 짓(전쟁)뿐 아니라 얽히는 모습(갈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책이나 영화는 사람들 눈을 끌려고 툭탁질을 어떻게 풀어내어 서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실마리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 때로는 좀 센 툭탁질을 보여주고, 우스꽝스러운 툭탁질도 보여주지요. 아이들은 실마리가 풀리는 길도 지켜보겠지만, 툭탁질에 마음이 끌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툭탁거릴 적에 나무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본 대로 배워서 고스란히 따라할 뿐이거든요. 이때에는 차분히 지켜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어버이나 어른 스스로 짜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타이르는 말은 자칫 꾸지람이나 길고 따분한 수다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짜서 들려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노래꽃이 떠오르더군요. 그냥 시나 동시가 아닌 ‘노래꽃’이란 이름으로 열여섯 줄을 짤막히 간추려서 들려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과자 한 봉지 / 교실에 들고 와서 // 동무들 보는 앞에 / 혼자서는 못 먹어 // 동무들에게 / 한 움큼씩 나눠 주었습니다. / 내 몫도 없이 /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24쪽)
도움반에 온 날 /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했다고 / 나는 어머니에게 맞았습니다. (도움반에 온 날/42쪽)
좀처럼 오순도순 지내지 못한다 싶은 날에는 ‘오순도순’이란 이름으로 노래꽃을 써요. “북적이는 여름날 논 못 / 시끌시끌 노래판 여는 / 개구리 이 곁에 / 풀밭 풀벌레 // 물결치는 가을철 들판 / 쏴륵촤륵 춤판 짓는 / 나락에 참새에 / 햇발은 더욱 그윽”처럼 먼저 여덟 줄을 열고서 “펑펑대는 겨울빛 마을 / 사근사근 고요판 이룬 / 눈송이 눈사람 눈길 / 바람이랑 곰이랑 새근 // 도란도란 풀씨가 이야기 / 오순도순 깨어나 또 얘기 / 소근속닥 기지개 다시 모여 / 봄숲은 가만가만 어우러지지”처럼 여덟 줄을 마감합니다.
엽서 크기만큼 작은 쪽종이에 이렇게 열여섯 줄을 연필로 적어서 아이들한테 건넵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밥을 소리내어 읽어 봅니다. 저도 아이들 뒤를 이어 새삼스레 소리내어 읽어 줍니다.
열여섯 줄 노래꽃은 얼마나 힘을 낼까요? 글쎄,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뚜렷이 느껴요. 아이들은 어버이나 어른이 저희한테 어떤 이야기밥을 들려주는가를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어버이나 어른이 저희한테 쓰는 말을 고스란히 마음에 새겨서 나중에 반드시 씁니다. 어버이가 아이한테 “너 그러지 말랬지!” 하고 나무라면, 아이는 저보다 어른 동생이나 다른 동무한테 “너 그러지 말랬지!” 하고 똑같이 소리지르지요. 어버이가 아이 곁에서 나무를 보며 “아아, 참 아름답네. 곱네. 사랑스럽네.” 하고 속삭이면 아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어느 자리에서 “참 아름답네요. 곱네요. 사랑스럽네요.” 같은 말을 문득 읊습니다.
아이들이 / 우리를 / 바보라고 합니다. // 선생님들도 / 우리를 / 바보라고 합니다. // 아이들이 / 우리 선생님을 / 바보라고 합니다. // 선생님들도 / 우리 선생님을 /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56쪽)
동시라기보다는 노래꽃인 《내가 미운 날》(오승강, 보리, 2012)이 있습니다. 흔히 이 책을 동시집으로 여길 테지만, 굳이 동시라는 틀에 얽매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시쓴님 오승강 님은 삶을 노래하며 꽃으로 피우듯이 한 줄씩 적어 내려갔구나 싶거든요.
퍽 오래도록 멧골마을 분교에서 샘님(교사)으로 일하던 오승강 님은 별빛칸(특수 학급)을 맡아서 별빛아이를 맡아서 돌보는 길을 걸었다고 해요. 이때 겪거나 마주한 배움살림을 가만가만 노래처럼 여미어 《내가 미운 날》을 묶었다지요.
공부하다가도 / 동무가 오줌 누러 가면 /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나 / 오줌 누러 갑니다. // 동무가 물 마시러 가면 / 모두 물 마시러 가고 / 손 씻으러 가면 / 모두 손 씻으러 갑니다. (참지 못합니다/88쪽)
‘별빛칸’이나 ‘별빛아이’ 같은 이름을 쓰는 분은 아직 없지 싶습니다만, 《내가 미운 날》을 읽는 내내 ‘특수 학급’도 ‘장애아’도 아닌, 참으로 별빛 같은 마음인 아이들이 별빛 같은 하루를 별빛 같은 어른 곁에서 누리네 하고 느꼈어요.
학교 안팎을 돌아보면 ‘일반인·일반 학급’이나 ‘장애아·장애 학급(특수 학급·특수반)’으로 가르는데요, ‘일반인’이란 이름도 ‘특수반’이란 이름도 몹시 어설프거나 어정쩡하지 싶습니다. 무엇이 ‘일반’이거나 ‘특수’일까요? 아이를 이런 이름으로 갈라도 될까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이름을 익숙하게 받아들여도 아름다울까요?
서울 아이 유리는 이상한 아이. / 냇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 큰 바위를 보며 / 이건 천만 원짜리다 말합니다 …… 그때마다 우리는 크게 웃었습니다. / 돌도 나무도 풀도 모두 돈으로 보는 / 그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 많은 돈으로 보는 유리를 / 우리는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 서울에서는 정말 그렇다고 / 자기 집 마당에 그런 것을 사 키운다고 / 유리는 자꾸 말하지만 /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 그런 것을 돈 주고 사는 / 유리 아버지까지 /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상한 아이/116∼117쪽)
노래꽃 ‘이상한 아이’를 읽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얄궂은 물결에 크게 휩쓸린 삶입니다. 돌 하나조차, 나무 한 그루마저, 값으로 이래저래 따집니다. 이제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페트병에 담은 물을 먹는샘물이란 이름을 붙여서 마십니다만, 흐르는 냇물을 길어서 마시지 않고 페트병에 담아서 마시는 얼거리는 참으로 얄궂지 않을까요? 흐르는 결대로 맑은 물이 우리 몸에 좋다면, 온갖 공장이 나라 곳곳에 기계설비를 들여서 맑은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파는 일을 하도록 부추길 노릇이 아닌, 나라 어느 냇물이든 맑도록 다스려서, 나라 어느 곳에서도 맑은 냇물이며 샘물을 ‘그냥(거저로)’ 누릴 수 있는 터로 가꿀 노릇이 아닐까요?
깊은 숲에 들어가면서도 페트병에 담은 물을 챙기는 분이 많아요. 싱그러운 골짝물을 코앞에 두고서 페트병 물을 홀짝이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길들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이 길든 버릇을 바꿀 만할까요?
강아지풀은 강아지풀 / 망초꽃은 망초꽃 / 서울에서도 / 영양에서도 / 제 얼굴 / 제 이름은 잊지 않아요. (씨앗은 알고 있어요/139쪽)
경상도 영양은 깊디깊은 멧골입니다. 이 깊디깊은 멧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서울이든 대구이든 안동이든 나아가야 ‘성공’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많거나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승강 님은 바로 이 깊디깊은 멧골이야말로 아름다운 터전이라고 여겨, 이 멧골자락 분교 어린이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젊은 날을 보냈다고 해요. 나중에는 별빛아이랑 손을 맞잡고 늘그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샘님(교사)으로서 배움터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어린이를 마주하면서 초롱초롱 눈빛으로 노래꽃을 길어올리는 어른이란 길을 가실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서나 강아지풀이요 망초꽃이듯, 어디에서나 노래꽃으로 눈부실 이야기 한 자락을 기다립니다. 어디에서나 햇볕이요 바람이듯,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사랑이요 즐거운 노래가 될 글 한 줄을 새록새록 새깁니다. ㅅㄴㄹ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사전을 쓰는 사람.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읽는 우리말 사전 1·2·3》, 《우리말 동시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시골에서 도서관 하는 즐거움》,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시골에서 책 읽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숲에서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새롭게 살려낸 우리말》,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들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