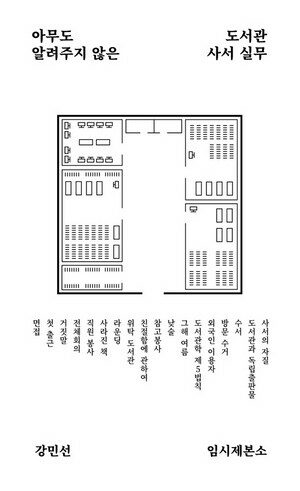-

-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강민선 지음 / 임시제본소 / 2018년 10월
평점 :



숲노래 책읽기
인문책시렁 97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강민선
임시제본소
2018.10.26.
내부고발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초과한 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많은 산하기관들 중 일부만 돌려받았을 뿐 도서관 직원들은 받지 못했다. 고발한 사람은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36쪽)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 말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건 말해 주지 않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말을 해 줘야 아느냐 말하지 않아도 아느냐가 그 직원의 역량이었고 …… (40∼41쪽)
나는 여태까지 그 아이에게 어떤 책을 골라서 보냈는지 알지 못했다 … 나는 내가 보내준 책을 얌전히 읽고 다음 책을 조용히 기다렸을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서관 사서에게 아이의 부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다. (52쪽)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나는 알퐁스 도데가 책이름인지 사람이름인지를 묻는 이용자를 순간 내려다보았던 것이다. (57쪽)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동네 책방에서 정가에 책을 사는 것이다. (139쪽)
나라 곳곳에서 도서관을 꾸리는 이웃님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틀림없이 ‘도서관’을 꾸리지만, 도서관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는군요. 도서관법으로 따지면 ‘사서자격증’을 갖추고 꽤 널찍한 자리를 따로 꾸릴 수 있으면서 ‘도서관위원회’를 열기도 해야 비로소 ‘도서관’이란 이름을 쓸 수 있다고 못박습니다.
마을에서 조그맣게 꾸려도 도서관이요, 나라에서 커다랗게 이끌어도 도서관이겠지요. 그런데 왜 법은 굳이 ‘도서관·작은도서관’을 갈라야 할까요? 작은도서관일 적에는 사서자격증을 안 갖추어도 ‘봐준다’고 하는 법인데, 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도서관을 열거나 꾸릴 수 있어야 할까요?
밥집을 꾸리려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될 테지만, 글·책을 쓰거나 읽고 나누는 길에서는 틀에 가두지 않아도 되리라 느껴요.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글이건 시이건 소설이건 수필이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대학교라든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책마을 일꾼이 되거나 책을 쓰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대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를 안 마쳤어도 새책집이건 헌책집이건 열어서 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도서관만큼은 ‘대학교 졸업장 + 자격증’이라는 문턱을 세우려 할까요?
늦깎이로 사서자격증을 따서 사설기관이 꾸리는 공공도서관에서 일한 삶길을 찬찬히 옮겨적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강민선, 임시제본소, 2018)를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처음부터 도서관 사서가 될 생각이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글쓰기란 길을 가고 싶었다는군요. 이러다가 어찌저찌 늦깎이로 사서자격증을 땄고, 이 자격증을 땄대서 사서가 되는 길은 매우 좁다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사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도서관 책지기라는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려고 보니, 이 일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주거나 들려주는 분이 없었다고 해요. ‘자격증을 따서 들어왔’으니 알아서 하리라 여기고, 이밖에 포토샵이나 여러 풀그림을 다룰 줄 알기를 바랐다더군요. 손님으로 드나들던 도서관에서는 까맣게 모르던 일이었답니다. 일꾼이란 자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박이로 지내는 도서관으로 바뀌니, 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가 많은지 놀랐다고 합니다.
도서관이기에 겪거나 누릴 수 있는 기쁜 보람이 무척 크다고 해요. 이에 못지않게 도서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할까 싶은 아리송한 일거리가 참으로 크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 한 자락이 우리네 도서관 민낯을 모두 밝히지는 않습니다. 또 글쓴이 스스로 ‘너무 세다’ 싶은 대목은 되도록 잘라냈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아직 이 나라 책살림이 덜 아름답기에 갖가지 안타까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싹트려고 하는 책살림이니, 이런 잘못이나 저런 구멍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도서관 책지기를 뵈던 날 그분들이 ‘수서(收書)’라고 하는, 사전에도 없는 일본 한자말을 쓰시기에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고 여쭈었더니 그분들도 제대로 풀어내어 알려주지 못하시더군요. 그러나 가만히 듣고 보니, 또 도서관을 다룬 여러 가지 책을 찾아서 읽고 보니, 일본 한자말 ‘수서’는 ‘책들임’을 나타내더군요.
곰곰이 보면 ‘도서관’이란 이름을 새로 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서자격증을 따서 일하는 분으로서는 그냥 익숙한 이름일 테지만, 처음으로 책을 만나려고 나들이를 가는 어린이한테는 참으로 낯선 이름이거든요. 책을 아름드리로 갖춘 그곳, 숲에서 온 종이로 지은 책을 고루 갖추어 어느 곳에서나 푸르며 싱그러운 마음이 되도록 푸르게 돌보려는 그곳, 이런 그곳이라면 ‘책 + 숲’ 또는 ‘책 + 숲 + 집’이란 얼개로 ‘책숲’이나 ‘책숲집’이란 이름을 새로 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책으로 이룬 숲이요, 책으로 이룬 숲이면서 포근한 집 같은 곳이라면 말이지요.
글쓴이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란 책을 써내어 스스로 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얼마쯤 뒤 도서관 사서란 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책 때문에 그만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책숲에서 책지기 노릇을 맡은 분들이 싱그러운 숲바람 같은 책을 사람들한테 잇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는 ‘서로서로 알려주는 사랑스러운 숲살림’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뒷이야기가 스러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마을살림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