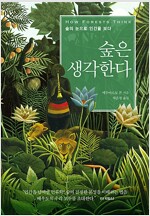오늘 읽기 2018.6.23.
《숲은 생각한다》
에두아르도 콘 글/차은정 옮김, 사월의책, 2018.5.20.
고흥이라는 시골에 살기 앞서부터 ‘숲’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곳에 눈이 갔다. 숲을 다루든 말하든, 숲 언저리를 밝히든, 숲하고 얽힌 책이면 으레 집어들어 읽곤 한다. 《숲은 생각한다》를 손에 쥐면서 “숲을 생각한다”도 아닌 “숲은 생각한다”라는 이름을 오래도록 곱씹는다. 사람은 숲을 생각할 테고, 숲은 사람을 생각할 테지.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을 사랑스레 가꾸는 길에 숲을 생각하고, 숲은 숲으로 푸르게 빛나는 보금자리를 꿈꾸는 바람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 다만 이 책을 읽는 동안 말이 참 딱딱하다고 느낀다. 숲이라고 하는 숨결은 이렇게 딱딱한 말을 안 쓸 텐데, 학자 자리에 서면 다들 말이 딱딱하다. 적어도 숲을 헤아리려는 학문이라면 숲처럼 부드러우면서 넉넉하고 따사로이 말할 줄 알면 좋겠다. 숲말은 시골말일 터이니, 숲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돌아보려는 책은 숲말로 숲노래로 숲바람으로 숲사랑으로 산들바람 같은 말씨를 쓰면 참으로 좋겠다. 숲이 스스로 생각하듯이 풀도 꽃도 스스로 생각한다. 나무도 흙도 돌도 스스로 생각한다. 시내도 바다도 스스로 생각하겠지. 모두 스스로 생각한다. 아름다이 어우러질 삶을. 곱게 어깨동무하면서 활짝 웃을 살림을. ㅅㄴㄹ
(숲노래/최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