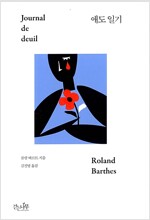숲노래 살림말 / 숲노래 책넋
2025.5.17. 날마다 조금씩
ㄱ
봄은 하루아침에 안 온다. 겨울은 하루아침에 안 온다. 봄이 오기까지 천천히 하루가 흐른다. 겨울이 오기까지 찬찬히 하루가 지난다. 첫봄과 한봄과 늦봄이 있다. 첫겨울과 한겨울과 늦겨울이 있다. 우리는 예부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이름으로 철을 바라보았고, 네철을 다시 석걸음으로 마주하였는데, 석걸음인 네철은 다달이 새롭다.
동박나무는 여름에 잎을 떨군다. 아니 늦봄 무렵부터 가랑잎을 낸다. 마당에 동박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면 서울 한복판에서도 ‘여름가랑잎’을 안다. 바닷마을이나 섬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후박나무도 나란히 여름가랑잎을 내는 줄 안다. 늘푸른나무는 늘푸른잎을 건사하려고 여름에 헌잎을 내려놓으면서 새잎을 낸다.
날마다 조금씩 자라면서 푸르게 물드는 잎이고, 날마다 조금씩 시들면서 노랗게 물드는 잎이다.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하루아침에 시들지 않는다.
삶이란 물줄기처럼 흐른다. 멧골에서 샘솟아 들숲을 적시며 흐르더니 갯벌을 거쳐서 바다로 스미고는 새삼스레 하늘로 올라서 비로 내리는 물줄기이다. 삶이란 바람줄기처럼 감돈다. 모든 숨붙이는 들숨날숨을 잇고, 사람과 풀꽃나무는 서로 들숨날숨을 이으면서 푸르게 노래하면서 이 땅에 선다.
ㄴ
하루글(일기)이란, 하루를 적는 글이다. 하루글이란, 스스로 살아낸 오늘 하루를 그대로 옮기는 글이다. 하루글이란, 즐겁든 슬프든 고스란히 밝히면서 웃음과 눈물을 나란히 노래하는 글이다. 하루글이란, 새롭든 똑같든 살림을 지은 내 발걸음과 손길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익히려는 글이다.
씨앗 한 톨이 영글기까지 한 해가 걸리는데, 씨앗 한 톨을 영그는 푸나무는 온삶을 기울여서 자란다. 나무는 씨앗 한 톨을 맺는 어른나무로 서기까지 스무 해쯤 느긋이 자란다. 풀포기도 씨앗 한 톨을 맺는 어른풀로 서기까지 긴긴 나날을 가만히 꿈꾸면서 자란다.
힘든 오늘이라면 “아, 힘들어. 한 줄을 적기도 힘들어.” 하고 남길 수 있다. 신나는 오늘이라면 조잘조잘 주절주절 몇 쪽이고 옮길 수 있다. 고단한 오늘이라면 날짜만 겨우 적고서 넘어갈 수 있다. 기쁜 오늘이라면 글을 안 쓰더라도 그림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고, 저렇게 하기에 나쁘지 않다. 하루글도 오늘글도 삶글도 살림글도 사랑글도 숲글도 노래글도 느낌글도 책글도 매한가지이다. 누구나 스스로 살아내는 이야기를 적는다. 저마다 스스로 살림하는 이곳 이때 이 마음 이 숨결을 쓴다.
ㄷ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님이 남긴 책 가운데 《씨앗의 희망》이 있다. 이오덕 님이 남긴 책 가운데 《이오덕 교육일기》가 있다. 두 책 모두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저 꾸준히 하루하루 적고 그리고 담고 남긴 이야기를 꾸리니 어느새 도톰하게 깨어날 뿐이다.
잘하는 살림과 잘못하는 살림은 따로 없다. 네가 짓는 살림과 내가 빚는 살림이 있으며, 우리가 돌보는 살림이 있다. 살림에는 높낮이가 없다. 살림에는 이야기가 있다. 살림에는 옳고그름이나 좋고나쁨이 없다. 살림은 늘 살림이고, 살림길이란 살림씨앗을 사뿐히 심으면서 걸어가는 하루이다.
이오덕 님은 왜 어른일까? 권정생 님은 왜 어른인가? 두 분은 왜 어른일까? 우리는 오늘 어른인가? 어른이란 먼곳에 있을까? 아이를 낳아 돌보는 누구나 어른이지 않을까? 아이를 안 낳았어도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를 따사로이 바라보고 돌아볼 줄 알면 언제나 어른이지 않은가? 나이가 많기에 어른이지 않다. 나이가 적기에 어른이 아니지 않다. 뭘 알거나 잘 다루기에 어른이지 않다. 뭘 모르거나 못 다루기에 어른이 아닐 수 없다.
철을 알고 익히면서 나눌 줄 아는 마음이기에, 나이가 아무리 적거나 어려도 어른이다. 철을 등지고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도 못 나누는 마음이라서,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어른이 아니다.
너는 어른이고, 나는 어른이다. 우리는 어른이다. 서로 어른이고 함께 어른이다. 먼곳에 있는 어른이 아닌, 우리 누구나 어른이다. 그래서 《어린이는 모두 시인다》 같은 책이 태어났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은 모두 노래꽃”이면서 “사람은 모두 아이답게 빛나고 어른답게 철들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로 어울리기에 이 푸른별을 가꾸고 이 파란별을 보살피는 꿈씨앗과 사랑씨앗을 왼손과 오른손에 한 톨씩 놓고서 사뿐사뿐 나들이를 한다”고 여길 만하다.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