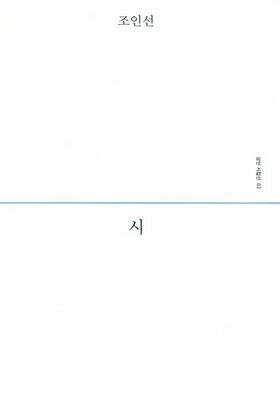-

-
시 ㅣ 삼인 시집선 2
조인선 지음 / 삼인 / 2016년 5월
평점 :



시를 노래하는 말 299
소를 키우면서 쓴 노래, 아이한테서 배운 노래
― 시
조인선 글
삼인 펴냄, 2016.5.15. 8000원
여기 소를 치는 아재가 있습니다. 소치기 아재일 텐데, 소를 치는 아재는 소를 먹이고 소를 돌보다가 소를 내다 팔며 살림을 꾸리는 동안 시를 쓴다고 합니다. 소치기 아재한테 소는 살림을 꾸리는 바탕이면서 시를 짓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치기 아재한테는 ‘시란 소’ 또는 ‘소란 시’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슬이 오고
메뚜기가 앉아 있고
개구리가 뱀이 아이들이 나왔다
내가 보이고 성난 아버지와 무덤 속 조상들이 보였다
그렇게 막막한 세월이 선명해지자
풀을 베어 소에게 먹였다 (풀)
우리 집 뒤꼍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인지 여러 그루인지 알 길이 없으나, 이 무화과나무는 새 가지를 죽죽 뻗으면서 씩씩하게 자랍니다. 해마다 무화과알을 잔뜩 베풉니다.
우리 집 나무가 없던 지난날에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같은 나무 한 그루 없이 도시에서 좁다란 겹겹집 한 층을 얻어서 지낼 적에는 나무 한살이를 몰랐습니다. 더욱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알이 어떻게 맺는지 몰랐고, 이 무화과알을 사람뿐 아니라 벌이며 나비이며 풀벌레이며 딱정벌레이며, 게다가 파리랑 모기까지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몰랐어요.
우리 집 무화과나무가 없던 지난날에는 나무 열매는 새가 더러 나누어 먹는다고, 때로는 멧짐승이 나누어 먹는다고 여겼어요. 우리 집 나무를 곁에 두면서 이 나무를 늘 바라보니, 나무를 둘러싼 너른 이웃과 살림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분도 저희하고 마찬가지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마당이나 뒤꼍에 나무 몇 그루를 돌본다면 이 나무를 늘 바라보면서 이 나무하고 얽힌 이야기를 둘레에 조곤조곤 들려주기 마련이에요. 시를 쓴다면 바로 ‘우리 집 나무’ 이야기를 쓸 테고, 이 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가만히 지켜본다면 ‘무화과나무’하고 얽힌 이야기를 가만가만 쓸 테지요.
선거가 끝나자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래도
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거기에다 웃으며 방울들을 달았다
드라마 속 사랑은 여전히 돈지랄이었고 걸그룹의 자태는 아슬아슬하게 매혹적이었다
뉴스는 사람들이 몰라도 될 것들만 보여주었고 (그날 이후)
시집 《시》(삼인 펴냄,2016)를 읽으면서 시 한 자락을 둘러싼 이야기를 곰곰이 돌아봅니다. 책이름부터 더도 덜도 아닌 “시” 한 마디인 시집을 읽으면서, 소치기 아재한테는 언제나 소가 시일 뿐 아니라, 바로 이 소한테서 숱한 이야기를 길어올리는 하루가 흐른다고 느껴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시를 헤아리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저마다 다른 곳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짓는 마음으로 시를 받아들이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책 살 돈으로 그 짓을 하고
자유와 해방을 외쳤다
간신히 졸업하고 폐인이 됐다
시를 쓰고 또 썼다
소도 키웠다
마흔이 가까워
아내를 만나기 전 배운 베트남 첫 말은
안녕이었다 (청춘)
시집 《소》를 써낸 아재한테는 베트남에서 온 곁님이 있고,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집살림도 고스란히 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열한 살 된 딸아이가 문득 아버지한테 여쭌 말 한 마디가 새롭게 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란 삶’이면서 ‘삶이란 시’라고 할까요. 여기에 ‘시란 사랑’이면서 ‘사랑이란 시’라고 할 만하지 싶어요.
스스로 사랑하는 삶이 시로 태어납니다. 스스로 시로 쓰고픈 이야기가 언제나 사랑스러운 삶으로 흐릅니다. 사랑하는 곁님을 둘러싼 이야기가 시로 거듭나고, 이 시를 되새기면서 삶을 새롭게 가꾸어요. 사랑하는 아이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시로 피어나며, 이 시를 곱새기면서 삶을 싱그럽게 짓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열한 살 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돈이 중요해? 동물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지
아빠, 사람이 없으면 돈도 필요없잖아 (철학)
열한 살 딸아이는 아버지한테 삶을 물었습니다. 사랑도 함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께 물어요. 아버지는 열한 살 딸아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를 못한 채 얼버무리지만, 아이는 똑부러지게 말하지요. 이러는 동안 아버지는 아이한테서 시를 배웁니다. 따로 스승을 두어서 시를 잘 쓴다기보다, 곁에 사랑스러운 숨결이 있기에 이 사랑스러운 숨결이 문득 건네는 이야기를 받아서 시를 조용히 씁니다.
돈은 어디에 쓸까요? 돈은 얼마나 써야 할까요? 돈을 얼마나 벌여야 할까요? 번 돈은 어떻게 쓰면 즐거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을 늘 잊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 낮 저녁으로 아이하고 부대끼면서 모든 삶하고 살림을 즐거이 가르칠 수 있어요. 맛나거나 대단한 밥을 멋진 밥집에서 사다가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라면 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노래하면서 끓이고 웃음을 지으면서 먹으면 배부를 수 있어요.
시를 쓰면서 사랑이 됩니다. 사랑으로 되살아나면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면서 씩씩한 사람 하나로 다시 섭니다. 씩씩한 사람 하나로 다시 서면서 새롭게 시를 씁니다. 2017.9.26.불.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