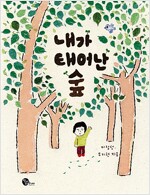숲노래, 마당에서 읽은 책 2017.9.5.
“넌 어디에서 태어났니?” 하고 물으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병원이요’나 ‘산부인과요’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또는 ‘서울이요’나 ‘부산이요’ 같은 말을 할 테고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이나 서울에서만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머니 몸을 거쳐서 이 땅에 나온 자리가 병원이나 서울일 수 있지만, 우리 숨결이나 넋을 이루는 바탕은 언제나 숲이라고 느껴요. 우리가 목숨을 이으려고 먹는 밥도 모두 숲에서 비롯하고요. 그림책 《내가 태어난 숲》을 가만히 읽습니다. 바느질이 한 땀 두 땀 흐르면서 이야기가 한 꼭지 두 꼭지 어우러집니다. 붓끝을 넘어 바늘끝으로 이야기꽃이 피어요. 그림책은 투박하게 흐릅니다. 할머니가 찬찬히 놓은 바늘땀은 조용하면서 싱그러운 웃음입니다.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웃음을 새롭게 피우려는 손길은 상냥한 노래입니다. 가을비가 옵니다. 잔잔하게 옵니다. 이 가을비를 맞으면서 마당에서 무화과를 두 소쿠리 땁니다. 말벌도 모기도 파리도 개미도 나비도 무화과 달콤한 열매맛을 보려고 모두 모입니다. 직박구리도 박새도 물까치도 무화과 달달한 열매맛을 보고 싶어 옆에서 저를 지켜봅니다. 그래 그래, 우리 같이 먹자.
(숲노래/최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