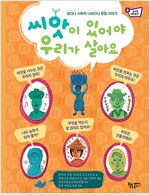이 글은 <전라도닷컴> 2016년 5월호에 실었습니다.
..
시골도서관 풀내음
― 나무 곁 풀밭에 누우며
봄이 무르익으면서 따사로운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워 골짝마실을 갔습니다. 자전거로 골짜기를 탄다든지 봉우리를 넘자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지만, 천천히 달려서 천천히 둘러보는 숲길이 언제나 반갑습니다.
골짝물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골짝물에 몸을 담그며 놀기에도 아직 찹니다. 그렇지만 바위를 타며 숲놀이를 즐깁니다. 가랑잎을 엮은 ‘잎배’를 물줄기에 살며시 올려놓으며 놉니다. 발밑에 밟히는 가랑잎 소리를 들으며 숲을 찬찬히 거닙니다. 이러다가 아주 작고 하얀 꽃을 봅니다. 쓰러진 나무 밑에서 피어난 하얀 꽃입니다. 아주 작아서 먼발치에서는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할 만합니다.
아버지가 땅바닥에 쪼그려앉아서 뭔가를 들여다본다고 여긴 두 아이가 어느새 옆으로 달라붙습니다. 셋이 함께 쪼그려앉아서 작은 숲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꽃 뭐야? 예쁘다.” “예쁘지. 예쁘면 네가 이름을 지어 줘.” “음, 흰꽃? 아니면 별꽃?” 꽃 학자나 풀 학자가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만, 나는 이런 이름을 먼저 알려주기 앞서 아이들 나름대로 꽃이나 풀이나 나무를 마주하면서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른바 ‘학명’은 맨 나중에 알려줍니다.
골짝마실에서 돌아와 여러 가지 사전을 뒤적입니다. 우리가 숲에서 본 꽃을 놓고 ‘산자고(山茨菰)’라고 하는 이름도 쓴다지만, 이보다 훨씬 오래되고 시골사람 사이에서 쓰는 이름이 있으리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물옺’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온다는 ‘가채무릇’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북녘에서는 ‘까치무릇’을 학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름을 찾아보면서 이 가운데 어떤 이름을 아이한테 들려줄는지, 또는 세 가지를 모두 알려주어야 할는지 헤아려 봅니다. 이 나라에서는 꽃이나 풀 한 가지를 놓고 ‘여느 이름(시골 이름)’하고 ‘학문 이름’이 왜 다른가 하는 대목도 밝혀서 들려주어야 하는구나 하고도 생각해 봅니다.
반다나 시바 님하고 마리나 모르푸르고 님이 함께 글을 쓴 어린이 생태인문책 《씨앗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책속물고기,2016)가 있습니다. 100쪽이 안 되는 얇은 책이지만, 책에 담은 이야기는 매우 알차다고 느껴요.
“다국적 씨앗 회사들은 씨앗을 서로 나누는 농부들을 골칫거리로 생각했어요. 씨앗을 보관하고 나누는 것이 원래 농부의 일이고 권리인데 말이에요.” (50쪽)
다국적 씨앗 회사에서는 ‘씨앗 특허’를 내요. 씨앗 회사가 이런 일을 하기 앞서 ‘꽃 특허’가 있어요. 씨앗이든 꽃이든 장사를 크게 벌여서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려고 하면서 특허를 누가 먼저 올리느냐 하는 다툼이 불거진다는데, 이러는 동안 시골에서 조용히 흙을 만지는 사람들이 덤터기를 쓰고 말아요.
나눈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다투지 싶어요. 함께 즐긴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싸우는구나 싶어요. 이 봄에 손수 씨앗을 심어서 알뜰히 보살피는 하루를 누리는 살림이 된다면 다툼이나 싸움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갈 만하리라 생각해요.
이 봄에 아이들하고 날마다 밭을 일굽니다. 지난 다섯 해 동안 묵힌 밭을 날마다 두 평씩 갈아서 씨앗을 심습니다. 기계로 하면 한나절도 안 걸릴 밭일이지만 한 달 남짓 차근차근 밭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밭놀이일 수 있고 ‘소꿉밭’일 수 있습니다. 한나절 만에 다 갈아서 씨앗을 심고 끝내는 밭일도 나쁘지 않지만, 아이들이 늘 밭을 살피며 흙을 만지며 함께 놀기를 바라면서 소꿉밭을 짓습니다.
소꿉밭을 다 지은 뒤에는 다른 살림을 만져요. 보드랍고 싱그럽게 올라오는 나물을 훑어서 밑반찬을 마련하고, 겨우내 미룬 헛간 치우기를 합니다. 서재도서관 책꽂이를 손질하고, 이불이랑 봄옷을 빨며 방을 새로 꾸밉니다. 그리고 찔레싹을 한가득 훑어서 찔레무침을 합니다. 한 소쿠리는 날찔레를 고추장으로 무칩니다. 한 소쿠리는 데쳐서 된장으로 무칩니다. 소복히 담은 찔레무침 한 접시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마침 낮밥을 자시던 할머니들이 찔레무침 접시를 보시더니 “두릅이요?” 하고 묻습니다. “아니에요. 드셔 보셔요.” “이게 뭔가?” “찔레요.”
빈 접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영권 님이 쓴 《참 쉬운 곤충 이야기》(철수와영희,2016)를 읽어 봅니다. 이 봄에 돋아서 솜털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흰민들레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노린재가 민들레씨를 붙안으면서 놀곤 합니다. 노린재는 짝짓기를 할 적에 솜털씨앗이 폭신해서 좋아할까요.
“물속 곤충들은 물에서 썩어 가는 부식질과 유기물을 먹고 살아. 만일 이들이 없다면 물이 부패하고 탁해지는 것을 막기 어려워.” (147쪽)
밭에서 쉽게 만나는 노린재가 어떤 노린재인가를 알아보려고, 또 아직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풀벌레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벌레 이야기책을 자주 들춥니다. 냇물이나 골짝물이나 도랑물에서는 이 물에서 사는 작은 벌레가 있기에 물이 맑다고 합니다. 밭이나 숲이나 들에서도 이곳에서 사는 수없이 많은 작은 벌레가 있기에 기름진 흙이 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 까무잡잡한 멋진 흙이 되리라 느낍니다.
다섯 해를 고이 묵힌 밭을 일구다 보면 참말로 수많은 벌레를 만나요. 이 시골집에 처음 깃들 적에는 쓰레기더미였던 자리가 어느새 싱그러운 흙으로 바뀌었어요. 삽날조차 안 들어가던 붉은닥세리도 삽날이 잘 들어가는 흙이 되었습니다. 나는 쓰레기를 걷어냈을 뿐이고, 후박잎에 동백꽃에 갓줄기를 이 땅에 얹어서 말렸어요. 흙이 흙답게 되도록 애쓴 일은 모두 풀벌레하고 지렁이가 해 주었어요.
뒤꼍에서 감나무 뿌리를 감싸던 석류나무를 두 시간 즈음 삽질을 해서 겨우 떼놓아 옮겨서 심었습니다. 이동안 아이들은 나무 둘레에서 놀다가, 감나무를 타다가, 감나무 옆 풀밭에 드러눕습니다. 나무 곁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 어떠니? 풀밭이, 흙이, 나무가, 구름이, 하늘이, 바람이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속삭이니? 2016.4.19.불.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사진책도서관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