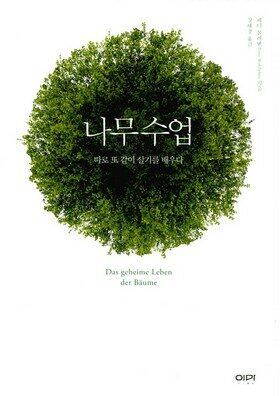-

-
나무 수업 - 따로 또 같이 살기를 배우다
페터 볼레벤 지음, 장혜경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3월
평점 :



숲책 읽기 99
‘나무가 자라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 나무 수업
페터 볼레벤 글
장혜경 옮김
이마 펴냄, 2016.3.10. 13500원
숲에 있는 흙 한 줌에는 지구에 사는 사람의 숫자보다 많은 생명체가 들어 있다. 찻숟가락 하나에도 1킬로미터가 넘는 균사체가 들어 있다. 이 모든 생명들이 땅에 영향을 주어 땅을 나무에게 소중한 곳으로 만든다. (117쪽)
마을 빈논에 꽃을 심고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고향마을을 꽃하고 나무로 가꾸려는 분입니다. ‘꽃할배’라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집에 흰수선화를 한 꾸러미 선물로 주셨어요. 고운 꽃을 고마이 바라보면서 마당 한쪽에 옮겨심습니다. 이러면서 마당 한쪽하고 텃밭에 돋은 ‘여느 풀’을 꽤 뽑습니다.
‘여느 풀’이라고 했는데 사회에서는 흔히 ‘잡초’라고 일컫습니다. 사회에서 잡초라고 할 적에는 ‘심어서 길러 먹으려고 하는 풀’이 아닌 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이밭에 돋는 돌나물도 잡초가 될 수 있고, 고들빼기나 씀바귀도 마늘밭에서는 잡초가 되지요. 민들레도 따로 나물이나 약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면 성가신 잡초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집 마당하고 텃밭에서 뽑은 ‘여느 풀’은 곰밤부리하고 갈퀴덩굴하고 꽃마리하고 쑥하고 모시입니다. 모두 즐거우면서 고마운 나물로 삼는 풀인데, ‘수선화를 옮겨심’는다든지 ‘우리 집에서 씨앗을 심을 자리’에 돋으면 어쩌는 수 없이 ‘뽑는 풀’로 삼아요. 한쪽에 잘 쌓아서 햇볕에 바짝 말린 뒤에 밭둑이나 밭고랑에 놓지요.
등허리가 살짝 결릴 만큼 밭일을 하고서 평상에 가만히 눕습니다. 허리를 편 뒤 다시 흙을 만져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흙일을 쉬는 사이 《나무 수업》이라는 책을 새삼스레 펼칩니다. 페터 볼레벤 님이 쓴 《나무 수업》(이마,2016)인데, 이 책은 나무한테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글쓴이 페터 볼레벤 님은 독일에서 ‘숲지기 공무원’으로 스무 해 넘게 일했다고 해요. 농약을 안 쓰고 기계도 안 쓰면서, 오직 말이나 사람 힘을 빌어서 나무를 살피고 돌보며 아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동안 페터 볼레벤 님을 비롯해서 ‘차분하고 조용한 숲지기’는 나무가 들려주는 말을 들었고, 나무가 속삭이는 노래를 들었으며, 이 말과 노래를 차곡차곡 글로 옮겼다는군요.
나무가 들려주는 말을 듣는다니 ‘바보’ 아니냐고 물을 분이 있을까요? 나무가 속삭이는 노래를 듣는다니 ‘거짓말’ 아니냐고 따질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나무를 가만히 껴안으면 나무가 숨을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즐겁거나 기쁘거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나무한테 다가가서 뺨을 대거나 손을 대면 나무가 두근두근거리면서 반가워하는구나 하는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나무뿐 아니라 꽃이나 풀도 그런걸요. 씨앗 한 톨도 그렇고요.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허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병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기가 넘치고 능률도 높아진다. (130쪽)
토종 숲 생태계가 그런 변화에 맞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사회 공동체가 완벽할수록, 숲의 미기후가 안정될수록 이국의 침입자들이 발을 내리기가 힘들어질 테니 말이다. (269쪽)
나무를 조금 더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하고 함께 사는 나무를 헤아리고, 우리 마을에 있는 나무를 헤아리며, 우리 고장에 있는 나무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하고 함께 사는 나무하고, 이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하고 함께 숨을 쉬는 나무를 헤아립니다.
사람과 사람을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살붙이를 헤아리고, 우리 마을 이웃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헤아립니다. 우리 고장 사람들을 헤아리고, 이 나라 사람들을 헤아리며, 이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하고 함께 숨을 쉬는 사람들을 헤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서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서로 어떤 느낌이거나 생각인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 사이에서도 사람이 마음을 안 열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이나 노래를 들을 수 없어요.
나무한테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무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대목을 짚습니다. 나무한테서 기쁘게 배우자고 말해요. 나무하고 함께 ‘기쁜 살림을 짓는 슬기’를 다스리자고 말해요. 오백 해는 거뜬히 살 뿐 아니라 수천 해도 넉넉히 사는 나무와 같은 결로 나무를 바라보자고 말해요. 그러니까 ‘백 해를 살 동 말 동하는 사람 목숨’이 아니라 ‘즈믄 해를 넉넉히 사는 나무’라는 테두리에서 나무를 바라보아야 ‘나무 돌보기’나 ‘나무 가꾸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모로 본다면 ‘즈믄 해는커녕 이백 해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무 마음을 나무처럼 헤아리느냐’ 하고 물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버이와 나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낳을 새로운 아이들을 찬찬히 생각할 수 있다면, ‘나무를 사랑하는 길’도 헤아릴 만하지 싶습니다. 두고두고 물려줄 만한 숲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삶을 짓고 살림을 가꾸는 길을 헤아려 보면 아름다운 나날이 될 만하리라 생각해요.
《나무 수업》을 조용히 덮고 등허리를 토닥이면서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우리 집 마당에 짙푸른 그늘을 드리우는 후박나무를 바라봅니다.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우람하니 여름에는 뜨거운 볕을 가려 주고 바람이 시원합니다. 우람한 나무 한 그루는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을 가려 주면서 집 둘레에 포근한 기운이 서리도록 해 줍니다. 이 큰 나무에는 온갖 멧새가 찾아들면서 하루 내내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떨구는 잎은 다시 이 나무한테도 돌아가지만, 밭흙을 기름지게 가꾸는 거름이 되기도 해요. 후박나무 껍질로 엿을 고기도 하고, 치약을 빚기도 해요. 그리고 이 후박나무 잎에는 파란띠제비나비가 알을 낳지요. 해마다 멋진 나비가 깨어나는 보금자리 구실도 하는 나무 한 그루예요. ‘마당이 있는 집’도 훌륭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마당이 있는 집’이야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집이 되리라 생각해요. 2016.4.23.흙.ㅅㄴㄹ
죽은 가문비나무와 소나무는 어린 활엽수 숲의 탄생을 돕는 조산원이다. 그것들의 죽은 몸통에 저장된 물은 뜨거운 여름날에도 대기를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서늘하게 만들어 준다. 쓰러진 줄기는 천혜의 울타리가 되어 노루나 사슴의 침입을 막아 준다. (290쪽)
(최종규/숲노래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