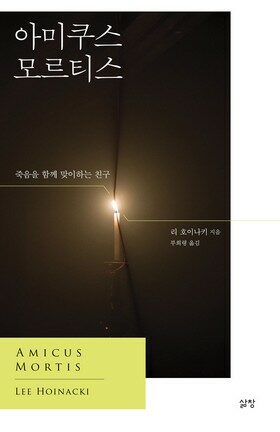-

-
아미쿠스 모르티스 - 죽음을 함께 맞이하는 친구
리 호이나키 지음, 부희령 옮김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6년 3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244
‘주류 의학’이 아닌 ‘함께 죽는 삶벗’ 바라보기
― 아미쿠스 모르티스
리 호이나키 글
부희령 옮김
삶창 펴냄, 2016.3.21. 22000원
봄에 밭에서 남새를 뜯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시금치밭에서 시금치를 솎으실 적에 살짝 거들면서 시금치를 뜯기도 하고, 갓김치를 담그려고 우리 집 밭에서 맨손으로 갓잎을 훑거나 뿌리까지 알뜰히 뽑기도 합니다. 통째로 먹을 남새나 풀이라면 뿌리까지 뽑습니다. 씨앗을 받을 생각이라든지, 나중에 잎을 더 훑을 생각이라면 잎만 뜯습니다.
밭에서 시금치나 갓을 솎을 적에, 또 쑥을 뜯거나 봄나물을 할 적에, 우리가 먹을 만큼 솎거나 뜯는데, 다친 잎이나 벌레가 많이 먹은 잎은 그 자리에서 바로 흙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러면 이 잎은 며칠 뒤에 바짝 시들어 바스락거리고, 며칠 더 지나면 어느새 조각조각 부스러지면서 천천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생하고 통통한 잎은 헹구고 손질해서 나물이나 김치로 바뀌어 밥으로 삼고, 시들거나 벌레 많이 먹은 잎은 저희가 처음 태어난 흙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흙으로 바뀝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어떤 이름으로 불렸던 개인들이 이제 장수의 추상적인 표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통계 숫자들이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잔인한 범죄들을 보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모두가 연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다. 대부분 산업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므로 죄책감을 나눠 갖고 있다. 산업이라는 과학을 믿고,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거나 먹고, 산업에서 얻어지는 이윤으로 부유해진다. (22쪽)
리 호이나키 님이 쓴 《아미쿠스 모르티스》(삶창,2016)를 읽습니다. 미국에서 2006년에 “Dying is not death”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리 호이나키 님은 1928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낯선 외국말로 붙은 책이름은 이반 일리치 님이 한 말에서 새로 따왔다고 하는데, ‘아미쿠스 모르티스(amicus mortis)’는 “죽음을 함께 맞이하는 친구”를 가리킨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죽는 때는 죽음이 아니다(Dying is not death)”를 밝히는 도톰한 이 책은 “죽음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맞이하면서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벗(아미쿠스 모르티스)”이 어떠한 삶인가를 돌아보려고 한다고 말할 만합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남자를 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는 환자라는, 일반화되고 단정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30쪽)
이 특화된 현대적 형태의 악마성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 나는 사랑이 가득한 친밀함의 실천에 그 해답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보는 법과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미묘한 의도를 알아차리는 습관이 필요한 일이다. (42쪽)
리 호이나키 님은 《아미쿠스 모르티스》라는 책에서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리 호이나키 님을 둘러싼 아버지하고 동무를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마음벗인 이반 일리치 님 이야기도 꽤 길게 다룹니다.
그런데, 리 호이나키 님이 병원에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괴로워’ 보였다고 해요. 틀림없이 ‘가장 전문’이라고 할 의사와 간호사가 이들 ‘환자’를 다루는데, ‘사람’이 아닌 ‘환자’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누구라도 참으로 괴롭게 그곳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몸이 된다고 해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피뽑기 검사’도 날마다 으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날마다 통계를 마련해야 하고,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이러한 통계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환자가 죽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따진다고 해요. 병원에서 첨단설비와 의약품으로 꾸준하게 ‘처방한 기록’이 있지 않다면, ‘환자가 죽은 뒤’에 의사는 고소나 고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류 의학은 암에 대해 오직 세 가지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것을 제거하거나(수술), 태워 버리거나(방사선 치료), 혹은 독살(화학 요법)하고자 한다. (81쪽)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라이시엄에서 걸어 다니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157쪽)
사람들 하나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누가 나의 조상인가?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것이다. (180쪽)
《아미쿠스 모르티스》는 죽음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차근차근 되새깁니다. 리 호이나키 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갈 적에는 ‘아버지’를 만나거나 ‘벗’을 만나러 가지만, 병원에서는 ‘환자’라는 이름만 쓴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는 ‘환자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질병 상황을 통계로 정리한 몸뚱이’를 바라볼 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리 호이나키 님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적에 ‘학생을 책상맡에 앉히’지 않고 ‘함께 걸어 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웠다’고 하는 대목을 떠올립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 ‘학생을 책상맡에 앉히’기만 합니다. 강의나 교육을 하는 자리도 으레 이와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 혼자 강단에 서서 떠듭니다. 학생이 되는 사람은 책상맡에 얌전히 앉아서 듣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얼거리’가 아니라 ‘책상물림이 되는 얼거리’라고 할 만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스스로 세계의 시스템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지 못하리라고 가정한다. 시스템은 단단히 자리를 잡은 채 보통 사람들처럼 충성하지 않으려면 묵인하라고 요구한다. (244쪽)
우리는 건강이라고 불리는 추상적 개념에 집중하게 하는 뉴스와 호소와 유혹과 요구의 공격을 받는다. 이러한 선동은 많은 부분 다양한 의료 시스템에서 나오며, 우리의 두려움과 허영심에 호소한다. 건강에 ‘필요한’ 것들은, 시험해 보니, 그저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기기 위한 강매나 은근한 설득에 의한 판매 전략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263쪽)
책상맡이 아닌 들판에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얼거리가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병원 침대맡이 아닌 ‘보금자리와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아끼면서 삶을 마감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병 다스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방’이나 ‘치료’라는 한자말은 현대의학이 나타나면서 쓰는 낱말입니다. 예부터 이 나라에서는 ‘돌보다’나 ‘보살피다’라는 말을 썼어요. 병을 앓거나 다친 사람을 ‘똑같은 한집안 사람’으로 두고 함께 먹고자고 지내면서 돌보거나 보살폈어요. 함께 바람을 마시고, 함께 햇볕을 쬐며, 함께 밥상을 받으면서 병을 다스리거나 달랬어요.
리 호이나키 님은 이녁 벗님인 이반 일리치 님이 ‘병을 한몸으로 맞아들여서 지내는 삶’을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죽음하고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살붙이하고 동무가 ‘삶을 내려놓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죽음이 아닌 죽음’하고 ‘삶이 아닌 삶’은 무엇인가 하고 깊이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요일과 죽은 이를 추모하는 예배의식을 경험하면서 나는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감각들을 집중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403쪽)
배움은 무엇이 배움일까요? 아픔은 무엇이 아픔일까요? 돌봄이나 보살핌은 참뜻이 무엇일까요? 병원이나 의사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바라보는 곳이 너무 한쪽으로 좁게 쏠리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아미쿠스 모르티스》이로구나 싶습니다. 겉치레를 벗고 속을 가꾸는 길일 때에 비로소 ‘삶’이고 ‘죽음’이지 않느냐 하고 묻는 《아미쿠스 모르티스》라고 느낍니다.
날마다 아침저녁을 차리면서 밥찌꺼기는 으레 흙한테 돌려줍니다. 곧 매화 열매가 익어서 매화 열매로 효소를 담글 적에도 열매를 손질하고 남은 것은 모두 흙한테 돌려줍니다. 남새를 헹구며 나오는 흙물도 밭에다가 돌려줍니다. 밭에서 거둔 옥수수를 삶아서 먹은 뒤에도 옥수숫자루는 흙한테 돌려주어요. 흙에서 얻어서 몸을 살리고, 몸을 살리면서 몸밖으로 나온 것은 흙한테 돌려줍니다. 함께 살기에 함께 삶을 짓고, 함께 삶을 지으면서 이곳에서 서로 돌보는 사이로 지냅니다. 2016.4.8.쇠.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