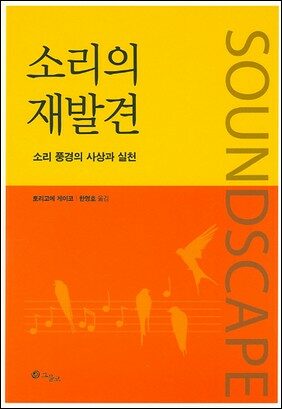-

-
소리의 재발견 - 소리 풍경의 사상과 실천
토리고에 게이코 지음, 한명호 옮김 / 그물코 / 2015년 9월
평점 :



책읽기 삶읽기 228
‘소음’한테 자리를 빼앗긴 ‘소리’를 되찾기
― 소리의 재발견
토리고에 게이코 글
한명호 옮김
그물코 펴냄, 2015.9.20. 12000원
아침이 되면 아침을 여는 소리를 듣습니다. 도시에서는 도시대로 아침 소리를 듣고, 시골에서는 시골대로 아침 소리를 들어요. 봄에는 봄대로 봄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겨울 소리를 듣지요.
아침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늘 다른 소리가 찾아오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골이 아닌 도시여도 아침하고 새벽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밤은 늘 다른 소리가 흐릅니다. 숲이 아닌 도시여도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에는 언제나 다른 소리가 흘러요.
도시에 있기에 늘 같은 소리이지 않고, 시골이나 숲에 있기에 언제나 다른 소리이지 않아요. 해가 움직이는 결을 살피면서 바람이 흐르는 결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새롭게 태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명소라고 하면 대개 벚꽃 명소 등 시각적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 그런데 당시 에도 거리에는 벌레 소리라는, 자연의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13쪽)
숲에서 울리는 소리는 단지 ‘공기의 진동인 음향’이 아니다. ‘싱싱(しんしん,소복소복)’이라는 기이한 소리는 깊은 산속의 냉기, 나무들의 향기, 산의 신비 등을 전부 결합한 전체적인 감각이다. (21쪽)
토리고에 게이코 님이 쓴 《소리의 재발견》(그물코,2015)을 읽으면서 소리를 새롭게 헤아려 봅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라 하더라도, 까치랑 까마귀가 노래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까치떼랑 까마귀떼가 노래하는 소리도 달라요. 참새와 박새와 콩새와 딱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다르고, 제비와 직박구리와 물까치가 노래하는 소리가 달라요. 개똥지빠귀하고 검은지빠귀가 노래하는 소리도 사뭇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새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새마다 다른 노래를 느낄 수 없어요. 새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새가 노래하는 줄 아예 못 느낄 수 있어요.
마주앉은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지 않으면 마주앉은 사람이 들려주는 말을 듣지 못해요. 마주앉은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와 마주앉은 사람이 들려주는 말을 한귀로 듣더라도 다른 한귀로 이내 흘려 보내고 말지요.
소리를 다시 찾는다고 할 적에는, 소리하고 얽힌 삶과 살림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셈이라고 봅니다. 소리를 새롭게 찾는다고 할 적에는, 소리를 둘러싼 삶과 살림을 새롭게 찾는다고 하는 셈이로구나 싶어요.
음악가는 이제 오로지 콘서트홀 안의 소리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바깥의 환경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41쪽)
‘꽃’과 ‘황성의 달’의 작곡자로 널리 알려진 다키렌타로는 어떤 소리 풍경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을까. 그의 감성을 키운 것은 어떤 소리 풍경이었을까 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그가 살던 옛집의 소리 풍경을 알 수 있다면 방문객들이 이를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소리 풍경을 설계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기본 콘셉트로 삼고 싶었다. (148쪽)
《소리의 재발견》은 우리를 둘러싼 소리가 ‘소리’인지 ‘소음’인지 ‘노래’인지 ‘가락’인지 ‘결’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지, 아니면 이 모두를 아우르는 숨결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끕니다. 오직 눈에만 기대어 바라보는 삶과 살림이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삶과 살림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해요.
일본에서 어느 작곡가 옛집을 되살리는 일을 맡은 적에 있다는 글쓴이는, 작곡가하고 얽힌 유물이나 건축에만 마음을 쓰기보다는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한테 선물처럼 들려준 숨결’이 되기까지 ‘작곡가 한 사람이 이녁 보금자리에서 늘 들은 소리’가 무엇인가에 깊이 마음을 쓰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작곡가 옛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작곡가 한 사람이 늘 들은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곳을 꾸미려 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전남 벌교에 있는 ‘태백산맥 문학관’이나 전북 전주에 있는 ‘혼불 문학관’이나 강원 원주에 있는 ‘토지 문학관’ 같은 곳이 떠오릅니다. 태백산맥이라는 문학을 기리는 문학관에 찾아가면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전라도 고장말’을 얼마나 듣거나 느낄 만할까요? 혼불이라는 문학을 기리는 문학관에 찾아가면 ‘혼불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삶말’을 어느 만큼 듣거나 느낄 만할까요? 토지라는 문학을 기리는 문학관에 찾아가면 ‘토지라는 작품과 얽힌 사랑과 삶과 꿈이 흐르는 말’을 어떻게 듣거나 느낄 만할까요? ‘말’을 다루는 문학인데, 막상 문학관에서는 ‘말소리’나 ‘말결’이나 ‘말투’에는 거의 마음을 못 기울이지 않느냐 싶어요.
풍경이란 원래 오감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본래 소리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풍경의 존재 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귀로 파악한 풍경만을 따로 끄집어내서 소리 풍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굳이 소리 풍경이라고 한 것은 풍경에 본래 있어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소리가 거의 의식되지 않는 현대 사회의 상황 때문이다. (181쪽)
우리가 소리를 되찾거나 되살리려고 한다면, 전남 벌교에 있는 문학관에서는 ‘벌교말’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서 지리산 자락에서 흐르는 바람소리를 들을 만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부산에 있는 박물관이나 문학관이라면, 마땅히 부산말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살피거나 돌아볼 만해야 하지 않으랴 하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구에 있는 롯데리아에서는 ‘대구말로 주문을 하고 셈을 치를’ 수 있으면 재미있고, 광주에 있는 맥도널드에서는 ‘광주말로 주문을 하고 셈을 치를’ 수 있으면 재미있을 테지요. 서울 표준말은 서울에서 쓰도록 하고, 대전에서는 대전말을 울산에서는 울산말을 제주에서는 제주말을 ‘고장 표준말’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싶어요.
《소리의 재발견》이라는 책은 우리가 현대문명에 길들면서 스스로 잊은 ‘소리 풍경’을 스스로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들려줍니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소리로도 누리는 풍경이 되고, 냄새로도 누리는 풍경이 되며, 살갗으로도 누리는 풍경이 될 때에 오롯이 참다운 풍경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줍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요. 밥 한 그릇은 맛으로만 먹지 않아요. 눈으로도 먹고, 냄새로도 먹지요. 또 아삭 바삭 아구 냠냠 씹는 소릿결로도 먹어요. 밥상맡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기운으로도 함께 먹지요.
소리를 되찾으면서 풍경뿐 아니라 삶을 되찾습니다. 소리를 새롭게 찾으려 하면서 살림살이를 되찾고, 서로서로 기쁘게 나눌 사랑을 되찾습니다. 4349.1.26.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시골에서 책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