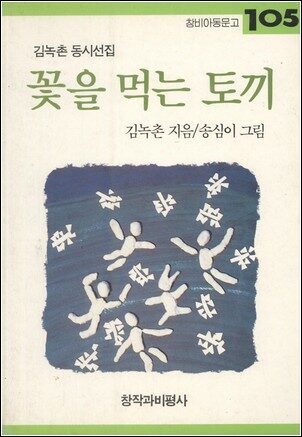-

-
꽃을 먹는 토끼 ㅣ 창비아동문고 105
김녹촌 지음 / 창비 / 1988년 9월
평점 :



시를 사랑하는 시 75
괭이질을 못 해도 ‘야구 중계’는 잘 하는데
― 꽃을 먹는 토끼
김녹촌 글
송심이 그림
창작과비평사 펴냄, 1988.9.25. 8000원
김녹촌 님이 빚은 동시집 《꽃을 먹는 토끼》(창작과비평사,1988)를 가만히 읽습니다. 1988년에 처음 나온 동시집이니 어느덧 서른 해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는 1987년까지 국민학교를 다녔고 1988년에 중학교에 들어섰습니다. 이 동시집이 나올 무렵에는 이 동시집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운 동시는 모두 글솜씨를 가다듬는 얼거리였다고 느낍니다. 삶이 드러나거나 묻어나는 동시는 배운 적이 없었다고 떠오릅니다. 그무렵 학교나 사회에서 흔히 쓰던 말은 ‘글짓기’였고, 억지로 쥐어짜서 멋있게 보이도록 뚝딱뚝딱 써야 비로소 ‘시나 동시가 된다(문학이 된다)’고 배웠어요.
이상한 일이다. / 도시 한복판 / 시멘트 발린 마당인데 / 마당 귀 어디에선가 / 철썩철썩 들려 오는 / 파도 소리. (은모래알 그놈들)
학교 오는 길에 / 강버들 꺾어서 만든 / 버들피리 / 자꾸만 불어 보고 싶다. // 선생님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 앵무새처럼 외워 대는 / 어머니 바둑이도 재미가 없어, (버들피리)
〈버들피리〉나 〈지게〉 같은 동시를 읽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나도 어릴 적에 마을에서 버드나무는 흔히 보았습니다. 버들잎으로 멋지게 풀피리를 부는 동무를 보았습니다. 나도 따라서 해 보려 했지만 나는 잘 안 되었습니다. 시골이 아닌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마을에서 지게질을 하는 이웃 아저씨를 쉽게 보았습니다. 연탄을 나르든 짐을 나르든 지게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이런 버들피리 이야기나 지게 이야기를 다룬 동시가 1980년대 교과서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무렵 교과서에서 ‘학교 공부(‘어머니 바둑이’를 읊는 교과서 공부)는 재미가 없고 버들피리를 불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룬 동시를 실어 줄 만했는지 궁금합니다만, 또 ‘지게 지고 일하는 시골 아버지’ 이야기를 다룬 동시가 참말 그무렵 교과서에 나올 만한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시나 동화는 읽지 못한 채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 아이들이 / 주렁주렁 익은 / 햇빛덩이를 먹는다. (사과)
우리 아버진 / 이 세상 처음 나실 때부터 / 지게 지고 / 태어나신 것일까? // 전라도 어느 산골 / 어려서부터 / 지게 지고 / 남의 집을 살다가, (지게)
어릴 적에는 방학을 맞이하면 곧잘 어머니 시골집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시골집에서는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담배밭 사이를 지나가면 머리가 어질어질했고, 담뱃잎을 말리는 담뱃간 옆에서도 냄새가 어질어질했어요. 그때에는 〈땀냄새〉 같은 동시를 알지 못했어도, 담배밭 일이 얼마나 고되겠는가 하는 대목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일어나서 소한테 여물을 끓여 주고 틈틈이 꼴을 베어 주는 살림을 사촌 형이나 누나가 의젓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삶을 꾸리고 짓는 손길’이 도시랑 시골이 이렇게 다르네 하고 새삼스레 느끼곤 했어요. ‘먹고 사는 일’은 하나도 모르는 채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삶은 뭔가 아귀가 안 맞는 노릇이 아닌가 하고도 느꼈어요.
그러나 외가마실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오면 어느새 이런 일을 까맣게 잊습니다. 삶자리에서 늘 느끼거나 살피거나 겪거나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릇이요 배울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참말로 지난날 학교에서 어린이한테 가르친 동시는 너무 삶하고 멀어졌다고 할까요. 오늘날 학교에서는 어린이한테 ‘삶하고 얼마나 가까운 동시’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예나 이제나 ‘먹고 사는 일’을 어른이 아이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슬기롭게 이끌 수 있어야지 싶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고 옷을 입으면서 지내는데, 늘 집에서 쉬고 자고 하는데, 밥이랑 옷이랑 집하고 얽힌 삶을 교과서나 동시나 문학에서 아이한테 보여주거나 가르치지 못한다면 아이는 살갗으로 깨달아서 느낄 만한 이야기가 거의 없을 듯해요.
담배잎 따서 지고 오신 / 아버지도 형님도 / 비지땀으로 / 흥건히 옷이 젖었고, // 콩밭 매고 오신 / 어머니도 누나도 / 진땀으로 함초롬히 / 적삼이 젖었습니다. (땀냄새)
씨앗 하나 뿌릴 줄도 모르고 / 괭이질도 하나 옳게 할 줄 모르면서 / 밥만 먹으면 만날 야구나 / 해먹고 사는 사람들. // 어느 편이 / 지고 이기면 뭘 하며 / 누가 홈런을 쳐서 / 몇 점을 더 따면 뭘 하나? (야구 중계)
김녹촌 님은 동시집 《꽃을 먹는 토끼》에 〈야구 중계〉라는 동시를 실으며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를 매섭게 나무랍니다.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어 땅을 치는 농사꾼이 있으나, 우리 사회 다른 쪽에서는 야구 중계이니 축구 중계이니 하면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서 소리치고 떠든다고 해요. 괭이질도 모르고 씨앗 한 톨 뿌리지도 않으면서 도시 사람들이 스포츠 중계에 지나치게 목을 맨다고 나무라요.
더군다나 1988년이라면 서울 올림픽을 치르던 해입니다. 이때에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에 더 마음을 기울이도록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경기장을 무척 많이 짓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 자리를 맡던 무렵인 1982년에 프로야구를, 1983년에 프로축구를, 잇달아 다른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널리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민주바람을 스포츠바람으로 잠재우려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동시집 《꽃을 먹는 토끼》에 나오는 〈야구 중계〉 같은 동시를 2016년 오늘 이곳에서 어린이나 어른은 어떻게 받아들일 만할까요? 너무 지나치다고 여길 만할까요? 스포츠 중계가 뭐가 나쁘다고 여길 만할까요? 이제는 야구나 축구뿐 아니라 지구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스포츠 중계를 안방뿐 아니라 손전화로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으니, 이런 동시는 그야말로 낡은 훈계쯤으로 여길 만할까요?
봄햇살이 하도 눈부시고 / 따사로와 / 새싹 돋는 보리밭을 / 여기저기 구경다닌다. (봄 고양이)
토끼의 맑은 눈과 / 아이들의 까만 눈이 / 반짝 마주쳤다. // 반짝 서로 / 씽긋 웃었다. (꽃을 먹는 토끼)
운동 선수는 운동 한 가지만 잘 하면 돈을 만집니다. 그런데 운동 한 가지만 잘 하는 운동 선수는 서른 살이 넘기까지 운동을 하는 일이 드물고, 마흔 살이 넘기까지 운동을 하는 일은 더욱 드뭅니다.
나이 서른이나 마흔은 ‘한창 꽃을 피우는 나이’라고 해요. 시골에서는 서른이나 마흔 살 나이가 ‘일을 솜씨 좋게 잘 해내는 나이’라고 할 만합니다. 스무 살 언저리부터 서른 살 사이는 젊은 일꾼이라면, 마흔 살 언저리는 듬직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중계를 하는 운동경기를 하는 사람은 서른이나 마흔이라는 나이에 ‘은퇴’를 하지요. 그 나이가 지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일쑤예요.
김녹촌 님은 이러한 대목도 살피면서 〈야구 중계〉라고 하는 동시를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른 사회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면서 삶을 짓는 슬기를 얻을 만한가 하는 대목을 찬찬히 짚으려고 했다고 느낍니다.
노란 벼도 고개를 / 숙였습니다. / 수숫대도 고개를 / 숙였습니다. // 알알이 익어 가는 / 열매를 안고 / 깊고 깊은 생각에 / 잠겼습니다. (익을수록)
동시집 《꽃을 먹는 토끼》를 읽으면, 이 동시집에 넓고 깊게 흐르는 시골살이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오는 거의 모든 동시집은 도시살이 이야기를 다루지요. 오늘날은 아무래도 거의 모든 어른과 아이가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살이 이야기가 아니라면 동시로도 쓰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나락이 고개를 숙이고 수숫대가 고개를 숙이는 이야기를 쓸 만한 동시인은 얼마쯤 될까요. 아이한테 나락을 이야기하고 보리를 이야기하며, 봄햇살이랑 겨울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은 얼마쯤 될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사랑하면서 의젓하게 가꾸는 길을 밝히려는 마음이 가득한 《꽃을 먹는 토끼》를 기쁘게 읽을 어른과 아이를 기다립니다. 4349.1.5.불.ㅅㄴㄹ
(최종규/숲노래 . 2016 - 시골에서 동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