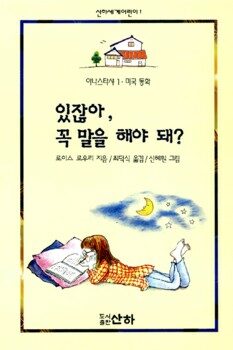-

-
있잖아 꼭 말을 해야 돼? - 아나스타샤 1, 미국동화 ㅣ 산하세계어린이 1
로이스 로우리 지음, 최덕식 옮김, 신혜원 그림 / 산하 / 1997년 1월
평점 :

품절

어린이책 읽는 삶 100
가슴에 담은 말을 들려준다
― 있잖아, 꼭 말을 해야 돼?
로이스 로우리 글
최덕식 옮김
신혜원 그림
산하 펴냄, 1992.10.25.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은 ‘사람 말’로 개나 고양이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 개나 고양이는 ‘사람 말’을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들려주는 ‘개 말’이나 ‘고양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면 ‘쓰는 말’이 달라도 마음으로 알아듣고, 서로 한넋이 되면 ‘마음으로 나누는 말’로 넉넉하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피면, 사람들은 ‘사람 말’을 나누는 데에도 서로 무슨 뜻을 가슴에 품는지 못 알아채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글을 쓰는데, 정작 서로 어떤 마음이요 생각이며 꿈인가를 못 읽거나 안 헤아립니다. 서로서로 오래도록 말을 나누었는데, 저마다 어떤 사랑이요 숨결이며 넋인가를 못 읽거나 안 헤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을 쓰지 않고 나무와 풀과 꽃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새 말’을 쓰면서 새와 속삭이기도 합니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서로 꼭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말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 아나스타샤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은 네 번째 시집입니다. 대머리에 수염을 기른, 사진 속의 아저씨는 아나스타샤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지금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읽어 주는 시는 모두 다 부드러운 여운을 갖고 있고,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 마치 물 위로 꽃잎이 떠오르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를 빨리 써 보고 싶어서, 아나스타샤는 집까지 단숨에 뛰어갔습니다 .. (19, 25쪽)
로이스 로이(로이스 로우리) 님이 쓴 어린이문학 가운데 일곱 권으로 나온 ‘아나스타샤’ 이야기 가운데 첫째 권인 《있잖아, 꼭 말을 해야 돼?》(산하,1992)를 읽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나스타샤’라는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입니다. 이 아이는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아버지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를 둡니다. 아이 아버지는 집안일을 할 줄 모르고,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습니다. 많이 늙어서 요양원에서 지내는 할머니가 있으며, 곧 동생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좋아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아버지가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아이도 시를 마음으로 아끼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멋지거나 잘난 시를 쓸 마음이 없는 아이요, 어떤 틀에 맞추거나 어떤 주제를 드러내 보이려는 시를 쓸 마음이 없는 아이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면서 노래 한 가락이 흐르는 결을 붙잡고는, 이 마음노래를 고스란히 글로 옮기면서 활짝 웃는 아이입니다.
..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소리나게 읊어 보고는 책상 맨 윗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녹색 노트를 꺼내 2페이지를 펼쳤어요. ‘열 살 때 일어난 중대 사건’의 목록 세 번째에 ‘훌륭한 시를 썼다’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 “아나스타샤, 우리 주위에는 시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니야.” 어머니가 성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바보일 뿐이죠?” 아나스타샤가 말했습니다 .. (28, 40쪽)
《있잖아, 꼭 말을 해야 돼?》를 읽다가 빙그레 웃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이들한테 ‘시’가 아닌 ‘틀에 박힌 문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이러하지는 않겠지요. 아무튼, 아나스타샤는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아버지’하고 ‘그림을 그리는 어머니’가 가슴이 찡하다고 느낄 만한 시를 썼는데, 이 아이가 쓴 시를 학교에서는 ‘운율도 안 맞고 주제도 없는 바보 같은 시’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나스타샤 담임교사는 이 아이한테 낙제점을 주었다지요. 그렇다고, 시인이자 대학교수인 사람이 ‘시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나스타샤를 돌보는 어버이는 어버이로서가 아니라 ‘시를 즐기려는 사람’으로서 이녁 아이가 쓴 시를 맞아들이려 했고, 학교에서는 교과서 수업진도에 따라서 ‘주어진 틀에 맞추고, 주어진 주제에 맞추는 글을 만들도록’ 시켰을 뿐입니다.
글잣수를 맞추어서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잣수를 꼭 맞추어야 시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법이니 은유법이니 같은 수사법을 빌어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말솜씨를 뽐내야 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시입니다. 이야기를 담아야 글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삶이고 노래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사랑이 피어나고, 이야기를 꽃으로 피우려고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 “작은 죄도 저지르지 않았어.” “거짓말, 지난주에 메리 엘렌 베일리가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케이크를 훔쳐먹었다고 했잖아?” “그것도 죄가 되니?” “그럼.” “천주교 신자는 케이크 같은 하찮은 것도 고백해야 하니?” … 새의 발처럼 생긴 기분 나쁜 할머니의 손이 뻗쳐 와서 아나스타샤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몹시 부드럽고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을 보지만 않으면 할머니의 손길은 더할 수 없이 흐뭇한 기분에 빠지게 하거든요 .. (68, 104쪽)
학교는 아이들한테 시험점수를 잘 받도록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주어진 틀에 잘 따르도록’ 길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성적표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어른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꿈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하고 씩씩하게 북돋우도록 이끄는 곳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책도 즐기고 이야기고 누리며 사랑과 꿈을 곱게 펼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시를 가르치려 한다면 어떤 시를 가르칠 때에 ‘학교다운 가르침’이 될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름난 시인이 쓴 작품을 보기로 들면서 ‘이름난 시인이 쓴 대로 틀을 맞추어서 쓰면 아름다운 시나 사랑스러운 시’가 되지는 않겠지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흉내내듯이 쓰는 글로는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을 일으킬 수 없겠지요.
한 반에 스무 아이가 있으면 스무 아이가 모두 다른 마음으로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이끌 때에 비로소 가르침이 된다고 느낍니다. 한 반에 쉰 아이가 있으면 쉰 아이가 모두 다른 생각을 길어올려서 저마다 다른 삶을 노래할 수 있도록 북돋울 때에 비로소 가르침이라 할 만하다고 느낍니다.
.. “남자들은 울지 않아요?” “그래, 좀처럼 울지 않지.” “하지만 아빠는 가끔 울어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우는걸요.” “그래, 그래서 난 아빠와 결혼한 거야.” …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들을 구경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빙그레 웃고 계셨을 거예요.” … 아나스타샤는 아기 속옷을 하나 꺼내서 펴 보았어요. 맙소사, 이렇게 작은 아기가 이 세상에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134, 169, 175쪽)
아이들은 자랍니다. 아이들은 생각을 살찌우면서 자랍니다. 어른들도 자랍니다. 어른들도 마음을 가꾸면서 자랍니다. 날마다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랍니다. 언제나 생각이 자라고 사랑이 자랍니다.
다만, 몸이든 마음이든 남이 나를 자라게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자라도록 나를 아끼고 보살핍니다. 어린이책 《있잖아, 꼭 말을 해야 돼?》에 나오는 아이는 스스로 씩씩하게 자라고 싶어서 가슴에 꿈을 담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아이는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가슴에 담을 말’을 가만히 그립니다. 어느 때에 말을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어느 때에 어떤 말로 생각을 가꾸면 즐겁고 아름다울까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머잖아 스스로 제 길을 찾으리라 느낍니다. 아이와 함께 어른도 찬찬히 스스로 제 삶을 맑게 빛내리라 느낍니다. 4348.5.6.물.ㅎㄲㅅㄱ
(최종규/함께살기 . 2015 - 어린이문학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