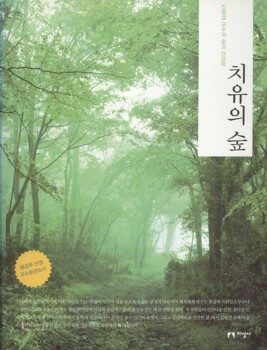-

-
치유의 숲 - 신원섭 교수의 숲의 건강학
신원섭 지음 / 지성사 / 2005년 2월
평점 :



숲책 읽기 74
숲에서 살아야 사람다운 하루
― 치유의 숲
신원섭 글
지성사 펴냄, 2005.2.23.
아이들을 낳아서 함께 살기 앞서도 늘 느끼기는 했으나,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동차 냄새’입니다. 혼자 살던 때에는 자동차를 타야 할 적마다 ‘자동차에서 나는 플라스틱 냄새와 기름 냄새’로 어질어질해서 창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시외버스나 기차나 전철은 창문을 열 수 없어서 갑갑한데, 이런 차에서 내린 뒤 비로소 한숨을 돌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군내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또 이웃 자가용이나 할아버지 짐차를 타든 언제나 ‘자동차 냄새’를 느낍니다. 으레 코를 감싸쥡니다. 언제나 시골집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한 차례 자동차를 타니까, ‘여느 때에 맡지 못 하던 냄새’ 때문에 코가 괴로우니까 코를 감싸쥡니다.
나도 이 아이들처럼 자동차 냄새 때문에 무척 오랫동안 몹시 시달렸기에,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한테 한 마디를 들려줍니다. 자동차에서는 틀림없이 플라스틱과 기름이 섞인 냄새가 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사라지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이 냄새를 즐겁게 여기면 다 꽃내음이 될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 인류가 숲에서 나와 자연과 최악의 갈등을 겪고 부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된 불과 30∼40년 전이다 … 숲은 현대의학이 지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체험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 .. (19, 28쪽)
‘산림치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다가 산림청장이 된 신원섭 님이 쓴 《치유의 숲》(지성사,2005)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신원섭 님은 숲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치유의 숲》에서 밝힙니다.
한자말 ‘치유(治癒)’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을 뜻합니다. ‘치료(治療)’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을 뜻합니다. 두 가지 한자말은 모두 “병을 낫게 함”을 가리킵니다. 한국말로 다시 적자면 “치유의 숲”은 “몸을 낫게 하는 숲”이요 “아픈 데를 씻어 주는 숲”입니다.
.. 그저 숲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는 창을 통해 멀리서나마 숲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 … 분명한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숲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재미있게도 인구밀집지역 주변 공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공원 숲을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 (57, 64쪽)
나무가 있을 때에 새가 깃듭니다. 새는 나뭇가지나 우듬지에 앉아서 날개를 쉽니다. 새는 나무에 있는 벌레를 잡아서 먹습니다. 새가 있으면 벌레는 꼼짝을 못합니다. 다만, 새는 벌레를 모조리 잡아먹지 않습니다. 새는 벌레를 어느 만큼 살려 둡니다. 왜냐하면, 벌레를 모조리 잡아먹으면, 새는 앞으로 벌레를 더 먹을 수 없고, 새가 벌레를 더 먹을 수 없으면 새는 그만 죽고 말 테지요.
새가 벌레를 잡아먹을 적에는 ‘벌레가 나뭇잎을 알맞게 갉아먹을 만큼’ 살려 둡니다. 이리하여, 숲에 온갖 벌레가 아무리 많아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숲에 새가 있어야 나무가 안 죽습니다. 숲에 새가 없으면 나무는 온갖 벌레에 시달리면서 그만 숨을 거두지요.
숲에 새가 있으면 사람이 할 일은 따로 없습니다. 새가 나무를 보살펴 주니까요. 그러나, 숲에 새가 없으면 사람은 헬리콥터를 띄워서 농약을 뿌립니다. 농약을 뿌려서 나무벌레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에 나무는 괴롭지요. 한쪽에서는 벌레가 너무 많고, 한쪽에서는 농약이 춤추니까요. 다시 말하자면, 솔잎혹파리 같은 벌레가 들끓을 적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뿌리고 뿌려도 벌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레는 농약에 견디는 유전자를 새로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이리하여 농약을 더 세게 타서 뿌릴 테고, 숲은 솔잎혹파리 같은 벌레 때문이 아니라 농약 때문에 죽습니다. 농약을 고스란히 나뭇가지와 나뭇잎에 뒤집어쓰니 괴롭고, 농약이 땅에 떨어져서 풀이 말라죽으니 흙바닥에서 풀이 죽어서 사라지면 비가 올 적마다 빗물에 흙이 다 쓸려가서 나무뿌리가 훤히 드러나니 괴롭습니다.
.. 숲은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숲에서는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와 달리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다. 숲에는 지형이 다양해서 운동 효과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 숲과 자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숲은 인간이 자기 인식과 자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을 하나되게 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훼손하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한다 … 숲은 인간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단순함을 즐길 줄 알며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숲은 그야말로 우리를 참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수단인 셈이다 .. (67, 126쪽)
《치유의 숲》을 쓴 신원섭 님은 유럽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들면서 ‘숲이 있을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힘주어 밝힙니다. 이와 함께, ‘숲이 없을 때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똑똑히 들려줍니다.
가만히 보면, 감옥 같은 곳에는 숲이 없고 나무도 풀도 없습니다. 더 살펴보면, 학교에도 숲이나 나무나 풀이 없기 일쑤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운동장은 흙이나 풀이 없이 인조잔디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밤낮을 잊은 채 입시지옥에 얽매이는데다가, 대학교에서도 잔디밭이나 풀밭을 만나기 어렵기 일쑤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수백만 사람들이 몸담은 일터에서 숲내음을 얼마나 맡을 수 있을까요?
.. 조사지를 분석하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경험과 얼마나 단절되어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 도시는 복잡하고 사람들과 인공물로 가득 차 있지만 숲은 한적하고 나무와 풀, 동물과 곤충, 그리고 물 같은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 … 캠핑이 주는 사회적 환경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환경과 다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 경쟁한다. 부모들은 자식과 옆집 아이를 비교하며 그 애의 반이라도 닮으라고 윽박지른다 .. (140, 174, 177쪽)
나무 한 그루가 서면 그늘을 넓게 드리우기도 하지만, 비와 바람도 그어 줍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면 그늘을 드리울 뿐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막아 줍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됩니다. 사막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터’로 바꾸려고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몽땅 베어서 건물만 높이 쌓는 곳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더라도 ‘정작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사막하고 똑같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요즈음 사회를 돌아보면, 도시뿐 아니라 시골에서도 나무를 구경하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면서 마을마다 큰나무를 많이 베어 넘겼습니다. 큰나무를 섬기던 시골사람 비손을 바보스러운 짓(미신)이라고 여겼거든요. 큰나무는 으레 마을에서 길목에 있었기에 자동차가 다니기 수월하도록 자꾸자꾸 큰나무를 베어 없앴습니다.
학교에서 나무를 가르치는 일이 없다시피 합니다. 해마다 사월 오일 언저리에 나무를 심자고 외치기는 하지만, 나무가 자랄 터가 마땅히 없습니다. 나무를 심은 뒤 이 나무를 꾸준히 돌보도록 이끄는 손길도 딱히 없습니다.
.. 도시를 개발하고 디자인할 때 인간과 자연 또는 숲의 관계는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 정책결정자나 도시설계자들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은 무시하고 효율성만 강조해 개발하기 일쑤다 .. (202쪽)
나무는 뚝딱 심지 못합니다. 수천 해를 사는 나무는 하루아침에 옮겨심지 못합니다. 수천 해를 사는 나무이기에 아주 천천히 자랍니다.
나라에서는 도시개발이나 문화정책을 흔히 백 해라든지 스무 해쯤 계획을 세워서 꾸립니다. 아파트 재개발조차 쉰 해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적어도 천 해는 바라보면서 심어야 합니다. 도시환경은 백 해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뀔 테지만, 나무는 적어도 천 해 동안 한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람하게 자라야 합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을 헤아리자면 ‘공원’을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못 되기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숲을 헤아리자면 ‘적어도 천 해 동안 사람이 안 건드리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껏 백 살을 살 동 말 동하는 사람이 나무를 보살핀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은 천 해를 기다리지 못하니 자꾸 가지치기를 하려고 듭니다. 사람은 천 해를 내다보지 못하니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아이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미처 못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천 해 앞’을 내다보고 ‘만 해 앞’을 바라볼 수 있다면, 도시를 짓거나 시골살이를 가꿀 적에 나무 한 그루를 어떻게 보듬을 때에 스스로 아름다운가를 깨달으리라 느낍니다.
자동차를 안 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자동차로도 즐겁게 달릴 만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시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숲으로 둘러싸인 사랑스러운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숲이 살아야 사람답게 하루를 누린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를 빌어요. 숲을 살릴 때에 서로서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얼거리를 우리 어른들도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빌어요. 《치유의 숲》을 쓴 신원섭 님도 산림청장으로 지내는 동안 이 나라 숲과 들과 나무와 풀을 골고루 아끼는 정책을 공무원들한테 찬찬히 알려줄 수 있기를 빕니다.
(최종규/함께살기 . 2015 - 숲책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