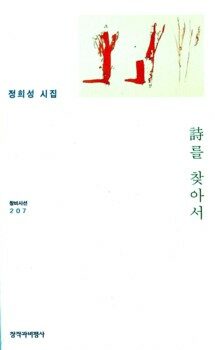-

-
詩를 찾아서 ㅣ 창비시선 207
정희성 지음 / 창비 / 2001년 6월
평점 :

품절

시를 말하는 시 89
삶을 찾아서 사랑을 노래하는
― 詩를 찾아서
정희성 글
창작과비평사 펴냄, 2001.6.5.
하늘이 날마다 선물을 베풉니다. 파랗게 눈부신 하늘이 날마다 선물을 합니다. 자, 나를 바라보면서 웃으렴 하고 손짓하는 하늘이 날마다 곱게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하늘은 무엇을 선물할까요? 빙그레 웃음짓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하늘은 왜 선물을 할까요?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루를 열면, 이 따사로운 기운이 온누리를 아름답게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 기슭 / 덜렁 집 한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 다섯살 배기 딸 민지 /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 (민지의 꽃)
하늘이 활짝 열리는 곳을 보금자리로 삼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는 곳을 보금자리로 삼는 사람이 하나둘 모여 마을을 이룹니다. 마을에 있는 집은 서로서로 하늘을 나눕니다. 함께 누립니다. 어느 집 한 채만 높다라니 올리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 차지해야 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따순 볕은 골고루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 집이 높다라니 서면, 그만 이웃은 겨울에 그늘이 지면서 추워요. 몇몇 집이 서로 겨루듯이 높이 오르려 하면, 그만 다른 이웃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싱그러운 바람과 고운 햇볕을 제대로 못 누려요.
예부터 시골이든 도시이든 옹기종기 모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다 함께 햇볕과 바람을 나누었고, 하늘도 서로 사이좋게 누렸습니다. 내가 즐거울 적에 너도 즐거우며, 네가 즐거울 적에 나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달라지는 사회에서는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 집을 짓습니다. 너도 나도 집을 높이 올리려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웃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 발표 안된 시 두 편만 / 가슴에 품고 있어도 나는 부자다 / 부자로 살고 싶어서 / 발표도 안한다 .. (차라리 시를 가슴에 묻는다)
정희성 님이 쓴 시를 단출하게 묶은 《詩를 찾아서》(창작과비평사,2001)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새파란 겨울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읽습니다. 새파란 겨울하늘을 함께 누리는 풀과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시를 읊습니다.
새가 살 수 있는 곳이면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새가 살 수 없는 곳이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제비가 집을 짓는 자리라면 사람도 보금자리를 틀 만합니다. 제비가 둥지를 틀지 않는 자리라면 사람도 보금자리를 가꿀 만하지 않습니다.
.. 한 처음 말이 있었네 / 채 눈뜨지 못한 / 솜털 돋은 생명을 / 가슴 속에서 불러내네 // 사랑해 .. (그대 귓가에 닿지 못한 한마디 말)
이제 서울에는 제비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제비를 굳이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며 생각조차 않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도시는 어떠한가요? 광주나 인천이나 대전 같은 큰도시는 어떠한가요? 제비를 꿈꾸는 아이가 있는가요? 꾀꼬리나 종달새를 동네에서 보고 싶은 아이가 있나요? 두루미나 고니가 내려앉는 커다란 나무가 동네에 아름답게 서기를 바라는 아이가 있나요?
.. 어디 가 절마당이라도 쓸고 싶은 나는 / 멀리는 못 가고 / 베란다에 나가 담배나 피운다 .. (同年一行)
새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시를 쓰지 못합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귀여겨듣지 못하는 사람은 시를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는 늘 사랑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는 언제나 사랑으로 둥지를 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서로 사랑하면서 꿈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마을살이와 동네살이를 북돋우지 못할 적에는, 겉모습은 사람이되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두레와 품앗이로 마을과 동네에 고운 사랑이 바람처럼 흐르도록 하지 못한다면, 몸차림은 사람일는지 모르나 사람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은 시골을 망가뜨렸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불어닥친 뒤부터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골사람이 시골을 사랑하도록 이끌지 않은 새마을운동은, 도시로 떠난 사람들한테까지 도시를 도시답게 가꾸면서 사랑하도록 이끌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새마을운동은 사람들 가슴에 있던 사랑과 꿈을 끔찍하게 짓밟았습니다. 사랑과 꿈이 짓밟혀 울부짖던 사람들은 그만 돈에 휘둘리고 졸업장에 휩쓸리면서 이웃을 잊고 그저 다투고 싸우며 악다구니가 됩니다.
.. 오십 평생 살아오는 동안 / 삼십년이 넘게 군사독재 속에 지내오면서 /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증오하다보니 / 사람 꼴도 말이 아니고 / 이제는 내 자신도 미워져서 / 무엇보다 그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 신부님 앞에 가서 고백했더니 / 신부님이 집에 가서 주기도문 열번을 외우라고 했다 .. (첫 고백)
왜 입시지옥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일까요? 왜 우리 스스로 동무를 ‘맞수’로 삼아서 밟고 올라서려고 할까요? 내가 서울에 있는 손꼽히는 대학교에 붙으려면 너는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네가 서울에 있는 손꼽히는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나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야 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 가려는 길입니다. 서로 어깨를 겯으면서 웃고 노래하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 돈과 이름과 힘을 몽땅 거머쥐려는 길입니다.
입시지옥 수렁에 빠진 아이들은 하늘을 안 봅니다. 낮하늘도 밤하늘도 안 봅니다. 오직 교과서와 문제집만 봅니다. 어버이 얼굴이나 동무 얼굴이나 이웃 얼굴은 바라볼 겨를이 없고, 그저 시험지와 참고서를 볼 뿐입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나라에서는 하늘이 하늘빛을 잃고, 사람은 사람빛을 잃으니, 시를 쓸 수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바보스럽게 악다구니 다툼질을 벌이기에, 이러한 곳에서는 제비도 꾀꼬리도 종달새도 두루미도 깃들지 못합니다. 새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아, 그만 몽땅 죽음 구렁텅이로 내달리는 꼴입니다.
시를 찾는 길은 삶을 찾는 길입니다. 삶을 찾는 길은 사랑을 찾는 길입니다. 사랑을 찾는 길은, 내가 나다우면서 사람답게 아름다우려는 길이요, 사람과 이웃인 새와 풀벌레와 들짐승이 모두 숲에서 푸른 바람을 마시는 길입니다. 4348.1.8.나무.ㅎㄲㅅㄱ
(최종규 . 2015 - 시골에서 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