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앤드 & 1
오카자키 마리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만화책 즐겨읽기 395
스스로 길을 찾아야지
― 앤드(&) 1
오카자키 마리 글·그림
대원씨아이 펴냄, 2012.9.15.
밤에 곁님이 슬쩍 한 마디 합니다. 오늘 밤 별이 무척 밝다고. 그렇구나 하면서 마당에 나와 밤별을 올려다봅니다. 곁님 말대로 별이 무척 맑습니다. 별빛은 언제 보아도 곱습니다. 그젯밤에 아이들과 올려다본 별을 떠올립니다. 그젯밤에도 별빛이 아주 밝았어요. 그젯밤에는 미리내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마당에서 서성이면서 별을 올려다봅니다. 마을 곳곳에 있는 등불은 손으로 가리면서 별을 올려다봅니다. 나는 바로 이 별을 보고 싶어서 시골에서 사는구나 싶어요. 별빛을 가슴에 품고, 별내음을 온몸으로 맡으며, 별노래를 마음으로 들으려고 시골에서 사는구나 싶습니다.
- ‘정말 원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13쪽)
- “성추행인가요?” “재판을 걸어도 상관없어. 소송에는 익숙하니까.” “이기면 전 뭘 얻을 수 있죠?” “글쎄. 하긴 닳는 것도 아니니까.” “닳아요.” (162쪽)

별을 바라보면 마음이 차분합니다. 별을 바라보는 동안 몸이 느긋합니다. 나무를 바라보거나 풀밭을 바라볼 때에도 마음이 차분합니다. 숲에서 걷거나, 숲에 우거진 나무를 쓰다듬을 때에도 마음이 차분합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로 나들이를 가면서 마음이 차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차분해지자고 생각하면서 달래면 차분할 수 있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버스를 따라 흔들리면 몸도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도시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걷거나 지하철을 탈 적에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몹시 어지러우면서 힘들어요.
아마 도시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을 텐데, 별을 볼 수 없고 나무도 풀밭도 숲도 만날 수 없으니, 좀처럼 차분하기 어렵고 따스하기 힘들며 너그럽지 못할 수 있구나 싶습니다. 마음을 달래거나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요.
도시에서는 누구나 내 마음부터 고단하거나 힘드니, 이웃이나 동무를 살피거나 헤아리기도 어렵지 싶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이웃도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힘든 탓에 다른 사람은 살피지 않고 골을 내거나 짜증이 피어나기 쉽구나 싶어요.
- “그때 일부러 그런 거지?” “뭘?” “지난번 버그 고칠 때, 승산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녀 앞에서 한 거잖아.” (88∼89쪽)
- ‘아아. 어떡하지. 직접 간판을 내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뜻.’ (94쪽)


오카자키 마리 님이 빚은 만화책 《앤드(&)》(대원씨아이,2012) 첫재 권을 읽으며 문득 생각합니다. 이 만화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병원이 아닌 ‘섬이나 외딴 시골’에 있는 병원에서 일한다고 할 적에도, 이 만화와 같은 줄거리가 흐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마음을 차분히 달래면서 쉴 수 있는 터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언제나 빠듯하면서 고단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은, 저마다 얼마나 다를까요.
- “다들 처음에는 기뻐하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네.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일까?’” (117쪽)
- “위로하는 거니? 화나게 만들고 싶은 거니? 사실이면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152쪽)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삶을 열어야 합니다. 스스로 사랑을 가꾸어야 합니다. 남이 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은 내가 일구지, 남이 일구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는 내가 밥을 먹어야지, 옆에서 밥을 먹어 준들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너그럽거나 포근한 시골에서 살든, 메마르거나 바쁜 도시에서 살든, 그리 대수롭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나 스스로 즐거운 넋이어야 즐겁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나 스스로 아프거나 고단한 넋이라면 늘 아프거나 고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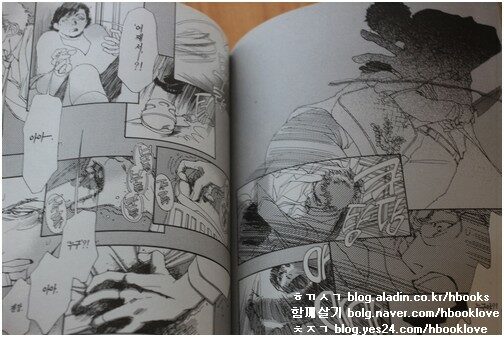
- ‘이윽고 하늘이 하얗게 밝아오고 거리가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까지, 그대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춥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에 조금 당황하면서, 발밑의 감각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마비되어 새햐얘질 때까지.’ (181쪽)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고단한 나머지 밤새 술을 마시면서 새벽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골에서는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일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새벽부터 할 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술을 마시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도시하고는 사뭇 달라요. 시골일은 회사일과 달라 ‘일요일이나 주말이 없’습니다. 다만, 시골일은 날마다 살피고 마주하되, 날마다 새롭고 싱그럽습니다. 더 살펴본다면, 시골에서 맞이하는 새벽과 아침은 무척 고즈넉하면서 차분합니다. 도시처럼 북적거리지 않고, 도시처럼 바빠맞지 않습니다. 이슬을 머금으면서 풀과 나무와 꽃이 깨어나는 시골입니다. 별이 하나둘 지면서 꽃이 하나둘 돋는 시골입니다.
시골 저녁은 어떠할까요? 시골 아침은 별이 지면서 꽃이 돋는다면, 시골 저녁은 꽃이 지면서 별이 돋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거의 모든 사람(99%)이 도시에서 살아요. 그래서 도시 언저리만 살필 텐데, 도시에서도 꽃을 찾을 수 있고, 별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골처럼 온갖 들꽃이 흐드러지지 않을 테지만, 눈을 밝히고 찾아보면 골목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시골처럼 미리내를 보기 어렵지만, 고개를 들어 살피면 달빛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밝은 숨결이 되어 고운 웃음꽃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씩씩하게 디디면서 이웃들과 환하게 어깨동무를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아서 엽니다. 4347.10.25.흙.ㅎㄲㅅㄱ
(최종규 . 2014 - 시골에서 만화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