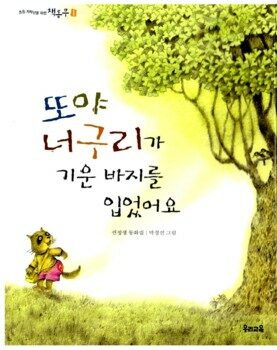-

-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ㅣ 초등 저학년을 위한 책동무 1
권정생 지음, 박경진 그림 / 우리교육 / 2000년 12월
평점 :



어린이책 읽는 삶 61
예쁜 마음이 빚는 삶
―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권정생 글
박경진 그림
우리교육 펴냄, 2000.12.15.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 참 예쁘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풀을 뜯으면서 ‘풀잎 참 곱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요즈음 얼마나 될까요. 해를 바라보면서 ‘햇볕이 포근해서 고맙구나’ 하고 말할 수 있으면, 싱그럽게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이 불어서 반갑구나’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삶이 언제나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한테 빙그레 웃으면서 즐겁게 인사를 건네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사랑이 깃듭니다.
예쁜 마음이 예쁜 삶을 빚습니다. 고운 마음이 고운 삶을 빚습니다. 착한 마음이 착한 삶을 빚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노릇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삶대로 스스로 빚으니까요.
.. 산벚나무에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엄마 너구리는 아기 너구리 또야한테 짧은 반바지를 입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졌으니까요. 엄마 너구리는 장롱 빼닫이를 열고 지난해 또야가 입었던 반바지를 꺼내었어요. “에그, 엉덩이가 뚫렸네!” 엄마 너구리는 뚫어진 바지를 들고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살까 생각했던 거지요. “아니야, 예쁘게 기워 입혀야지.” … “그런데 말이지. 또야가 이 기운 바지를 입으면 산에 들에 꽃들이 더 예쁘게 핀단다.” “참말?” .. (9, 13쪽)
나무를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요. 푸르게 푸르게 자라 다오 하고 나무한테 말을 건네요. 나무는 햇볕과 바람과 빗물과 흙을 먹으면서 자라지만, 사람들이 건네는 따사로운 말도 함께 먹으면서 자랍니다. 푸르게 우거진 숲은 햇볕과 바람과 빗물과 흙이 싱그럽고 좋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숲사람 모두 따사로우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숲을 마주하면서 즐겁게 노래하기 때문에 한결 짙푸릅니다.
참말 그렇습니다. 숲에 깃들어 조용히 지내는 사람은 언제나 너그러우면서 따사로운 마음입니다. 숲은 숲사람이 베푸는 마음밥을 언제나 나누어 받습니다. 숲사람도 숲이 베푸는 숨결을 언제나 나누어 받으니, 숲사람과 숲은 서로서로 즐겁게 고운 사랑을 나눈다고 할 만합니다.
도시에서 지내는 삶이 메마르거나 팍팍하다면, 왜 메마르거나 팍팍한지 헤아릴 노릇입니다. 맨 처음 도시를 지은 사람들부터 ‘어깨동무’나 ‘두레’가 아닌 ‘내 밥그릇 챙기기’를 헤아렸을 테고, 이 마음이 차츰 퍼지면서, 도시로 몰리는 사람도 어깨동무와 두레보다 ‘내 밥그릇 챙기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느낍니다.
생각해 보셔요. 지난날부터 시골을 떠나 도시로 찾아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도시에 있는 이웃과 어깨동무를 하려고 도시로 찾아드나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요? 도시에서 예술을 하거나 문학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요? 어깨동무와 두레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혼자 성공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도시살이가 매우 메마르거나 팍팍합니다.
.. 아기 사슴 콩이는 앞발을 들고 긴 모가지를 뻗어 물렁감 가지를 똑 따 줬어요. 통통이는 물렁감을 받아 들고, “고맙다, 우리 둘이 같이 먹자.” 했어요 .. (50쪽)
즐겁게 노래하는 마음이 될 때에 즐겁게 노래합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삶일 때에 즐겁게 노래하듯이 사랑을 속삭입니다. 지겹게 찡그리는 마음이 될 때에 그야말로 지겹게 찡그리면서 우악스럽습니다. 지겹게 찡그리는 마음으로 우악스럽다면 언제나 거칠면서 짜증스러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권정생 님이 아이들한테 선물하듯이 쓴 짧은 이야기를 그러모은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우리교육,2000)를 읽습니다. 권정생 님은 아이들이 고운 마음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더 많이 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거나 더 잘나거나 더 뭔가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더 즐겁게 뛰놀면서 더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 “정말 마을이 걱정이구려. 젊은이들은 모두 다 떠나가 버리니까…….” “글쎄 말이에요. 농사짓고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 참 좋을 텐데…….” “세상이 끝이 나려나 보오. 참으로 쓸쓸하구려. 앞으로 생각이 달라지면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지 않겠소.” … 할머니는 오래 살던 고향 집, 뜰 앞의 감나무, 살구나무, 손수 일구어 농사짓던 논과 밭, 달맞이꽃이 피는 냇가 오솔길과 우물길, 옛날 초가 지붕의 박꽃과 예쁘게 울어 주던 쓰르라미들, 온갖 아름다운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 (62, 64쪽)
이야기에 나오는 ‘또야 너구리’는 ‘너구리 어머니’가 손수 기운 바지를 입고 활짝 웃습니다. 또야 너구리는 숲을 달리면서, 냇물을 건너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너구리 동무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합니다. 이 즐거운 웃음노래는 어느새 숲과 냇물과 하늘과 동무 모두한테 퍼집니다. 즐겁게 스며들고 즐겁게 자랍니다.
살가운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옛날 옛적에는 모든 사람이 천천히 걸어서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있었으나 말을 빨리 달려서 볼일을 본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말이 있었어도 굳이 말을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개 저 고개를 천천히 두 다리로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지요, 옛날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고개에서 저 고개에서, 이 들에서 저 숲에서 늘 노래를 불렀어요.
이와 달리, 오늘날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씽씽 가로지릅니다. 고속도로 둘레에 노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귀를 찢는 자동차 소리만 가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저곳 아주 많이 자주 돌아다니지만 노래를 안 부릅니다. 자동차에서 기계를 움직여 대중노래를 켤 뿐입니다.
.. 세월이 흐르자 불탄 자리에 새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 옛날처럼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강 건너 마을에서 크게 잔치를 벌여 놓고 초대를 했어요. 모두 함께 춤추며 놀았어요. 그러고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서로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어요 .. (78쪽)
사람들이 늘 부르는 살가운 노래를 듣던 옛날 숲과 들과 바다와 골짜기와 마을은 늘 푸르면서 따사로운 빛이었습니다. 예부터 한겨레가 ‘조용한 아침나라’일 수 있던 까닭은, 예부터 어느 마을 어느 사람이든 즐겁게 노래하면서 삶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사람은 노래를 안 불러도 시골사람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늘 노래를 부르는 시골마을로 찾아간 도시사람은 ‘시골은 인심이 좋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시골에서 ‘좋은 인심 찾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럴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시골마다 텔레비전이 들어왔고 농약과 비료와 비닐과 기계를 엄청나게 씁니다. 오늘날 시골에서 노래를 부르며 들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디오를 켜기는 하지만, 스스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농약을 뿌리면서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입을 꾹 다물지요. 경운기나 트랙터를 몰면서 노래를 못 부르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모든 노래가 묻히는데요.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으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 배달음식을 시키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짓지 않을 때에는 노래가 흐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을 지을 때에 비로소 노래가 흐릅니다. 노래가 흘러야 내 몸이 새롭게 태어나고, 내 둘레에서 들이며 숲이며 바다이며 아름답게 거듭나요.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짓는 줄 아이들이 잘 알아챌 수 있기를 빌어요.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짓기 때문에, 어른들은 누구보다 슬기롭게 삶을 가꾸어야 하고, 아이들한테 아름다운 빛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권정생 님 이야기에 깃든 구수한 노래를 곰곰이 되씹습니다. 4347.8.10.해.ㅎㄲㅅㄱ
(최종규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