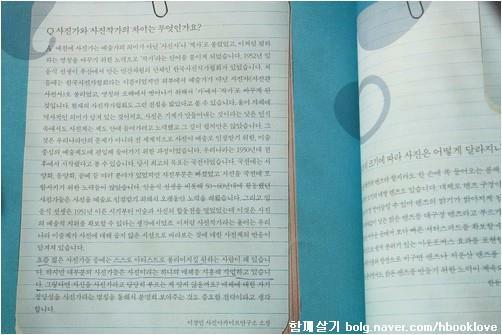-

-
포토닷 Photo닷 2013.12 - Vol.1, 창간호
포토닷(월간지) 편집부 지음 / 포토닷(월간지) / 2013년 11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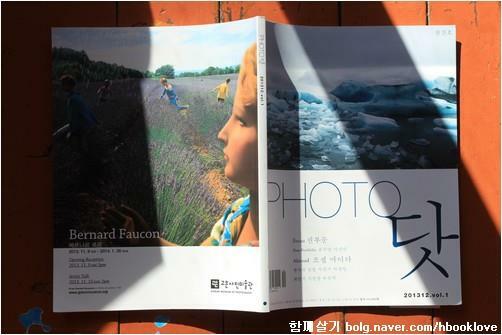

찾아 읽는 사진책 152
마음이 모이고 만날 때에 사진 하나
― 사진잡지 《포토닷》 1호
포토닷 펴냄, 2013.12.1.
2013년이 저무는 섣달에 사진잡지 《포토닷》 1호가 태어납니다. 지구별을 두루 살필 적에 한국은 ‘사진기 한 대쯤 갖춘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난 2006년에 벌써 ‘사진기 천만 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사진기 한 대쯤 있는 셈이고, 필름사진기나 디지털사진기가 아니더라도 손전화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사진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사진기를 갖추거나 쓰는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아니, 사진을 찍거나 사진기 있는 사람이 ‘무척 많다’기보다 ‘누구나 사진기 있’고 ‘누구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진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거나, 사진을 어떻게 즐기는가 하고 살피거나, 사진을 찍는 매무새와 넋과 빛을 배우는 일은 드물어요. 이를테면, ‘사진 초상권’이나 ‘사진 저작권’을 나누거나 배우지 못한다고 할 만해요.
사진을 찍지 말라는데도 사진기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몰래 사진을 찍고는 몰래몰래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인기인뿐 아니라 수수한 여느 사람들까지 엄청난 사진물결에 휩쓸려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아름답거나 올바르게 흐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이 나라는 한국이요, 한국말을 씁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으로서 한국땅에서 한국말을 옳고 바르게 쓰는 이가 무척 드물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일터에서도 한국말을 옳고 바르게 가르치거나 이야기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공문서조차 중국 한자말·일본 한자말·미국 영어를 거리끼지 않고 써요. 아니, 한자나 영어를 써야 멋있거나 똑똑하거나 대단하다는 듯 여기는 흐름이 있어요. 한국사람 스스로 한국말 올바로 배우거나 깨닫거나 생각하도록 돕는 잡지라든지 매체라든지 책이 매우 드뭅니다. 아니, 한국말 슬기롭게 배우거나 나누도록 돕는 잡지는 한 가지조차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더 돌아보면, 이제 한국에서 집집마다 자가용 한 대나 두 대쯤 거느리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면서도, 뺑소니와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요. 거칠거나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자동차 많을 뿐 아니라, 걷는 사람과 자전거와 아이들 살뜰히 살피는 어른이 퍽 적어요.
물질과 문명과 기계와 자본은 있지만, 이들을 다루거나 보듬는 ‘마음’이 없는 한국이지 싶어요. 학교와 집과 정부에서 ‘교육’을 말하기는 해도, 모두들 대학입시에 얽힌 입시교육일 뿐, 아이들이 삶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참다운 꿈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이런 마당에, 한국 사진문화가 올바르며 아름답고 즐거우면서 사랑스레 뿌리내리거나 퍼지기를 바라는 일은, 섣부르다거나 배부르다거나 바보스러운 잠꼬대일는지 모릅니다.
사진잡지 《포토닷》 1년 정기구독을 합니다. 전남 고흥 시골마을에서 ‘사진책도서관’을 꾸리는 사진지기이니 즐겁고 반갑게 정기구독을 합니다. 1호를 받아 봅니다. 사진잡지 내는 넋을 “마침점이 아닌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진의 무수한 점과 점들이 모이고 섞이는 창을 지향합니다. 사진인들이 출자자와 운영자로 참여하는 포토닷 협동조합 준비위원회가 발행합니다.” 하고 밝힙니다. 점이란 자그마한 빛이겠지요. 커다랗거나 대단한 빛이 아닌 자그마한 빛이 점일 테지요. 수많은 점이 모여서 새로운 점이 되고, 이 새로운 점이 모이고 또 모여서 새로운 사진을 이룹니다.
어떤 대단하거나 훌륭하거나 이름난 작가 몇몇이 있어야 사진문화가 발돋움하지 않아요. 대단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으며 이름나지도 않은, 여느 수수한 사람들이 사진을 좋아하고 아낄 때에 사진문화가 발돋움한다고 느껴요. 손전화로 동무들끼리 사진을 찍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빛으로 사진을 좋아하고 아낄 때에 사진문화가 발돋움해요. 작가로 뛰는 어른이든 작가 아닌 즐김이로 사진을 좋아하는 어른이든, 맑은 눈망울과 밝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진으로 차곡차곡 담을 적에 사진문화가 발돋움해요.


“아카이브 사진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누군가의 기념사진들이다(26쪽/이경민).” 하는 이야기를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찍는 사진이란 참말 모두 ‘기념사진’입니다. 예술가가 찍어야 사진이겠어요? 이때에도 사진이겠지요. 사진가가 찍어야 사진이겠어요? 사진이 좋다고 여겨 사진기를 장만했으면 누구나 사진을 찍겠지요.
즐겁게 살려고 사진을 찍어요. 즐겁게 놀고 일하며 어깨동무하고 싶어 사진을 찍어요. 보도사진만 찍어야 하지 않아요. 상업사진을 찍어야 사진가로 돈벌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다큐사진을 찍어야 사진빛을 밝히지 않아요. 어느 갈래 사진을 찍든, 스스로 삶을 밝히며 누리고 가꾸는 즐거운 마음이면 넉넉해요.
“1988년, 이제 갓 20대에 접어든 영국 출신의 이 포토저널리스트 지망생은 캄보디아로 향했다. 크메르루즈 반군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취재 의뢰를 받은 매체도, 찍은 사진을 사줄 매체도 없었다. 당시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시간’이었다(29쪽).” 하는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요, 이름난 작가이든 아직 이름 안 난 작가이든, 우리는 ‘시간’을 들여 사진을 찍습니다.
느긋하게 찍어요. 너그럽게 찍어요. 넉넉하게 찍어요.


웃고 노래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춤추고 얼싸안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함께 밥 한 그릇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손을 맞잡아 땀을 흘려 논밭을 갈면서 사진을 찍어요.
바쁘게 서둘러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은 없어요. 후딱후딱 찍어 버릴 사진은 없어요. 참말 사진 한 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즐겁게 찍자면, ‘내 시간’과 ‘네 시간’이 살가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지 싶어요.
“20대 초반 사진학과를 다닐 때의 한 수업이 생각이 난다. 파인아트 수업이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 오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학생들이 발표한 사진을 본 교수의 첫 마디는 ‘갓 스물이 넘은 파릇파릇한 애들이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뿐이냐’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다. ‘행복한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죠. 하지만 뭔지 모를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은 자꾸만 고민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걸까? 무엇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저도 모르는 그런 감정들을 사진으로 해소시키고 싶었어요.’(92쪽/김소윤)” 하는 이야기를 되짚습니다. 갓 스물이라는 나이라 해서 파릇파릇할 수 없어요. 갓 스물이란, 이제 겨우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나이예요. 입시지옥에 짓눌려야 하는 아이들은, 이름은 ‘푸름이(청소년)’라 하지만, 막상 푸르게 꽃피우지 못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햇볕 한 줌 못 쬐어요. 시원한 바람 한 숨 못 쐬어요.
시골 아이들조차 들판을 달리지 못하고, 숲길을 거닐지 못하며, 바다에 몸 담그지 못해요. 시골 고등학생과 중학생도 입시지옥에 휘둘려요. 시골 아이들도 서울 강남에서 내려온 영어강사와 수학강사한테서 특별강의를 받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도록 채찍질을 받아요.
대학교 사진학과에 들어가는 고작 스물밖에 안 된 가녀린 아이들은 그야말로 가녀립니다. 꿈도 빛도 삶도 없이, 오직 시험문제만 들여다보다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즐거울까 하고 생각할 수 없이 갇힌 채, 비로소 사진기를 손에 쥐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찍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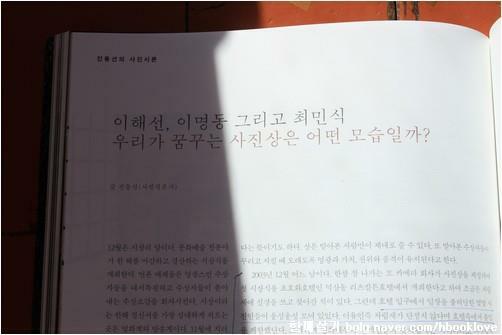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내 머릿속의 상상력을 꺼내서 한 컷 한 컷 자세하게 그린다(111쪽/박경일).” 하는 이야기를 되뇝니다. 누구나 머릿속으로 그린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습니다. 머릿속에 환하게 그리는 이야기 있어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짓고 춤을 선보입니다. 머릿속에 환하게 그리는 이야기 없으면, 글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릴 뿐 아니라, 사진도 못 찍습니다.
“2003년 12월 어느 날이다. 한창 잘 나가는 모 카메라 회사가 사진상을 제정하여 첫 시상식을 초호화호텔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하여 조금은 차림새에 신경을 쓰고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런데 호텔 입구에서 입장을 불허당한 몇몇 사진인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다. 이유인즉 차림새가 단정치 않다며 호텔 측에서 출입을 제한했단다(122쪽/진동선).” 하는 이야기를 읽다가 웃음이 터집니다. 우하하 하고 큰웃음 터집니다.
나는 저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일꾼들한테 한 마디 여쭙고 싶어요. 여보셔요, 사진상 받는 사진가가 1회용사진기를 써서 훌륭한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소? 편의점에서 만 원짜리 1회용사진기를 사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사진상을 받는다면, 이녁은 이 사진가도 출입제한 하시겠소? 천만 원짜리 사진기를 써야 사진가요? 이천만 원짜리 사진기를 써야 신문사 사진기자요? 하다못해 백만 원쯤 되는 사진기를 다루어야 사진가나 사진기자요?
양복을 입어야 사진을 잘 찍소? 고무신차림에 시골에서 흙밥 먹는 사람은 사진을 못 찍소? 까만 자가용을 운전수 끼고 몰아야 사진을 잘 찍소? 자전거를 달리거나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은 사진을 못 찍소?
“요즘 젊은 사진가들 중에는 스스로 아티스트로 불리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사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진가라고 당당히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138쪽/이경민).” 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빙그레 웃음짓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가’지요. 한국말로 하자면 ‘-장이’와 ‘-쟁이’를 붙일 수 있어요. ‘쟁이’는 어떤 일이 아직 무르익지 않으나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장이’는 어떤 일이 아주 무르익어 훌륭한 솜씨와 빛을 선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진장이’라 하면 사진길 훌륭히 열거나 빛낸 이요, ‘사진쟁이’는 차근차근 사진길 걸으며 제 빛을 찾으려는 이예요. 다른 한편, ‘사진지기’라는 이름을 쓸 만해요. 사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넋으로 사진벗과 어깨동무하면서 사진비평을 쓰고 사진창작도 하며 사진전시관이나 사진책도서관을 꾸리는 이들, 또 사진책을 엮거나 사진잡지를 내는 이들은 모두 사진지기예요. 사진을 지키고, 사진을 가꾸며, 사진을 밝히기에 사진지기입니다.
한국사람으로서 스스로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쓰려 한다면 좀 안쓰럽구나 싶어요. 적어도 ‘사진예술가’라 하면 돼요. 사진으로 예술을 하려 한다면, 말 그대로 ‘사진예술가’가 될 테니까요.
아무쪼록 서로 즐겁게 사진을 누리기를 빌어요. 사진을 찍는 작가이든 여느 사람이든, 사진을 가르치는 교수나 사진을 배우는 학생이든, 누구나 스스럼없이 손을 맞잡으며 사진을 노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빌어요. 사진잡지 《포토닷》이 1000호, 2000호, 3000호를 내놓아 우리 사진문화를 환하게 빛낼 수 있기를 기다려요. 4346.12.6.쇠.ㅎㄲㅅㄱ
(최종규 . 2013 - 사진책 읽는 즐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