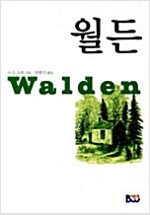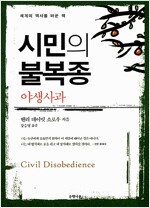헨리 데이빗 소로우
나는 문을 열고 살기를 즐긴다. 도시에서 살던 지난날이나 시골에서 사는 오늘날이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을 뿐 아니라, 유리문으로 늘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곳에서 지내기를 즐긴다. 서울에서 혼자 살던 지난날에는 나무로 지은 적산가옥 2층에서 툇마루 문 활짝 연 채 지내기 일쑤였고, 인천에서 짝을 이루어 살던 지난날에도 옥탑집 마당에서 동네와 먼 하늘을 내다보며 지내기 일쑤였다.
시월 오일 저녁해 기울 무렵, 마루문을 거쳐 바깥 하늘에 발그스름한 빛이 서리는 모습을 본다. 아이들한테 만화영화를 보여주다가 부리나케 멈추고는 두 아이를 부른다. “얘들아, 마당으로 나가자!” 마당에 서서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는 하늘바라기를 한다. “벼리야, 보라야, 저기 봐. 저 하늘빛이 바로 노을빛이야.” 발그스름하다가 노르스름하다가 이내 짙붉게 물드는 하늘빛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들에서 일하던 할매 할배 모두 저 하늘빛 보셨을까. 등이 굽은 탓에 못 보실까. 경운기 모느라 옆에 눈을 팔 수 없어 못 보시려나. 풀벌레 노랫소리 감겨드는 마당에서 노을빛을 누리는 아버지 곁에서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논다. 아이들 노랫소리는 풀벌레한테 스며들고, 풀벌레 노랫소리는 아이들한테 젖어든다.
1991년에 이현주 님이 한국말로 옮긴 《소로우 평전 : 자유를 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을 떠올린다. 이현주 님은 《소로우 평전》을 누가 썼는지 안 밝힌다. 왜 안 밝힐까. 아무튼, 《소로우 평전》을 읽으면, 소로우는 어릴 적부터 ‘나는 나다’ 하고 깨달은 사람이다. 젊은 날에 씩씩하게 냇물 따라 나들이를 다니고 숲속에서 오두막을 짓고 산 까닭 또한, ‘나는 나다’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다움’이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말뜻은 ‘나다움’이라고 한다. 곧, 내가 나인 줄 느낄 때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알기 마련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알 때에 사랑과 꿈을 짓는 삶을 누리려 하기 마련이다.
문득 김지하 님을 생각한다. 김지하 님은 왜 이녁 삶을 사랑하고 꿈꾸는 길을 아직도 못 걸어갈까. 박경리 님이 이녁 삶을 사랑하고 꿈꾸는 길을 걸었던 모습을 아직도 못 알아챘을까. 글보다 흙을 만지고, 글을 만지고 싶으면 흙과 함께 글을 만지면 될 텐데, 헨리 데이빗 소로우 님 글을 읽으며 흙빛과 흙내음과 흙숨과 흙바람을 누릴 수 있는 삶벗을 만나고 싶다. 4346.10.6.해.ㅎㄲㅅㄱ
(최종규 . 2013 - 사람과 책읽기)